공유하기
늘어나는 나랏빚 우려한다[기고/옥동석]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9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국가채무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기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국가채무비율 40%를 왜 재정건전성 관리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는가? 그 대답은 명확하다. 지금까지 40%를 요원한 일이거나 남의 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 기준이 왜 논란이 되는가? 그 대답도 분명하다. 내년에 처음으로 채무비율 40% 선을 돌파하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40%를 강조했던 정치인이라면 기존 입장을 바꾸기 위해 일종의 통과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과연 40% 기준은 타당한가’라고 묻는 것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40%는 타당하지 않은 기준이다. 장기적으로 이 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을 오래 관찰한 전문가라면 40%를 결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2060년에는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거의 200%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사회보험 지출은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런 비관적 재정전망의 근거는 뭘까? 국가기관의 보고서들이 한결같이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국회예산정책처는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우리 재정은 국가채무가 GDP 대비 70.6% 수준이 되는 2036년 이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도 2015년 12월 이를 실토했는데, 그 내용은 ‘사회보험은 현 제도 유지 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일반재정은 사회보험을 책임지지 않을 때 그나마 지속 가능하다’로 요약된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은 공공연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10%를 넘는다며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비관적인 전망은 우리를 분발하게 만든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가장 많이 증가시켰지만 국민연금 소진연도를 2047년에서 2060년으로 크게 연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가채무와 공기업 부채를 크게 늘렸지만 공무원연금 적자를 40% 감축했다. 박근혜 정부는 논란에 휩싸였던 공기업 부채를 대폭 감축하며 또 한 번 공무원연금 적자를 40% 감축했다. 재정건전성이 없다면 복지국가의 비전은 허무할 뿐이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기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게임 인더스트리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알쓸톡
구독
트렌드뉴스
-
1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
-
2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3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4
폐암 말기 환자가 40년 더 살았다…‘기적의 섬’ 어디?
-
5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6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7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쳤다…韓 1041조원 vs 日 1021조원
-
8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9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10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3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4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5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6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7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8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9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10
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쾌유 기원”
트렌드뉴스
-
1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
-
2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3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4
폐암 말기 환자가 40년 더 살았다…‘기적의 섬’ 어디?
-
5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6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7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쳤다…韓 1041조원 vs 日 1021조원
-
8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9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10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3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4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5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6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7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8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9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10
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쾌유 기원”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I 대전환 시대, 골든타임이 끝나가고 있다[기고/안준모]](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22/13321454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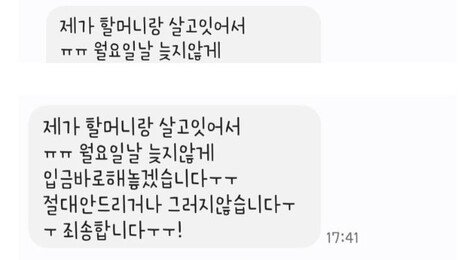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