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뉴스룸/김유영]‘칼퇴’를 허(許)하라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오늘도 야근이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15년차 서모 과장은 한숨을 쉰다. 특별히 처리할 업무는 없는데 부장님은 책상 앞에 앉아 있다. 칼같이 퇴근하자니 눈치가 보인다. 그는 야근을 일주일에 두어 번 한다. 야근이 만성화되니 낮에 ‘적당히’ 일하는 게 습관이 됐다. 상사 몰래 인터넷 쇼핑을 하고, 치과에 슬쩍 다녀오기도 한다.
근로시간에 관한 한 한국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국가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 사람이 일하는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길다. 하지만 서 씨의 사례처럼 의미 없는 야근이 생산성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확히 4년 전 IBK기업은행이 그랬다. 평균 퇴근 시간이 자정에 가까운 지점도 있었다. 한 직원은 “회사와 집을 시계추처럼 오가니 삶의 낙이 없었다. 집은 오히려 숙소에 가까웠다”고 회상한다. 은행은 2009년 획기적인 제도를 마련했다. 오후 7시가 되면 직원용 컴퓨터를 강제로 끄고 퇴근 시간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했다.
오래 일하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 영국은 1990년대 후반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를 내걸었다. 영국의 세계적 디자인 회사인 키네 듀포트의 디자이너들은 주간회의에서 자신이 일한 시간을 그래프로 그린다. 근무 시간이 긴 사람은 눈총을 받는다. 창의성이 승부를 가르는 분야에서 의자에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어 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시간이 곧 돈인 직종에서 비용을 많이 썼다는 이유도 있다. 이곳의 한국인 디자이너 최세근 씨는 “한국과 달리 업무 결과만 놓고 평가하는(result-oriented) 문화”라고 전한다.
새 정부는 근로 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남들을 쫓아가는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시대’엔 노동력을 투입한 만큼 성과가 나왔다. 근면은 압축성장에 기여했다.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금은 쫓을 대상이 없다. 일하는 시간만 많아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됐다. 선도자(first mover)로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한다.
오늘도 국내 굴지의 모 대기업 임원들은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로 오전 6시 반까지 출근한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서 과장은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두어 번 야근할 것이다.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쉬어야 남들이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다. 이게 창조경제 시대에 살아남는 길이다. 내수(內需)를 살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뉴스룸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현장속으로
구독
-

동아닷컴 신간
구독
-

동아광장
구독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어깨 아프면 약-주사 찾기보다 스트레칭부터”[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
3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4
주식 혐오했던 김은유 변호사, 53세에미국 주식에서 2100% 수익률 달성한 사연
-
5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6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7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8
‘나홀로집에 케빈 엄마’ 캐서린 오하라 별세…향년 71세
-
9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10
제주서 유기된 동물 절반은 안락사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3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4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5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6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7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8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9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10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어깨 아프면 약-주사 찾기보다 스트레칭부터”[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
3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4
주식 혐오했던 김은유 변호사, 53세에미국 주식에서 2100% 수익률 달성한 사연
-
5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6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7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8
‘나홀로집에 케빈 엄마’ 캐서린 오하라 별세…향년 71세
-
9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10
제주서 유기된 동물 절반은 안락사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3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4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5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6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7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8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9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10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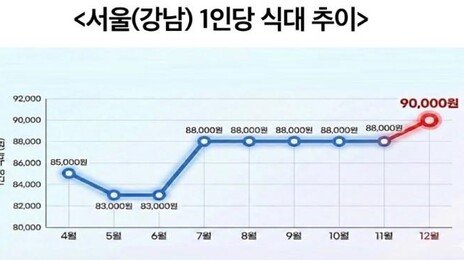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