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뉴스룸/김희균]김군의 인권은 어디로 갔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7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내로라하는 대기업에서 지방 사립대 출신으로는 드물게 임원 문턱에 오른 김모 씨. 인사철만 되면 은근히 학연을 따지는 곳에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설움이 많았다. 상사와 팀원들이 출신 대학별로 모임이라도 하는 날이면 왕따가 된 듯한 속상함에 홀로 술을 마시기도 했다.
그런 김 씨는 정작 아들이 왕따인 걸 몰랐다. 외고 진학이 목표였던 아들은 2년 전 중3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고등학교에 안 가겠다고 했다. 맞벌이인 김 씨 부부는 아이가 2년 넘게 학원과 집 앞에서 집단 구타를 당해 온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들은 처음 맞았을 때 담임교사에게 알렸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되레 가해 학생들의 보복만 심해졌다. 3학년이 되고는 아예 학교에 안 가는 날도 있었지만 담임은 집에 알리지 않았다.
경기, 강원, 전북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을 거부하고 있다. 낙인효과 때문이란다. 아직 어린 가해 학생들이 진학이나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 교육감들은 “인권에 반하고, 비교육적인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들의 주장은 인권친화적이지도, 교육적이지도 않다. 잠재적인 가해 학생들에겐 학교폭력을 저질러도 별문제가 안 된다는 인식만 심어준다. 폭력을 두려움 없이 휘두를 수 있는 면죄부를 준다. 반면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제대로 보호나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커진다. 세상을 부당한 곳으로 보게 된다. ‘비교육적’이란 단어는 이럴 때 쓰는 말이다.
해당 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을 견강부회한 것도 문제다. 인권위는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가해 학생이 변했을 때는 사후심의 및 삭제 장치를 두라는 취지였다. 인권은 이런 건설적인 대안을 통해 지켜지는 것이다.
가해 학생의 인권을 감싸느라 수많은 피해자, 또 학교폭력과 무관한 수험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결과에 어떤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것인가. 김 씨는 “다 큰 어른인 내가 은근한 따돌림에도 괴로워하는데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아이들은 직접적인 폭력에 얼마나 상처를 받겠느냐”며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 주느냐”고 물었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가 지난주 경기, 강원, 전북도교육청을 비판한 보도자료의 제목은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이다. 섬뜩하지만 불편한 진실이다.
김희균 교육복지부 기자 foryou@donga.com
뉴스룸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광화문에서
구독
-

아파트 미리보기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트렌드뉴스
-
1
울릉도 갔던 박단, 경북대병원 응급실 출근… “애써보겠다”
-
2
[단독]주한미군 패트리엇 ‘오산기지’ 이동… 수송기도 배치
-
3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4
대표 K방산 ‘천궁-II’ 뭐길래…‘명중률 96%’에 중동 UAE 추가요청 쇄도
-
5
법원, 장동혁 지도부의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
6
쿠웨이트 추락 美조종사, 적군 오인에 ‘몽둥이 위협’ 혼비백산
-
7
12% 폭락 다음날 9.6% 폭등… 대외변수에 허약한 ‘현기증 증시’
-
8
‘오탈자’ 변시 낭인 2000명 눈앞… “정원 늘려야” vs “이미 포화”
-
9
美, 최신예 미사일 ‘프리즘’ 이란서 처음 쐈다…“추종 불허 전력”
-
10
트럼프의 ‘대리 지상전’… 쿠르드軍, 이란 진격
-
1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
2
李 “주유소 휘발유 값 폭등…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해”
-
3
李 “‘다음은 北’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 있어…무슨 득 있나”
-
4
[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
5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6
트럼프, 결국 ‘대리 지상전’…쿠르드 반군 “美요청에 이란 공격”
-
7
김어준에 발끈한 총리실…“중동 대책회의 없다고? 매일 챙겼다”
-
8
與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단수 공천
-
9
법원, 장동혁 지도부의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
10
국힘, 靑 앞서 의총…“李, 사법 악법 공포하면 역사 죄인될 것”
트렌드뉴스
-
1
울릉도 갔던 박단, 경북대병원 응급실 출근… “애써보겠다”
-
2
[단독]주한미군 패트리엇 ‘오산기지’ 이동… 수송기도 배치
-
3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4
대표 K방산 ‘천궁-II’ 뭐길래…‘명중률 96%’에 중동 UAE 추가요청 쇄도
-
5
법원, 장동혁 지도부의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
6
쿠웨이트 추락 美조종사, 적군 오인에 ‘몽둥이 위협’ 혼비백산
-
7
12% 폭락 다음날 9.6% 폭등… 대외변수에 허약한 ‘현기증 증시’
-
8
‘오탈자’ 변시 낭인 2000명 눈앞… “정원 늘려야” vs “이미 포화”
-
9
美, 최신예 미사일 ‘프리즘’ 이란서 처음 쐈다…“추종 불허 전력”
-
10
트럼프의 ‘대리 지상전’… 쿠르드軍, 이란 진격
-
1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
2
李 “주유소 휘발유 값 폭등…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해”
-
3
李 “‘다음은 北’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 있어…무슨 득 있나”
-
4
[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
5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6
트럼프, 결국 ‘대리 지상전’…쿠르드 반군 “美요청에 이란 공격”
-
7
김어준에 발끈한 총리실…“중동 대책회의 없다고? 매일 챙겼다”
-
8
與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단수 공천
-
9
법원, 장동혁 지도부의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
10
국힘, 靑 앞서 의총…“李, 사법 악법 공포하면 역사 죄인될 것”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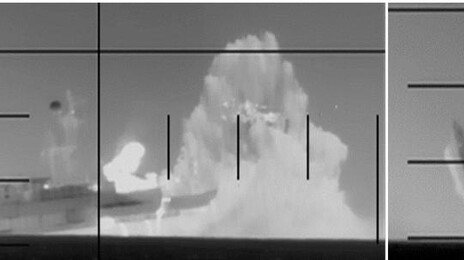
![[사설]“李에 돈 안 줘” 김성태 새 녹취… 사실 여부 철저히 밝혀야](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358945.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