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화문에서/이기홍]일요일이 망가지는 소리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2003년 미국 워싱턴에 연수를 갔을 때 도심 속 드넓은 잔디공원인 내셔널몰을 걸으며 부러웠다. 포토맥 강변의 조깅 코스를 달리는 시민들도 부러웠다. 역시 미국이구나….
그러나 연수와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2009년 말 귀국한 뒤엔 생각이 바뀌었다. 한강변은 포토맥 강변에 비해 조금도 손색없이 잘 가꿔져 있었다. 저물녘 청계천 변을 걸어보니 내셔널몰이 부럽지 않았다.
한강공원에 매료돼 일요일 새벽마다 자전거를 탄다.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달리다 보면 주홍색 다리 너머로 강이 굽이굽이 펼쳐진다. 바다를 향해 달리는 것 같은 장관이다. “더 이상 미국이 부럽지 않다!”고 외치고 싶은 기분이 된다.
하지만 승합차와 트럭을 버젓이 자전거 길로 들여보내는 관리당국과 주최 측의 무례함은 이해하기 어렵다. 탁자 등을 날라야 한다면 뒤에 화물칸이 달린 전기카트를 이용하면 된다. 트럭보다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 정도는 산책로를 양보하는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닐까.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출근한다. 일요일 출근은 신문업 종사자의 숙명이다. 동아일보는 청계천의 시발점인 청계광장 옆에 있다. 가족, 연인들이 한가로이 거니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하지만 그런 평화도 깨지기 일쑤다. 지난 일요일엔 귀를 찢는 듯한 기계음악 소리가 청계광장을 흔들었다. 한 자동차회사 노조 집회에서 발산한 소음이었다. 견디기 힘든 소음이었지만 오후 내내 방치됐다. 문화제라는 명목으로 집회를 열면 집시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제도적 맹점이 빚은 결과다.
청계천의 정취를 깨는 것은 정치성 집회만이 아니다. 특산물 판매행사 등으로 청계광장은 도떼기시장이 되기 일쑤다. 마차들까지 등장해 청계천 일대를 돈다. 마차가 신기해 즐거워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하루종일 종로의 혼잡한 차량들 틈에서 아스팔트를 달려야 하는, 가쁜 숨을 내쉬며 앞말의 꽁지에 머리를 처박은 말들의 겁먹은 눈을 보면서 낭만보다는 안쓰러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휴식을 위한 공원과 위락시설(amusement park)을 혼동하는 이런 부조화의 풍경을 볼 때마다 왜 우리 관리들은 공원을 가만 놔두지 못하고 이벤트나 유희를 만들어 들쑤시려고 안달하는지 한숨이 나온다. 인프라는 선진국 수준이 됐을지 몰라도, 타인의 불편은 안중에 없는 후안무치한 사람들, 그리고 당국의 낙후된 발상을 보면 ‘아직은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더 이상 선진국이 부러울 게 없다”는 자부심이 충만했던 마음이 씁쓸해지는 일요일이다.
이기홍 국제부장 sechepa@donga.com
광화문에서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기고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DBR
구독
트렌드뉴스
-
1
다리 멀쩡한데 “택시비 아끼려” 119 불러… 응급환자는 14%뿐
-
2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
3
‘재명이네 마을’ 정청래·이성윤 강퇴 처리…“분란행위 용납못해”
-
4
뇌진탕 6세 아이 태운 차 마라톤 통제에 막혀…경찰 도움으로 병원에
-
5
동물실험서 ‘만능 백신’ 성공… 코에 뿌리면 코로나-독감 예방
-
6
김민석 “黨, 대통령과 차별화해선 성공 불가능”
-
7
역대급 무관심… ‘국뽕’도 ‘환호’도 사그라진 올림픽[이원홍의 스포트라이트]
-
8
가수 정동원, 오늘 해병대 입대 “자기 자신과의 약속”
-
9
손흥민, 메시와 첫 맞대결서 판정승…7만명 관중 기립박수
-
10
北 당대회서 김정은 총비서 재추대…“누구도 대신 못해”
-
1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
2
“장동혁 사퇴” “분열 행위”…‘尹 절연’ 거부에 원외당협 정면 충돌
-
3
韓 ‘프리덤 실드’ 축소 제안에 美 난색…DMZ 이어 한미동맹 갈등 노출
-
4
다리 멀쩡한데 “택시비 아끼려” 119 불러… 응급환자는 14%뿐
-
5
李 “다주택자 압박하면 전월세 불안? 기적의 논리”
-
6
야상 입은 이정현, ‘계엄 연상’ 지적에 “뻥도 그정도면 병”
-
7
러시아 “韓, ‘우크라 무기 지원’ 동참하면 보복하겠다”
-
8
급매 나오는 강남, 현금부자 ‘줍줍’…대출 막힌 강북은 버티기
-
9
조승래 “8곳 단체장 ‘무능한 尹키즈’…6·3 선거서 퇴출할 것”
-
10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트렌드뉴스
-
1
다리 멀쩡한데 “택시비 아끼려” 119 불러… 응급환자는 14%뿐
-
2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
3
‘재명이네 마을’ 정청래·이성윤 강퇴 처리…“분란행위 용납못해”
-
4
뇌진탕 6세 아이 태운 차 마라톤 통제에 막혀…경찰 도움으로 병원에
-
5
동물실험서 ‘만능 백신’ 성공… 코에 뿌리면 코로나-독감 예방
-
6
김민석 “黨, 대통령과 차별화해선 성공 불가능”
-
7
역대급 무관심… ‘국뽕’도 ‘환호’도 사그라진 올림픽[이원홍의 스포트라이트]
-
8
가수 정동원, 오늘 해병대 입대 “자기 자신과의 약속”
-
9
손흥민, 메시와 첫 맞대결서 판정승…7만명 관중 기립박수
-
10
北 당대회서 김정은 총비서 재추대…“누구도 대신 못해”
-
1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
2
“장동혁 사퇴” “분열 행위”…‘尹 절연’ 거부에 원외당협 정면 충돌
-
3
韓 ‘프리덤 실드’ 축소 제안에 美 난색…DMZ 이어 한미동맹 갈등 노출
-
4
다리 멀쩡한데 “택시비 아끼려” 119 불러… 응급환자는 14%뿐
-
5
李 “다주택자 압박하면 전월세 불안? 기적의 논리”
-
6
야상 입은 이정현, ‘계엄 연상’ 지적에 “뻥도 그정도면 병”
-
7
러시아 “韓, ‘우크라 무기 지원’ 동참하면 보복하겠다”
-
8
급매 나오는 강남, 현금부자 ‘줍줍’…대출 막힌 강북은 버티기
-
9
조승래 “8곳 단체장 ‘무능한 尹키즈’…6·3 선거서 퇴출할 것”
-
10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주애진]꺾이지 않는 ‘벚꽃 추경’설… 추경의 상시화 경계해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2/22/133399113.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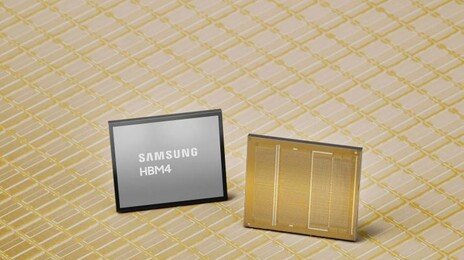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