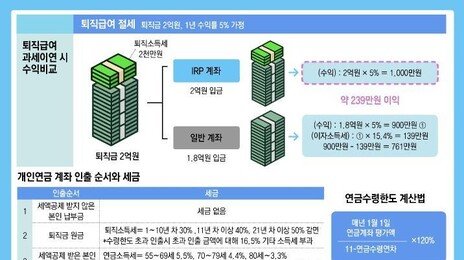공유하기
[사설]구조조정 안 하니 부실기업만 늘어난다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한국은행은 2009년 기준으로 12월 결산 비금융 중소기업 가운데 잠재부실기업이 3479개로 전체의 7.7%에 이른다고 밝혔다. 2002년 3.8%의 두 배 수준이다. 잠재부실기업은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못 미치거나 2년 연속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서비스업 중 음식숙박업(30%) 부동산 및 임대업(27%) 운수업(22%), 제조업에서는 섬유(14%) 전자부품 및 컴퓨터(12%)에 잠재부실기업이 많다. 외환위기 이후 소자본 저(低)기술로 창업한 음식점, 정보기술(IT)붐 때 창업했다가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나빠진 컴퓨터 관련업체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영업적자나 금융부채에 허덕여 상당수가 퇴출될 운명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실업자 발생, 노사 갈등, 연쇄부도를 우려해 한계기업의 퇴출을 꺼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을 때 정부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한다면서도 회생을 위한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잠재부실기업이 더 늘어났다. 정부는 동반성장 정책을 펼 때 성장여력과 재무건전성 등으로 옥석(玉石)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한계기업에 자금이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잠재성장력을 훼손시키는 잠재부실기업의 퇴출을 권고했다. 내년 선거철이 되면 기업 구조조정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퇴출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사설
구독
-

어린이 책
구독
-

횡설수설
구독
트렌드뉴스
-
1
취권하는 중국 로봇, ‘쇼’인 줄 알았더니 ‘데이터 스펀지’였다?[딥다이브]
-
2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3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4
트럼프, 분노의 질주…“글로벌 관세 10%→15%로 인상”
-
5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6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7
‘면직’ 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질주…보행자 칠뻔, 車 2대 ‘쾅’
-
8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9
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관세’…韓 대미 투자, 반도체-車 영향은?
-
10
‘신격호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향년 85세
-
1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2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3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4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5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6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7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8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9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10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트렌드뉴스
-
1
취권하는 중국 로봇, ‘쇼’인 줄 알았더니 ‘데이터 스펀지’였다?[딥다이브]
-
2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3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4
트럼프, 분노의 질주…“글로벌 관세 10%→15%로 인상”
-
5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6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7
‘면직’ 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질주…보행자 칠뻔, 車 2대 ‘쾅’
-
8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9
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관세’…韓 대미 투자, 반도체-車 영향은?
-
10
‘신격호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향년 85세
-
1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2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3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4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5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6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7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8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9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10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2/20/13339269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