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동아광장/윤석민]제주의 청정한 새벽을 걸으며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칼이었다. 도쿄의 속살 같은 우에노 공원. 몇 년 전 가을, 세미나 참석차 도쿄에 갔다가 짬을 내서 그 공원 한편에 위치한 일본 국립박물관을 들렀다. 그곳에 칼이 있었다. 베네딕트가 말한 사무라이의 칼, 센고쿠(戰國)시대를 끝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칼, 태평양 군도의 열사와 밀림에서 ‘옥쇄한’ 병사들의 칼, 가미카제 조종사가 마음에 품고 미시마 유키오가 배를 갈랐을 그 칼이었다. 조금의 더함도 덜함도 없이 사람을 베는 용도에 충실한 푸른 날의 닛폰도(日本刀)를 마주하며 우리가 과연 이 칼을 넘어설 수 있을까 몸서리쳤다.
그 기분은 서유럽의 도시들을 여행할 때 느끼던 자괴감과 비슷한 것이었다. 런던 템스 강 건너편에서 바라보던 장중한 의사당과 그것이 상징하는 원형적 의회민주주의, 자유와 지성이 샹송처럼 흐르던 샹젤리제, 그 길을 유유히 걷다 보면 위용을 드러내는 개선문, 그리고 이 모든 게 시작된 포로 로마노(Foro Romano)의 고색창연한 유적들까지. 자유, 인권, 국가, 신성, 인문의 가치들을 물화(物化)시킨 이 문화적 자산들은 비록 제국적 침탈이 가져다준 본원적 축적의 결실이었을망정, 시간의 누적 속에 찬란한 빛을 더해가고 있었다. 이들이 눈부신 만큼, 이러한 축적의 경험이 없는 우리가 같은 반열의 선진국을 꿈꾸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지 망연해지곤 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중원을 넘어 서북 서남 동북 지역을 아우르며 국가를 통합하고, 방대한 국토와 인력의 잠재력을 끌어 모아 인류사에 유례없는 초대(超大) 자본주의로 치달을 때 우리가 설 자리는 과연 어디인가. 오성홍기가 휘날리던 베이징 톈안먼 광장, 상혼의 열기로 펄펄 끓던 상하이 난징둥루(南京東路)에서 엄습하는 한기에 몸을 떨던 이유였다.
이들에 비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 삼천리 화려강산? 작은 반도, 그것도 반 토막 난 산하, 수천만의 인구가 비좁게 디디고 선 이 땅이 너무도 소중한 우리의 터전임에 틀림없으나 과연 세계에 내세울 만한 자산이라 할 수 있나. 반만년의 찬란한 역사? 대륙과 대양을 잇는 브리지로서 끊임없이 외세에 시달리다 급기야 국권을 상실하고, 한 민족끼리 60년째 총부리를 겨눠온 이 역사를 유구하다 할지언정 찬란하다 할 수 있는가. 세계에서 제일가는 인력? 세계화시대에 시대착오적 순혈종족 우월주의도 유분수지 싶다. 우리 역시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한데 섞여 엎치락뒤치락 살아가는 여느 사회의 하나일 터이다. 위로 소모적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부터, 삶의 주변에서 흔히 부닥치는 거친 성정의 사람들이며 버릇없는 아이들까지 “세계 제일”이라 지칭하긴 분명 무리다.
좁은 소견에 아무리 돌아봐도 뭐하나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우리의 모습이었다. 초일류 선진국가의 벽은 높디높고 우리가 가진 건 너무 작았다. 그러기에 국민소득 2만 달러 언저리가 우리의 정점이려니, 여기까지 온 것만도 다행이려니 했다.
하지만 이제 필자는 생각을 고치려 한다. 우리에게도 칼이 있었다. 온몸의 에너지로 폭발하듯 빙판을 질주하던 스케이트 날이 그 표상(表象)이었다. 그것은 전쟁과 살생이 아닌 평화와 상생의 칼이었다. 그 역동적인 칼 동작을 우리 젊은이들이 극한까지 밀고 갔을 때 우리 작은 땅도 함께 활짝 펼쳐졌다. 어디 그뿐인가. 잠시 잊고 있었을 뿐, 우리에게 숨 막히는 문화자산이 있었음에야.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 연기, 그 완미(完美)한 동작과 표현들 속엔 더도 덜도 아닌 오천년 세월, 삼천리 굽이굽이에 켜켜이 쌓여온 정과 한의 미학이 스며있었다. 너무도 고와서 끝내 서러운 우리의 춤사위였다. 감동이 그리도 컸던 이유일 것이다.
겨울올림픽이 끝난 지도 거의 3주, 밴쿠버는 이제 기억에서 멀어져 간다. 우리 사회는 채 피워보지도 못한 13세 여중생의 안타까운 죽음과 흉악스러운 살인용의자의 체포 및 수사속보로 연일 어수선하다. 맑은 눈이 사슴 같던 법정 스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 세종시건 4대 강이건 무엇 하나 풀리는 일이 없는 가운데 정국은 침묵의 바다처럼 괴괴하다. 이제 4월이 오고 5월이 오면 선거전까지 겹쳐, 그 바다에 얼마나 고단한 태풍이 몰아치려나. 사람들의 거친 행동이며 아이들의 지독히 버릇없는 언사도 여전하다. 사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기쁘고 좋은 일보다 슬프고 답답한 일이 많은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더는 그 어떤 자격지심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워크숍 참석차 찾은 제주 중문, 그 청정한 새벽 바닷가엔 유채꽃이 만발해 있었다. 온천지가 꽃밭이었다. 그 사이를 걸으며, 수려한 이 산하, 작은 돌 하나에도 사연이 깃든 이 역사, 넘치는 에너지를 종종 주체 못하지만 근본이 선량한 이 국민의 일원임을 다시 한 번 감사했다.
윤석민 객원논설위원·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 younsm@snu.ac.kr
동아광장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컬처연구소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트렌드뉴스
-
1
가짜 돈 내민 할머니에게 7년째 음식 내준 노점상
-
2
“잠만 자면 입이 바싹바싹”…잠들기 전에 이것 체크해야 [알쓸톡]
-
3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 당해
-
4
주한美사령관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불쾌감
-
5
이정현, 공관위원 이력 논란에 “이유여하 막론 송구…책임 지겠다”
-
6
[단독]타슈켄트 의대 한국인 유학생들, 국시 응시 1년 밀릴 듯
-
7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8
“대구에 이렇게 눈이 온다고?” 시민들도 놀란 ‘2월 폭설’
-
9
우원식 국회의장 “처음으로 의장단 아닌 사람이 사회…아쉬워”
-
10
김태희 한남더힐 7년만에 시세차익 85억…127억 매수자는 ‘이사람’
-
1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2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3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4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5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6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7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8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9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
10
주한美사령관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불쾌감
트렌드뉴스
-
1
가짜 돈 내민 할머니에게 7년째 음식 내준 노점상
-
2
“잠만 자면 입이 바싹바싹”…잠들기 전에 이것 체크해야 [알쓸톡]
-
3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 당해
-
4
주한美사령관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불쾌감
-
5
이정현, 공관위원 이력 논란에 “이유여하 막론 송구…책임 지겠다”
-
6
[단독]타슈켄트 의대 한국인 유학생들, 국시 응시 1년 밀릴 듯
-
7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8
“대구에 이렇게 눈이 온다고?” 시민들도 놀란 ‘2월 폭설’
-
9
우원식 국회의장 “처음으로 의장단 아닌 사람이 사회…아쉬워”
-
10
김태희 한남더힐 7년만에 시세차익 85억…127억 매수자는 ‘이사람’
-
1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2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3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4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5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6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7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8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9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
10
주한美사령관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불쾌감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동아광장/이은주]AI 기본법 최초 시행, 신뢰성 고민이 먼저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2/20/133392669.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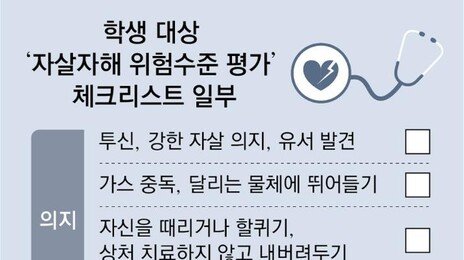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