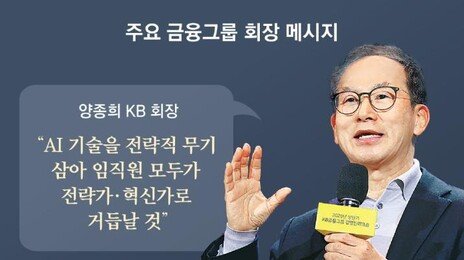공유하기
[아시아 포커스/로저 코언]개방-자유 목마른 이란 젊은이
-
입력 2009년 2월 13일 02시 59분
글자크기 설정

“오래전부터 진짜 미국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며 악수를 청했다.
“그래서 (미국인을 만나보니) 어때요?”
“일단은 멋져요. 하지만 당신 정부는 나를 비관적으로 만들었어요.”
30년간 중단된 (미국과 이란의) 대화는 불신을 낳았다. 1988년 미국이 이란항공 여객기를 실수로 격추해 290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은 아직도 이란에서 거론된다. 음모론도 여전히 많다. 수니파 탈레반은 이란의 시아파를 괴롭히기 위해 미국이 만들어낸 조직이라는 음모론도 여기에선 거의 사실처럼 받아들인다.
또 다른 대원인 자파르 데흐가니(22) 씨가 나섰다. “우리는 M-1 소총으로 우리 영토를 지킬 수 있어요. 신은 우리 편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1980∼88년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숨진 젊은 이란병사 수십만 명이 묻혀있는 무덤을 가리켰다. “내가 그때 있었다면, 나도 저기 누워 있을 겁니다.”
이슬람혁명 30주년(11일)을 맞은 이란에는 지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테헤란에 손을 내미는 이유에 대해 의심이 팽배하다. 하지만 그만큼 바람도 많다. 30세 이하의 이란인 대부분은 내가 만난 병사처럼 바깥세상과, 특히 신화처럼 모든 힘을 가진 듯 보이는 미국과의 접촉을 갈망하고 있다.
‘거대한 사탄(이란이 미국을 지칭했던 말)’은 매력을 발산하는 힘도 세다. “미국에 죽음을!”이라는 말은 상점에서 틀어놓는 배경 음악처럼 소음이 됐다.
혁명은 샤(혁명으로 무너진 이란 왕조)의 무자비한 비밀경찰로부터 이란인들을 구해냈다. 하지만 모든 혁명이 그렇듯 결과는 실망스럽기도 했다.
이란은 내부적으로는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 이란 여성들은 때론 ‘숨이 막힌다’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목에 손을 갖다댄다. 생계를 잇기 위해 하루 12시간을 일하는 고된 남자들은 절망의 신호처럼 히스테리 섞인 웃음을 터뜨리곤 한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최고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도전에 직면해있다. 이들도 실업률 14%, 물가상승률 26%, 올해 3분의 1로 줄어들 석유 수입 앞에서 개방이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이란의 겉모습은 평화롭다. 하지만 속으로는 당초 혁명이 약속했던 더 많은 자유에 목말라 있다. 그런데 개방은 위험을 뜻한다. 미국을 줄기차게 비난해 온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최근 미국 정부에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두고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그의 제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을 부드럽게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데흐가니 씨는 음식을 권하면서 “왜 미국은 자기 나라 일에나 신경 쓰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쟁을 하나요”라고 물었다.
데흐가니 씨 아버지가 돈벌이에 좋다며 아들에게 혁명수비대에 남아 있으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형적인 이란 젊은이다. 이란인들은 투자를 원하며, 자동차에 열광한다. 핵무기(nukes)는 잊어버리자. 나이키(Nikes) 신발을 생각하자.
며칠 뒤 테헤란의 지하철을 탔다. 젊은이들이 “미국인이다”라며 나를 가리키며 환호성을 질렀다. 적대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단지 호기심 때문이었다.
당시 내 옆에 서 있던, 히잡으로 얼굴을 가린 아가씨가 내 눈을 응시하더니 영어로 물었다. “어디에서 왔나요?” “뉴욕에서요.”
로저 코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