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로 33년간의 외교관 근무를 마친 윌리엄 번스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 외교안보 전문지에 소개한 얘기다. 다음 부임지를 두고 매년 두 차례 인사 홍역을 치르는 한국 외교부의 현실을 볼 때 곱씹어볼 대목이 많다.
‘특명전권대사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직전의 칼럼을 두고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았다. 대사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시간과의 싸움이 심화되는 건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특명전권대사의 정신을 되새기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렵지만 그 출발점은 슐츠의 충고처럼 외교관 스스로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명심하는 일이어야 할 것 같다. 일을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인사권자와의 관계, 자녀 교육 목적 등의 이유로 부임지가 정해지는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장관만 쳐다보다가 인사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나라와 국민을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법이다.
2012년 10월 방한했던 빌뤼 쇤달 전 덴마크 외교장관은 “현대 외교관의 역할은 국가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자국과 주재국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엮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스콧 와이트먼 전 주한 영국대사는 “외교관이 단순한 분석가이던 시절은 지났다. 영국의 장관이나 납세자들은 외교관이 협상가이자 (양국을 잇는) 전달자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외교관은 주재국 국민에게 신뢰받는 자국의 대변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 만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변화된 환경을 적극 활용하라고 했다. 그는 “더 적은 시간을 들이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최신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며 “동시에 전통적인 형태의 외교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결합하는 창의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럴수록 해외 외교 현장은 긴밀한 현지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교부 본부는 이를 민첩하게 활용하는 유기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자원도 없고 강대국 사이에 끼여 있는 만큼 스스로 안위를 지켜야 한다는 외교관들의 사명감도 필요하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야자수만 따먹어도 행복한 처지가 아닌 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은가.
김영식 정치부 차장 spear@donga.com
광화문에서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글로벌 포커스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동아리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이천수, 선배 황선홍도 저격 “정몽규와 책임지고 나가라”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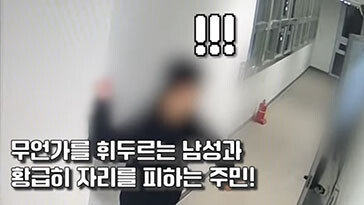
흉기로 이웃 위협한 男…‘나무젓가락’이라 발뺌하다 덜미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하면 주식·부동산 오른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광화문에서/김상운]독서율 역대 최저 해법… 수요자 중심으로 풀어야](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4/04/26/124677676.1.png)
![[광화문에서/장관석]“尹의 격노” 2년… 경청이 변화의 시작](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4/04/25/124661776.2.jpg)
![[광화문에서/박민우]중앙은행들의 新골드러시에 한국은행이 뛰지 못한 이유](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4/04/24/124641985.2.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