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 끝자락 연출한 산과 바다의 파노라마에 넋 잃어
제주도 한라산 초입 어리목광장(970m)에 가면 큰부리까마귀들을 만날 수 있다. 생선가시처럼 앙상한 나뭇가지에 철퍼덕 앉은 놈들은 “까악, 까악” 무심하게 울어댔다.
2월 중순의 한라산(1950m). 겨우내 산을 휘감았던 순백의 설면이 나른한 햇볕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씩 속살을 드러내는 때다.
어리목광장을 지나 등산로로 들어서자 양편으로 초록빛 산죽이 흐드러지게 펼쳐져 있다. 포근한 햇살까지 더해지자 무슨 식물원에 들어선 듯 이국적이다.
상념도 잠시. 침목으로 만든 가파른 계단을 오르다 보니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땀이 이마에 송송 맺히고 등산객들은 하나둘 잠바를 벗는다. 서울 청계산과 같은 가파른 계단 길을 20여 분 오르니 눈이 녹아 질퍽한 산길이 이어진다. 어리목광장을 출발한 지 1시간여. 발끝에 힘을 주고 미끈한 눈길을 올라 사제비동산(1400m)에 닿았다.
등산로 왼편에 있는 사제비약수터에서 목을 축이자 말 그대로 살 것 같았다. 인근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한 다음 본격적인 ‘설피’ 체험이 이어졌다.
설피는 눈에 빠지지 않게 바닥을 넓적하게 만든 신발. 체중에 맞게 세로 70cm, 가로 20cm가량의 설피를 신자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던 눈밭 위를 사뿐히 걸어 다닐 수 있어 신기했다. 동행한 노스페이스와 고어코리아 직원들도 동심으로 돌아간 듯 저마다 눈밭에 발자국을 찍기에 바빴다.
윗세오름(1700m)으로 가는 길은 마치 꿈결 같았다.
광활하게 펼쳐진 설원은 스키장의 인공 눈에 비할 바가 아니다. 주위엔 이미 푸른빛을 띤 봉우리들이 거대한 자태를 드러냈다. 그 한편에 현무암으로 엉겨 치솟은 백록담이 당당하게 서 있다.
뒤를 돌아보니 설원 너머 제주 시내의 끝자락이 보이고 그 멀리 끝을 알 수 없는 푸른 바다와 하늘이 아득하게 펼쳐진다. 아찔한 현기증마저 나는 절경에 등산객들의 탄성이 이어진다.
어느새 오후 4시. 햇볕은 희미하고 바람마저 날카롭다. 아쉽지만 백록담을 뒤로하고 영실코스로 하산 길을 잡았다.
그곳에는 ‘한국의 그랜드캐니언’ 같은 절경이 이어졌다.
병풍바위는 산허리를 휘감으며 위압적으로 둘러쳐져 있고, ‘오백나한’ 또는 ‘오백장군’이라 불리는 수백 개의 기암은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하늘을 향해 머리를 올리고 있다.
기괴한 검은 바위들과 순백의 설면이 어우러지니 힘이 넘치는 수묵화 한 편을 보는 듯했다.
장관을 뒤로하고 영실휴게소에 도착하니 5시 30분쯤. 7시간에 걸친 산행의 마침표였다.
멀리서 큰부리까마귀들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제주=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내가요즘읽는책
구독-

데이터 비키니
구독
-

선넘는 콘텐츠
구독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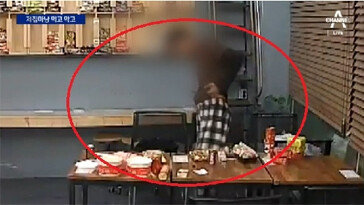
무인점포서 잠옷 입고 8시간 무전취식…경찰 출동에 냉장고로 문 막기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엄마 나 잡혀왔어”…AI로 딸 목소리 합성한 보이스피싱범 검거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추미애 “내가 국회의장 되면? 대권주자인 이재명에 도움될 것”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가 요즘 읽는 책]박지향-'고고학적 도둑질'](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