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없다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보고는 많은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줬다. 곧 자신의 질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던 난치병 환자들은 실망감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환상이 깨지는 두려움 때문인지 사회 일각에서는 진실을 밝히는 일에도 반발을 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거짓으로는 국익도 없으며 환자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줄기세포 연구의 정직한 현주소를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수정란 유래 또는 복제배아 유래), 성체줄기세포, 제대혈 줄기세포 등 그 종류가 많으며, 이 분야에 수십 팀의 국내 연구진이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며 좋은 논문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황 교수팀이 이끌었던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줄기세포의 여러 분야 중 일부분이다. 이 팀은 복제에는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나 줄기세포 확립 및 배양에는 필요한 기술이 없어 다른 연구팀의 도움을 얻어 연구를 진행했다. 따라서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 연구 전반에 대해 국민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현재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특정 세포로의 분화(질병치료용 세포로 만드는 과정) 또는 줄기세포 효과 검증을 위한 동물 실험 단계에 있다. 따라서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가 설령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환자에게 쓰이려면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게다가 복제로 인한 유전적 안정성까지 확인하려면 오랜 연구기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설혹 복제된 배아줄기세포가 있다고 해도 기초연구용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환자 치료에는 당장 적용할 수 없다. 성체줄기세포도 그것이 보편적인 치료 수단이 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다.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는 각각 장단점이 있고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세계의 과학자들은 이 두 분야에 같은 비중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줄기세포 연구가 동물모델 연구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그 가능성 때문에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은 어마어마한 투자계획의 실행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지원체제도 구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비의 몇십 배가 넘는 연구비를 책정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 때문에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늦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의 연구 수준은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뒤지지만, 수정란 유래 배아줄기세포의 확립 및 배양, 그리고 성체줄기세포의 일부 기술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서울에서 열린 국제줄기세포 심포지엄에 참가한 제대혈 줄기세포의 선구자 할 브록스마이어 박사는 배아줄기세포 기술을 배우기 위해 자신의 제자를 몇 개월간 한국에 남기고 갔을 정도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줄기세포의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연구에 대한 고삐를 늦출 수가 없다. 21세기 난치병 치료, 신약 개발, 발생 연구 등에서 큰 희망이 될 줄기세포 연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환자들에게 환상이 아닌 건전한 희망을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동욱 연세대 의대 교수 국제줄기세포학회 위원
과학세상 >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부동산 빨간펜
구독
-

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과학세상/정인재]‘항생제 공포’에서 벗어나려면](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6/01/14/696232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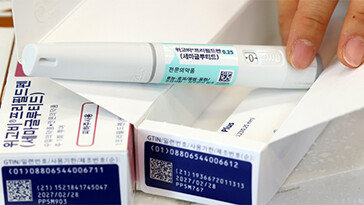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