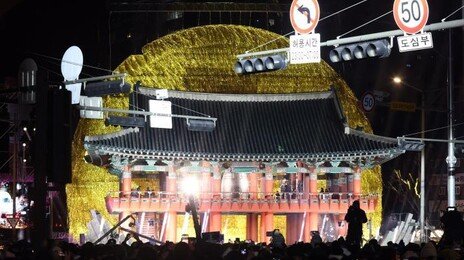공유하기
[안경환교수의 법과 영화사이]사계절의 사나이
-
입력 2000년 8월 24일 17시 48분
글자크기 설정

감독: Fred Zinneman
원작: Robert Bolt
출연: Paul Scofield. (Thomas More역)
소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역사의 인물은 많다. 그러나 그 중에 법률가는 드물다.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거는 법률가가 있다면 반드시 후세의 구원을 받는다. 토마스 모어(Thomas More, 1478~1535)는 법률가의 수호 성인이다. 그는 단순한 법률가가 아니라 '통합학문'의 대가였다. 정치학, 외교학, 철학, 문학, 신학 등 그의 이름이 영구히 각인된 학문의 영역은 무수하다. 지성사에서 뿐만 아니라 제도사에서도 모어가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하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영국사상 가장 유명한 국왕인 헨리 8세 ( 1509~47재임) 궁정의 외교관이자 법률가로서 유럽전체의 정치, 외교를 주도했던 사람이다.
흔히 '이상향'으로 통칭되는 '유토피아'(Utopia) 1515~16)라는 단어도 모어의 창작이다. 플라톤의 『공화국』, 성 오거스틴의 『신국론』 (413~27), 단테의 「군주론』(1308?) 등 앞선 유토피아론을 바탕으로 모어가 품은 꿈을 실은 이 저술은 후세 대가들에게 전승되었다. 다니엘 디포(Daniel Defoe)의 『로빈슨 크루소』(1719), 조너선 스위프트(Jonathan Swift)의 『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 1726),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뉴 아틀란티스』(1624), 에드워드 밸라미(Edward Bellamy)의 『되돌아다보니』( Looking Backward, 1888)등으로 이어진다. 한때 사회주의자들은 모어를 최초의 근대적 사회주의자로 숭앙하기도 했다. 유토피아 문학이 성급하게 쓴 미래의 영신곡(迎新曲)이라면, 반 유토피아 문학은 성급하게 쓴 암담한 조사(弔辭)이다. 올더스 헉슬리(Auldus Huxley)의 『용감한 신세계』(Brave New World, 1932) 나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년』 (1949)은 모어가 사용한 장미 빛 대신 잿빛으로 화폭의 채색을 바꾼 것이다.
영화 『사계절의 사나이』(A Man For All Seasons)는 법률가 성인, 모어의 일생을 초상화처럼 압축한 수작이다. 또한 이 작품은 혁명을 막은 방패라는 자랑스런 영국법의 진수를 배우기에 더없이 좋은 영상교재이다. 영화의 제목은 영화의 원작인 Robert Bolt(1924-) 의 모어 전기(1960)의 제목을 차용했지만 그 연원은 보다 깊다. 이 별칭은 모어의 박학 다식에 경탄을 금치 못하던 지적 교우, 네델란드의 철학자 에라스무스가 붙여준 것이다.
감옥의 창을 통해 사계절의 변화를 조망하는 모어의 뒷모습에도 원칙과 소신의 당당함이 풍긴다. 가히 영악스러울 정도로 기지가 뛰어난 법률가, 그러면서도 원칙에 기꺼이 목숨을 거는 정의의 사도, 자녀의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이상적인 가장인 그는 속인과 성인의 결합체였다. (영화에서도 딸과 라틴어로 지적교류를 하는 모습을 비친다.)
영화가 시작하면서 테임즈 강을 황급히 노를 젓는 전령이 모어의 저택에 도착한다. 밀랍(蜜蠟)으로 봉인(封印)된 서한이 도착한다. 밀랍 봉인(seal)은 위조 방지를 위해 문서에 부착하여 사용하던 법적 관행이다. 영국법은 밀랍봉인에 대해 특수한 효력을 부여했고 그 법리는 오늘날 미국계약법에도 전승되고 있다.
국민의 기림을 받던 울지(Woolsey)경의 서신이다. 죽어 가는 울지의 침상을 방문하는 모어와 대조적으로 바깥에서 도열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분주스럽다. 이어 모어는 울지에 이어 나라 최고의 관직인 로드 챈슬러 (Lord Chancellor)에 등용된다.( 이 부분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영화에서처럼 모어가 울지의 사망으로 로드 챈슬러의 자리를 승계한 것은 아니다.)
국왕 헨리 8세는 모어의 도움을 청한다. 울지야말로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모어의 칭송을 맞받아 "그런 자가 왜 나를 배신했어?"라고 국왕은 반문한다. 남계(男系) 왕통의 승계가 지상의 과제였던 헨리는 "벽돌처럼 메마른" (as barren as a brick)'둘치' 캐서린과 이혼하고 젊은 앤을 왕비로 맞아들일 결심이다. 교황이 이혼을 허가하지 않자 헨리는 비상조치를 강구한다. 법률가를 동원하여 자신의 이혼이 적법함을 인정하는 법리를 개발하고, 여의치 않으면 속권(俗權)과 교권(敎權)이 분리되는 새로운 법제를 창설할 생각이다.
그러나 모어는 교황과 교회 주권의 신봉자였다. 국왕과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나 마지막에는 정면으로 충돌하고 사임하게 된다. 녹봉이 없는 생활, 규모를 줄이나 심한 재정난에 봉착한다. 헨리는 국왕이 교회의 수장을 겸하는 법을 선포한다. 헨리는 국왕이 동시에 영국교회의 수장이 되는 수장령(Supremacy Act)을 선포한다. 영국국교(성공회)의 탄생이다. 자신이 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보유한 절대권력자가 된 것이다. 자신의 이혼을 허용하는 법을 자신이 제정한 것이다.
충실한 행정장관, 크롬웰이 모든 신민(臣民)에게 국왕이 교회의 수장임을 인정하는 선서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모어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선서를 거부하고 1년 이상 런던 타워에 수감되었으나 소신을 바꾸지 않았다. 모어가 선서를 거부한 것은 거부한 것은 그것은 신에 대한 맹세이기 때문이다. 선서 후에 거짓 사실을 증언하면 신에 대한 거짓이다. 위증죄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다. 선서와 위증제도가 근대법의 한 요소로 자리잡은 것은 교회법과 세속법의 결합이다.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교회법의 전통이 없는 나라에서 선서하고도 위증하는 사례가 높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모어의 영향력 때문에 한동안 방관하던 헨리는 자신의 권력이 안정되자 반역죄로 기소한다. 사악한 리처드 리치가 위증에 나선다. 리치는 모어가 동정은 아끼지 않았지만 불신해 마지않던 인간이었다. 챈슬러가 되면서 모어는 어느 여인이 선물 겸 뇌물로 공공연하게 건네준 이태리 제 은그릇을 리처드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감읍해 마지않는 리처드에게 그걸로 무엇하겠느냐는 질문에 리처드는 "옷이나 사 입고 구직에 나서겠다."라고 답한다. 자신에게 일자리를 달라는 부탁에 "법원은 부패한 곳이다, 몸을 담을 곳이 못되니 선생이 되라" 라고 충고한 바 있다. 그런 리치가 이제 크롬웰의 하수인이 되어 모어의 목을 노리는 것이다. 리치는 그가 책을 차입해주러 모어의 감방에 갔을 때 모어는 국왕이 교회를 장악한 사실을 비판했다고 증언했다. 이 위증의 대가로 리치는 웨일즈 검찰총장의 자리를 얻었다.
리치의 증언에 대한 모어 자신의 반론은 상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다. 즉 자신의 가족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한 내가 왜 하필 리치에게 그런 말을 할 리가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리치가 갑자기 검찰총장으로 승진한 사실에서 보듯이 증언자의 순수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신빙성에 대한 탄핵을 곁들였다. 법원의 구성은 이례적으로 판사 7인, 19인의 참심(councillors), 16인의 배심으로 구성되었다. 재판은 Westminster 홀에서 열렸고, 자유로운 심증의 기회를 박탈당한 배심은 "독립된 장소에게 토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면서 현장에서 유죄를 선고한다.
공개법정에서 모어가 한 최후의 연설은 후세에 성인(聖人)의 지위를 예약하는 순교(殉敎)의 변이다. 국왕의 속권이 교권을 겸하는 헨리의 수장령(Act of Supremacy)은 신과 교회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기독교인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역죄에 대해서는 구성요건 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해한다. "국왕의 충실한 신하, 그러나 그보다 먼저 신의 충복이다."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그는 "재판에서의 침묵은 기껏해야 불분명한 것이다. 결코 침묵을 근거로 반역의 사실을 추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왕의 행위를 동조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라면서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을 강론한다. "법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 (law requires more than assumption, it requires facts)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법리는 위증 앞에 무의미하게 무너진다. 국왕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형의 집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도끼 날을 가는 소리가 형장 밖에 서도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당초에는 4가지 조목으로 기소했으나 반역죄(high treason)만 남기고 나머지는 문제삼지 않았다.
1935년 교황 피우스 11세는 모어를 성인으로 추서했고 그는 흔히 법률가의 수호성인으로 기림 받고 있다. 모어는 역사상 가장 유능한 형평법원장이었다. 국가의 최고관직인 '로드 챈슬러'( Lord Chancellor)의 직책 중에 중요한 일은 형평법(equity)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배심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영국의 법제 아래서 형평법원은 '국왕의 양심'을 대리하여 그야말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한 구제를 부여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그만큼 형평법은 남용될 여지가 크다. 제대로 쓰면 자비(mercy)가 될 수도 있지만 남용되면 자의(恣意)가 되기 십상이다. 그가 직책에 오를 때 산적했던 미제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챈슬러의 처리에 불만을 품지 않았다고, 다소 과장되게 전해진다.
이 영화의 부수적 효과는 영국 사상 가장 유능한 형평법원장으로 평가받는 모어의 입을 통해 근대 영국법의 맹아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위험한 인물을 체포하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악마에게도 무죄의 추정과 '법의 보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단호하게 설법한다. 사위 로퍼는 악마에게는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어의 대답은" 이 나라는 방방곡곡에 법의 수목이 심어져 있네. 그것은 신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법이야. 만약 그 나무를 베어 버린다면 이 땅에 불어닥칠 광풍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악마에게도 '법의 보호'를 인정하겠네." (This country's thick with laws from coast to coast - man's laws not God's -and if you cut them down, d'you really think you could stand up right in the winds that would blow then? . . . Yes, I'd give the Devil benefit of the law, for my own safety's sake."
그러나 그 법의 방풍림은 국왕을 맞아서는 효험을 펴지 못했다.
자신을 기소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운명을 맞았다. 크롬웰은 몇 년 이내에 정치적 책략의 희생물이 되어 목이 잘렸다. 다만 리처드만 침대에서 죽는 천수를 누렸지만 역사에서는 영원히 죽었다. 가장 사악한 인간에게는 도끼 세례도 아까웠던 모양이다.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ahnkw@plaza.snu.ac.kr
바다이야기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
-

횡설수설
구독
-

전문의 칼럼
구독
-

비즈워치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