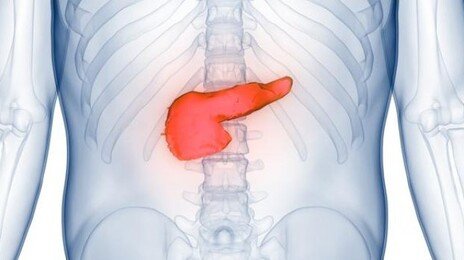공유하기
[의료분쟁 25시]의료분쟁의 블랙박스 ‘진료기록지’
-
입력 2009년 5월 11일 02시 57분
글자크기 설정

기록조작-과실 의혹 눈초리
2008년 7월 24일 대법원은 병원 진료기록의 허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일어났는데 진료기록에 산소포화도 모니터 결과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확실히 해서 다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A 군은 수술 후 6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다. 병원이 제출한 진료기록에는 이 기간에 혈중 산소포화도 모니터 결과가 빠져 있었다. 뇌가 산소 부족 때문에 손상됐고 이에 앞서 산소 감소를 시사하는 임상상태가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빠진 셈이다.
자료 누락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검사를 했지만 기록을 하지 않았거나, 검사를 하고 기록도 있지만 검사 결과가 공개되면 불리해지니 누락시킨 것이다.
첫 번째 경우라면 의료과실이다. 세 번째 경우라면 진료기록 조작이므로 ‘입증 방해’에 해당한다. 두 번째 경우라면 병원이 모니터링 결과지를 찾아 제출하면 된다. 대법원은 세 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은 고법에서 재심 중이다.
대법원의 결정에는 ‘진료기록이 조작됐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바꿔놓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진료기록지를 접하는 대부분의 환자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다. “나중에 바꿔 써놓지 않았을까”라고. 이는 의료인만이 진료기록의 작성·수정·보관에 대한 독점권이 있고, 따라서 남몰래 고쳐놓는 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진료기록 조작 우려는 간혹 현실화되기도 한다. 그래서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진료기록지를 빨리 손에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만일 진료기록지가 조작됐다면 의료소송에서 승소하기는 불가능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A 군의 경우처럼 말이다. 병원이 기록 누락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 A 군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또 손으로 진료기록을 쓰는 병의원에서는 진료기록의 글자체 모양이나 크기, 문장의 위치와 형태, 필기구 특성 등을 고려해 사후 추가 기입했는지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 진료기록을 컴퓨터로 기입하는 ‘전자차트’라면 이런 추론이 불가능하지만 서버에 남아있는 ‘로그기록’을 확인해볼 수 있다.
기록지는 분쟁 시작이자 끝
진료기록지는 ‘의료분쟁의 시작이자 끝’으로 불린다. 중요한 만큼 진실하게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료기록지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 “의료인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 간다”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내과의사 출신인 이동필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선량한 의사마저 피해자로 만드는 것은 바로 ‘감추고 은폐하려는’ 의료계의 관행”이라고.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성매매 특별법 시행 논란 : 각계 표정-주한미군 >
-

동아광장
구독
-

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반도체 포고문’ 기습 발표…“결국 美 생산시설 지으란 것”
-
2
‘정년 65세 연장’과 맞바꾼 버스파업 철회…혈세로 비용 메워야
-
3
탄산음료 제쳤다…한국인 당 섭취식품 1위는 ‘이것’
-
4
美,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한국은 제외
-
5
아시안컵 8강전 가시밭길…한국 U-23 대표팀, 우승 후보 호주와 격돌
-
6
靑 ‘1기 참모진’ 개편 초읽기…정무수석 우상호 후임에 홍익표 유력
-
7
[단독]이혜훈 장남, 국토부 조사 끝나자마자 분가…“치밀한 수법”
-
8
이병헌 ‘미모’ 자랑에 美토크쇼 진행자 테이블 치며 폭소
-
9
李 “중국발 미세먼지 걱정 안 해” 11일만에…‘관심’ 위기경보 발령
-
10
국힘 “이혜훈, 아들들 증여-병역 자료 제출 거부…청문회 무의미”
-
1
한동훈은 생각 없다는데…장동혁 “재심 기회 줄 것”
-
2
장동혁, 단식 돌입…“與,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
3
李대통령이 日서 신은 운동화는 75만원짜리…“수행비서 신발 빌려”
-
4
[송평인 칼럼]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자격
-
5
90분 최후진술 尹 “이런 바보가 쿠데타하나”… 책상치며 궤변
-
6
[사설]딱하고 민망했던 尹 최후진술
-
7
[사설]‘대선 후보 날치기 교체’ 떠올리게 한 한밤 한동훈 기습 제명
-
8
국힘 “이혜훈, 아들들 증여-병역 자료 제출 거부…청문회 무의미”
-
9
‘정년 65세 연장’과 맞바꾼 버스파업 철회…혈세로 비용 메워야
-
10
정청래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수사-기소 완전분리 의지 밝혀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반도체 포고문’ 기습 발표…“결국 美 생산시설 지으란 것”
-
2
‘정년 65세 연장’과 맞바꾼 버스파업 철회…혈세로 비용 메워야
-
3
탄산음료 제쳤다…한국인 당 섭취식품 1위는 ‘이것’
-
4
美,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한국은 제외
-
5
아시안컵 8강전 가시밭길…한국 U-23 대표팀, 우승 후보 호주와 격돌
-
6
靑 ‘1기 참모진’ 개편 초읽기…정무수석 우상호 후임에 홍익표 유력
-
7
[단독]이혜훈 장남, 국토부 조사 끝나자마자 분가…“치밀한 수법”
-
8
이병헌 ‘미모’ 자랑에 美토크쇼 진행자 테이블 치며 폭소
-
9
李 “중국발 미세먼지 걱정 안 해” 11일만에…‘관심’ 위기경보 발령
-
10
국힘 “이혜훈, 아들들 증여-병역 자료 제출 거부…청문회 무의미”
-
1
한동훈은 생각 없다는데…장동혁 “재심 기회 줄 것”
-
2
장동혁, 단식 돌입…“與,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
3
李대통령이 日서 신은 운동화는 75만원짜리…“수행비서 신발 빌려”
-
4
[송평인 칼럼]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자격
-
5
90분 최후진술 尹 “이런 바보가 쿠데타하나”… 책상치며 궤변
-
6
[사설]딱하고 민망했던 尹 최후진술
-
7
[사설]‘대선 후보 날치기 교체’ 떠올리게 한 한밤 한동훈 기습 제명
-
8
국힘 “이혜훈, 아들들 증여-병역 자료 제출 거부…청문회 무의미”
-
9
‘정년 65세 연장’과 맞바꾼 버스파업 철회…혈세로 비용 메워야
-
10
정청래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수사-기소 완전분리 의지 밝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