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기자의 스포츠 인생극장]<9>프로야구 삼성 류중일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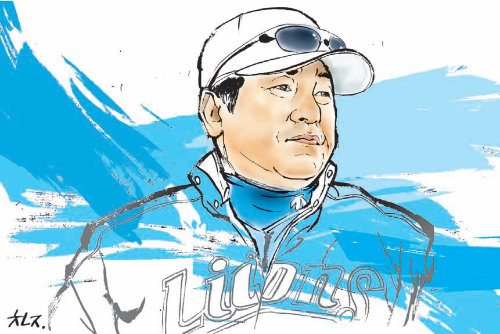
○ “연봉 억수로 많이 올랐던데. 좋겠네”
류 감독은 지난해 삼성을 3년 연속 통합 챔피언으로 이끈 뒤 계약금 6억 원과 국내 프로야구 사령탑 최고인 연봉 5억 원으로 3년 재계약했다. 주위의 부러움을 샀던 그는 중증 장애인 돕기에 2억 원을 쾌척해 다시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와이프랑 한마디 상의 없이 혼자 결정했는데 나중에 잘했다며 좋아하더라. 올해 말에 재계약할 감독이 많은데 좀 미안하다.” 류 감독의 선행은 수십억 원을 받은 자유계약선수(FA)의 동참까지 유도했다. 기부 바이러스였다. “늘 받기만 한 것 같다. 학생 때 특기생이라 공납금, 회비를 안 냈다. 장학금도 받았다. 뭔가 보답하고 싶었다. 더불어 사는 거 아닌가. 선수들도 알아야 한다.”
‘류 감독의 몸에는 푸른 피가 흐른다’는 말이 있다. 파랑은 삼성의 상징. 한양대 졸업 후 1987년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뒤 단 하루도 삼성을 떠나본 일이 없다. “선수로 13년, 코치로 11년, 감독으로 3년을 보냈다.” 2016년까지 계약을 연장했으니 강산이 세 번 변할 동안 삼성 유니폼을 입게 됐다. “선수나 지도자로서 기본이 잘된 덕분이다.”
“외부에서 온 코치와 삼성에서 수십 년간 했던 내 스타일이 달라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감독님께 찾아가 각자 훈련 방식을 평가받자고 했다. 내 얘기를 다 듣고 난 뒤 감독님이 ‘삼성 것 좋네. 그걸로 해’라며 정리했다.” 류 감독은 그때 “조직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되 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한다.
누구든 100점은 없다는 그의 지론은 2011년 감독에 부임하고도 달라지지 않았다. “내가 다 맞는 건 아니다. 다르면 서로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눈과 귀가 두 개인 이유가 있다.” 그로부터 듣는 ‘소통의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들렸다.
○ 잠실구장 개장 경기 1호 홈런의 주인공
류 감독은 경북고 졸업반 때인 1982년 잠실구장 개장 기념 경기에서 담장을 넘기며 잠실 1호 홈런 주인공으로 야구 역사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류 감독에게 홈런을 맞은 투수는 기자와 동명이인으로 부산고에 다니던 김종석. 류 감독은 “내가 1호 기록이 좀 많다”며 웃었다. 하지만 그는 화려한 추억보다 자신을 낮추고 눈과 귀를 열었던 경험을 소중히 여겼다. “나야말로 복장(福將·복이 많은 지도자라는 뜻)이다. 선수와 코치로 9명의 감독 밑에 있었다. 박영길, 정동진, 우용득, 김성근, 백인천, 김용희, 서정환, 김응용, 선동열. 그런 훌륭하신 분들을 모셨으니 다 내 복 아닌가. 누구나 장단점은 있다. 졌을 때 행동, 연패 때 선수 관리, 코치와의 관계 설정 등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정동진 감독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다. 어느 날 너무 힘들어 스승을 찾아갔더니 힘들 때마다 꺼내 보라고 봉투 3개를 줬는데 나중에 열어 보니 3통 모두 ‘참아라’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배우고 일지에 적어 나갔다.”
○ 이승엽 논란
지난해 삼성 간판타자 이승엽(38)의 기용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구단에서도 왜 3, 4번에 넣느냐는 말이 나왔다. 본인도 시즌 도중 타순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내가 다 반대했다. 욕은 감독이 먹을 테니 이겨 내라고 했다. 한국시리즈 때 합의해서 6번으로 내렸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이승엽도 세월은 비켜갈 수 없었다. 방망이는 무뎌져만 갔다. 그런 이승엽을 고집했던 이유를 묻자 류 감독은 이렇게 되물었다. “국민타자 아닌가. 승엽이가 게으름을 피운다면 벌써 2군에 보냈을 거다. 슬럼프를 극복하려고 그리 열심히 하는데 어찌 외면하느냐.” 팀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고참 선수들에 대한 배려는 삼성의 결속력을 끌어올렸다. 그럼 올해는. “올 시즌은 아마 승엽이의 마지막 무대가 될지 모른다. 6번 말뚝으로 기용하려 한다.”
감독 부임 후 3년 내리 헹가래를 받았어도 “아직은 초보”라고 말하는 류 감독은 “투수 교체나 대타를 잘 써 이길 수 있지만 코치와 선수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 늘 그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야구를 기다림의 야구라고 밝힌 그는 좀처럼 화도 내지 않는다.
안팎으로 무거운 과제를 떠안은 류 감독은 13일 삼성 야구단 시무식을 치른다. 그는 ‘류중일 2기 야구’의 닻을 올리면서 초심을 강조한다. “우승 세 번 한 거 다 잊어야 한다. 선수들이 ‘한 번쯤 안 해도 되겠지’라고 느슨해진다면 큰 오산이다. 계속 하고 싶다. 꿈은 커야 하고 꿈은 이뤄진다.” 이쯤 되면 류 감독은 다른 감독의 공적(公敵)이라도 될 것 같다.
김종석 기자 kjs0123@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셀프건강진단]얼마 전부터 구강 안쪽이나 목에 혹이 만져진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24673135.1.thumb.jpg)
-

고속도로 달리던 택시서 기사 뺨 때린 카이스트 교수 기소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싱크탱크 ‘여연’까지 내분… 원장 퇴진 요구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