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은 어떻게 인도네시아의 마음을 얻었을까

2007년 11월 최병남 보령화력발전소 본부장은 한국중부발전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소 운영회사의 법인장을 맡아 달라는 제의였다. 정년을 1년가량 앞두고 있던 때였다.
최 전 법인장(63)은 회사의 제안을 반겼다. 40년 가까이 발전소 업무를 하며 쌓은 노하우를 그대로 버리기 아까워서였다.
인도네시아 치레본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 외국 회사들을 대상으로 발주한 최초의 대규모 민자(民資) 발전소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중부발전에 각별했다. 총사업비만 8억5000만 달러(약 9265억 원) 규모인 데다 입찰에 성공해 발전소 운영권을 얻으면 인도네시아 전력청에 30년간 전기를 팔아 1조 원 이상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부발전은 일본 종합상사인 마루베니, 국내 석탄 채굴업체 삼탄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2006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더 큰 어려움은 그때부터 생겼다. 한국의 평화로운 어촌 정도라고 봤던 발전소 터 주변 마을의 여건은 생각보다 나빴다. 가축 분뇨 때문에 곳곳에 악취가 가득했다. 주민들은 상수도 시설 없이 우물 하나로 식수와 세탁을 동시에 해결했다.
얼마 전 정식 직원이 된 박미정 대리(32)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외국어대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하고 현지 어학연수를 했던 그는 회사가 인도네시아 진출을 준비할 때부터 인턴으로 일했다. 인도네시아를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때부터 인도네시아에 관한 정보를 모았다. 현지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 책이나 인터넷에서 얻을 수 없는 집값, 상권, 교육, 문화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 3개월이 지나자 A4 용지 300쪽 분량이 모였다. 직원과 가족들의 현지 정착을 위한 훌륭한 가이드북을 만든 것이다.
그 무렵 현지에 먼저 나간 양영걸 팀장(41)을 비롯한 중부발전 직원들은 발전소 터가 아니라 새 우물을 팠다. 오염된 지하수 대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심정(深井)이었다. 생활의 터전을 잃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거부감을 가졌던 현지 주민들은 “한국 사람들이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세웠다.
2009년경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자 현지인 직원들이 발목을 잡았다. 서로 반목하고 경계하는 데 익숙한 수십 개 부족 출신의 직원들은 한쪽에 잘 대해 준다고 서로 불만을 제기했다. 최 전 법인장은 TV를 보던 직원들의 모습에서 해결 방안을 찾았다. 배드민턴 경기를 볼 때만큼은 언제 다퉜느냐 싶을 정도로 너 나 할 것 없이 즐기는 데서 착안했다. 최 전 법인장은 곧바로 일주일에 한두 차례, 일과가 끝난 뒤 배드민턴 경기를 열었다. 부족들을 섞어 팀을 만들고, 우승팀에 줄 상품도 내걸었다.
현지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점차 개선해 나갔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계약 서류에 적힌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일은 하지 않았다. 이대로는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칠 수 없었다. 난감해하던 양 팀장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평소 한국의 발전을 부러워하던 직원들의 모습에 착안해 “한국이 빠르게 성장한 이유는 협력”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직원들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양 팀장의 지시를 잘 따랐고, 부진했던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이들이 노력한 끝에 발전소는 지난해 7월 공식 운전에 들어갔다. 최 전 법인장도 지난해 말로 임기를 마쳤다.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소 현장에서 퇴임식을 하던 날 현지 직원들은 “사진 한 장 남기고 싶다”며 카메라 앞에서 그의 팔짱을 끼었다. 허허벌판 염전이던 시골 마을을 잘살 수 있게 변화시킨 데 대한 감사의 의미였다.
이제는 은퇴한 최 전 법인장은 “우리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면서 서서히 우리의 생각을 녹여낸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본다”며 치열했던 직장생활의 끝 무렵을 회고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스토리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유재영의 전국깐부자랑
구독
-

딥다이브
구독
-

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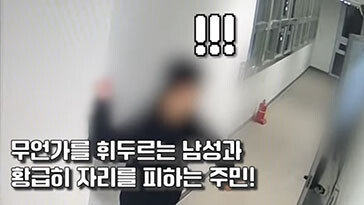
흉기로 이웃 위협한 男…‘나무젓가락’이라 발뺌하다 덜미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학교 가면 끊기는 아동수당… “18세까지 분산 지원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연봉 251만 달러, CEO 삼고초려는 기본”… 전세계 AI 인재 확보 비상 [글로벌 포커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24678337.1.thumb.jpg)
![[스토리 &]120만 송이의 튤립꽃을 피우기 위해](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3/03/14/53713107.1.jpg)
![[스토리 &]우물에서 길어올린 발전소](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3/03/11/53625463.1.jpg)
![[스토리 &]“보셨나요? 高2에 증권사 취업!”](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3/03/07/53539462.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