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잔을 보는 방식은 미술사를 거치면서 달라졌다. 시대마다 작품을 보는 눈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 변화는 당시의 미적 욕망을 반영한다. 모더니즘 시기에는 세상을 원추, 구, 그리고 원기둥으로 보는 그의 구조적 시각이 부각되었다. 초기 모더니즘의 입체주의는 세잔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는 세잔의 색채, 그리고 자연과의 연관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성과 언어를 넘어서는 색채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그가 살았던 삶의 공간이 재조명되었다. 세잔은 진정한 지역 작가였기에 세계적인 대가가 될 수 있었다. 그를 통해 현대미술의 화두인 지역성과 세계화의 연결을 본다.
세잔은 오렌지색을 즐겨 썼다. 그의 고향인 엑상프로방스에 가보면 그 오렌지의 근원을 알게 된다. 바로 그곳의 토양색이다. 또 그 흙으로 만든 지붕의 색깔이다. 화가에게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간이, 생활세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한다. 세잔은 무엇보다 프로방스의 ‘지역작가’인 것이다.
세잔의 작업은 위대한 예술이 자연과 얼마나 근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일깨운다. 프로방스의 풍경은 그에게 미적 영감을 안겨 주었다. 특히 생트빅투아르 산은 이 작가의 ‘모티프’였다. 산기슭 작업실에서 보는 것도 모자라 매일 그 산에 올랐다. 독창성의 근원인 자연 속에서 그의 붓 터치는 화면과 대상 사이의 거리와 공기를 담아 냈다.
공기를 그린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나뭇가지를 흔들며 지나가는 산들바람을, 그 잡을 수 없는 자연의 숨결을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세잔을 제대로 보려면 그림 속 동요하는 이미지와 떨리는 공기를 느껴야 한다. 세잔 풍경의 거대한 바위는 견고한 입체이면서도 흔들림을 지닌다. ‘세잔의 역설’이다.
세잔은 비사교적이고 종잡기 힘든 성격의 소유자였다. 열정에 휩싸였다가 금세 의기소침해지곤 했다. 작업 방식도 독특했다. 세잔은 누드를 그릴 때 실제 모델을 쓰지 않았다. 여성의 벗은 신체를 직접 본다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세잔의 수욕도(水浴圖)는 사실 상상의 결과다. 초상화를 그리는 방식은 더욱 괴벽스럽다. 꾸미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사과처럼 앉아 있으라”는 엄명을 내리니, 세잔의 모델이 된다는 건 고문 그 자체였다. 115번이나 포즈를 취했는데 결국 미완성으로 끝난 경우도 있었다. 말기로 갈수록 아내의 초상화와 자화상이 많은 것도 이유가 있다. 그의 ‘사과’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던 것이다.
새삼스레 후기인상주의 미술가 세잔의 미술사적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세잔은 고전주의와 인상주의를 연결하려 했다. 대상의 견고한 구조를 눈으로 지각하는 빛과 색채로 표현하였다. ‘자살하는 짓’이라는 비웃음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해냈다. 세잔은 1900년대 초부터 피카소, 마티스, 몬드리안 등 후배 작가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에도 그는 여전히 가장 많이 연구되는 작가다. 세잔의 작품이 담고 있는 깊은 내용은 미술사가뿐 아니라 메를로퐁티나 들뢰즈 등 철학자들을 매료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단풍이 물든 가을이다. 세잔이 그렸던 자연의 생동감과 유동성을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 산에 직접 가 보는 건 어떨까.
전영백 홍익대 미대 교수
문화 칼럼
구독-

어린이 책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그 마을엔 청년이 산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尹직무 부정평가 70% 취임후 ‘최고’… 긍정 21% ‘최저’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바이든 “이스라엘 ‘3단계’ 새 제안 내놔…전쟁 끝낼 시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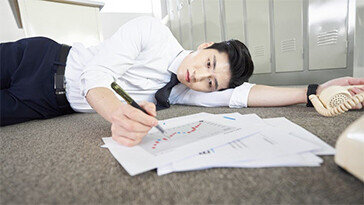
![[문화칼럼/정은미]현대미술이 어렵다고요?](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06/11/25/6990460.1.jpg)
![[문화칼럼/전영백]가을산에서 느끼는 세잔](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06/11/04/6987839.1.jpg)
![[문화칼럼/송현옥]아일랜드의 戀風](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06/10/25/6986764.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