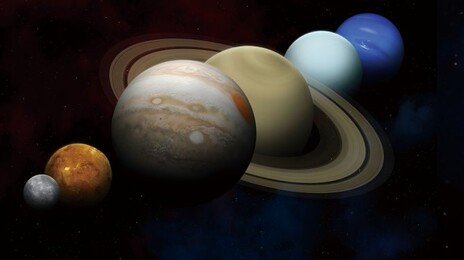공유하기
[美 테러 대참사]맨해튼 무역센터 주변 현지 르포
-
입력 2001년 9월 13일 18시 39분
글자크기 설정

미국 사상 최악의 참사가 덮친 뉴욕 맨해튼에서 만난 젊은 부인은 실종자 가족들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테러를 당한 후 하루 반이 지난 12일 저녁(현지시간) 무렵 뉴욕대 메디컬센터 앞.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내와 남편,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진을 든 사람들이 병원을 돌고 있었다. 캐럴 메티르는 “빌딩 104층에서 일하는 남편이 11일 아침 ‘비행기 폭발을 봤다’고 전화를 했는데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인근의 세인트빈센트병원 앞에는 실종자 사진 500여점이 놓여 있었다.
병원은 늘 북적였다. 세 시간에서 다섯 시간까지 묵묵히 기다렸다가 헌혈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멀리서 찾아온 자원봉사 의사와 간호사, 의대생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 ▼관련기사▼ |
14번가 아래쪽으로는 응급차량과 구조대원 기자 등 통행증을 지닌 사람과 거주자 외엔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다. 14번가 위쪽이 여전히 인간의 도시라면 아래쪽은 사진작가 안드레 콕스의 표현대로 유령의 도시였다. 문화 예술의 거리 소호는 완전히 사라졌다. 갈색 사암(砂巖)과 싱싱한 나무가 우거져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무대로 종종 등장하던 그리니치 빌리지는 시체처럼 서 있는 자동차들로 막혀 있었다. 호떡집처럼 바쁘게 돌아가던 차이나타운에선 일부가 계속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상인들의 힘차고 시끄러운 목소리는 사라졌다.
세계무역센터쪽으로 발길을 옮기니 연기와 재 때문에 숨쉬기도 만만치 않다. 폼페이 최후의 날이 이랬을까. 자본주의를 상징했던 빌딩의 잔해는 참혹했다. 길바닥은 빌딩 파편들로 뒤덮여 걷기에도 힘이 들었다. 110층 타워를 지탱하던 강철은 롤러코스터의 레일처럼 휘어져있다. 허옇게 시멘트 먼지를 뒤집어쓴 자동차들이 납작하게 짓눌려져 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씌어있음직한 서류뭉치들이 주위에 파편같이 흩어져 뒹굴고 있다.
무역센터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는 교포 신정식씨(46)는 “11일 경찰이 빨리 탈출하라고 해서 현금을 금고 속에 두고 가게문도 닫지 못하고 나왔는데…”라면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응시한 채 담배만 피워댔다.
가까운 곳에 불이 타고 있는 듯 열기가 느껴졌다. 연기 속에서 구조대원들은 마스크도 벗어던진 채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해 열심이었다. 소방대원 프랭크 카리노(36)는 어깨에 걸친 수건으로 얼굴을 훔쳤다. 눈엔 핏발이 서있는 그는 빠르게 말했다.
“빌딩이 무너지기 직전에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다. 사다리가 닿지 않아 구하지 못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야 한다.”
브로드웨이 극장들은 이날도 문이 닫혀 있었다. 루디 줄리아니 뉴욕시장이 “테러 공격에 나가떨어지지 말고 이젠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요청했지만 아직 가게나 학교 역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문 닫힌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앞의 기념품 가게에서 관광객들이 ‘뉴욕을 사랑해요(I Love NY)’라고 쓰인 티셔츠를 사며 웃는 모습은 그런 대로 뉴욕이 정상화돼 가는 느낌을 주었지만.
세계무역센터 빌딩에서 다소 떨어진 거리는 테러 24시간 만인 이날 오전부터 안정을 회복했다. 퀸스 롱아일랜드 뉴헤이번 등에서 출발한 열차가 닿는 맨해튼 34번가의 펜스테이션엔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또각또각 울려퍼지고 있었다. 맨해튼으로 통하는 다리들 위로 출근길 자동차들이 여유롭게 달리고 있다. 뉴요커들은 거의 일상으로 돌아간 듯했다.
32번가에서 ‘뉴욕곰탕’을 열고 있는 교포 배모씨(42)는 “손님이 20%쯤 줄어든 정도”라며 “이렇게 빨리 평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미국의 저력이 느껴질 정도”라고 했다.
이방인의 눈에 의외의 모습으로, 또 감동적인 모습으로 비친 것은 미국인들이 사상자 개개인과 그 가족의 비극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점. 미국 언론은 유명인 몇몇을 제외하고는 사상자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유족들이 울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중계하지 않았다.
대신 뉴욕시민들은 구조대원들의 용감한 모습에, 생존자들을 찾으며 희망을 잃지 않는 표정에, 자원봉사자들의 뜨거운 인간애에 주목했다. “이번 대참사가 뉴욕이란 거대도시에 가족애를 선물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뉴욕의 롱아일랜드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기자의 딸은 ‘재난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방법’이라는 지침서를 받아왔다. 그 책엔 생소하지만 딱 맞는 말들이 써있었다.
“아이에게 ‘울지 마라, 괜찮아질 거야’라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상황을 직시하고 희생자를 돕는 일에 동참하라. 평화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라.”yuri@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보일러 풀가동해도 춥다?…난방비 폭탄 범인은 ‘이것’ [알쓸톡]](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029050.4.thumb.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