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개똥불로 별을 대적한다고? [손진호의 지금 우리말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8일 09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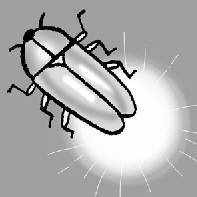
별이 쏟아질 듯한 여름날 밤, 까막까막 날던 녀석 중 하나를 잡아 사정없이 꼬리를 뗀다. 그러고는 얼굴에 쓱 문지르면, 영락없이 불 달린 도깨비가 된다. 눈치챘겠지만 그 불은 개똥불, 표준어로는 ‘반딧불’이다.
한때 반딧불과 반딧불이를 두고 ‘반딧불이’는 곤충 이름이고, 그 곤충의 꽁무니에서 나오는 빛이 ‘반딧불’이라는 주장이 세를 얻기도 했다. 지금은 어떨까.
반디, 반딧불, 반딧불이, 개똥벌레 모두 같은 말이다. 이 중 반딧불만 ‘반딧불이의 꽁무니에서 나오는 빛’과 ‘반딧불이’의 뜻으로 함께 쓸 수 있다. 즉 반디와 반딧불이, 개똥벌레는 ‘반딧불이의 꽁무니에서 나오는 빛’으로 쓰지 못한다는 말이다.
하룻강아지의 어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체로 ‘하릅강아지’가 변한 것으로 본다.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지만 ‘하릅’은 한 살 된 소, 말, 개 등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니 하릅강아지는 ‘한 살짜리 강아지’다. 한 살짜리 강아지가 범에게 덤빈다고? 결과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허나 반딧불이 하면, 뭐니 뭐니 해도 ‘형설지공(螢雪之功)’이란 말이 떠오른다. 중국 진나라 차윤(車胤)이 반딧불을 모아 그 불빛으로 글을 읽고, 손강(孫康)이 겨울밤에 눈빛에 비추어 글을 읽었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반딧불이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밤하늘을 나는 것들은 모두 수컷이다. 암컷은 하나같이 날개가 퇴화해 날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 암컷이 풀숲에서 사랑의 신호를 보내면 사방팔방 떼 지어 나부대던 수컷들이 살며시 다가간다나 어쩐다나.
songbak@donga.com
손진호의 지금 우리말글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콜린 마샬 한국 블로그
구독
-

사설
구독
-

함께 미래 라운지
구독
트렌드뉴스
-
1
‘이란의 영변’에 농축우라늄 60% 저장…美, 델타포스 투입하나
-
2
삼성전자 16조 자사주 상반기 소각…SK㈜도 5.1조
-
3
트럼프 손녀 “파산하겠네” 전쟁중 초고가 쇼핑…미국인들 뿔났다
-
4
美국방 “오늘 이란 공습 가장 격렬할 것…전투기·폭격기 최대 투입”
-
5
‘음주운전’ 이재룡 “잘못된 행동 죄송…사고 인지 못해”
-
6
박진영, JYP 사내이사 사임…“K팝 대외업무 집중”
-
7
[사설]한 해 신규 박사 2만 명… ‘고학력 실업’ 양산 시대의 그늘
-
8
대북송금 검사 “檢지휘부 믿다 나는 죽고 사건은 취소될 판”
-
9
“20억 줄테니 팔라”…中도 탐낸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
10
‘콜록콜록’ 푸틴 기침 영상, 공개 4분만에 삭제…건강이상설 재점화
-
1
장동혁 “의원들 의견 잘 들었다”…‘절윤’ 입장 이틀째 침묵
-
2
李 “주한미군 무기 반출, 반대의견 내지만 관철 어려워”
-
3
한동훈 “尹 복귀 반대 결의?…어차피 감옥 있는데 그게 절연인가”
-
4
성토 쏟아져도 침묵한 張, 절윤 결의문엔 대변인 짧은 입장만
-
5
대북송금 검사 “檢지휘부 믿다 나는 죽고 사건은 취소될 판”
-
6
‘찐명’ 한준호, 김어준 직격 “지라시도 안되는 음모론으로 李정부 공격”
-
7
李 “개혁하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돼” 檢개혁 정부 주도 못박아
-
8
1인당 국민총소득 12년째 제자리…日·대만에 추월당했다
-
9
전한길 “내 덕에 대표 된 장동혁, 윤어게인이냐 절윤이냐 밝혀라”
-
10
“20억 줄테니 팔라”…中도 탐낸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트렌드뉴스
-
1
‘이란의 영변’에 농축우라늄 60% 저장…美, 델타포스 투입하나
-
2
삼성전자 16조 자사주 상반기 소각…SK㈜도 5.1조
-
3
트럼프 손녀 “파산하겠네” 전쟁중 초고가 쇼핑…미국인들 뿔났다
-
4
美국방 “오늘 이란 공습 가장 격렬할 것…전투기·폭격기 최대 투입”
-
5
‘음주운전’ 이재룡 “잘못된 행동 죄송…사고 인지 못해”
-
6
박진영, JYP 사내이사 사임…“K팝 대외업무 집중”
-
7
[사설]한 해 신규 박사 2만 명… ‘고학력 실업’ 양산 시대의 그늘
-
8
대북송금 검사 “檢지휘부 믿다 나는 죽고 사건은 취소될 판”
-
9
“20억 줄테니 팔라”…中도 탐낸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
10
‘콜록콜록’ 푸틴 기침 영상, 공개 4분만에 삭제…건강이상설 재점화
-
1
장동혁 “의원들 의견 잘 들었다”…‘절윤’ 입장 이틀째 침묵
-
2
李 “주한미군 무기 반출, 반대의견 내지만 관철 어려워”
-
3
한동훈 “尹 복귀 반대 결의?…어차피 감옥 있는데 그게 절연인가”
-
4
성토 쏟아져도 침묵한 張, 절윤 결의문엔 대변인 짧은 입장만
-
5
대북송금 검사 “檢지휘부 믿다 나는 죽고 사건은 취소될 판”
-
6
‘찐명’ 한준호, 김어준 직격 “지라시도 안되는 음모론으로 李정부 공격”
-
7
李 “개혁하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돼” 檢개혁 정부 주도 못박아
-
8
1인당 국민총소득 12년째 제자리…日·대만에 추월당했다
-
9
전한길 “내 덕에 대표 된 장동혁, 윤어게인이냐 절윤이냐 밝혀라”
-
10
“20억 줄테니 팔라”…中도 탐낸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군대서 만들어진 말 ‘짬밥’…유래는[손진호의 지금 우리말글]](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0/11/15/103963254.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