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향기]“조선시대 광화문 앞길은 왕과 서민 잇는 통로”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의 다섯 궁궐과 그 앞길/김동욱 지음/364쪽·1만8000원·집


이 책은 조선시대 궁궐 정문 앞 대로의 연원을 다양한 문헌을 통해 추적하고 건축사 관점에서 재해석했다. 통상 건축사 책은 궁궐 전각이나 고택(古宅)처럼 건물 자체에 주안점을 두기 마련인데, 이 책은 특이하게도 궁궐 문을 둘러싼 거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화재위원을 지낸 건축사 분야 권위자가 쓴 책답게 역사와 건축을 함께 아우르는 혜안이 돋보인다.
고대부터 도성 내 도로는 왕성과 관청, 주거지 등을 일정한 체계에 따라 구획하는 핵심 시설이었다. 최근 경주 왕경 복원을 위한 발굴 조사에서 황룡사지 주변 도로망이 신라시대 방리(方里)제를 반영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저자는 “궁궐 앞길은 궁궐과 도시를 연결하는 숨통 같은 존재다. 담장 바깥 세계까지 살펴봐야 궁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썼다.
경복궁을 지을 때 고려시대나 중국처럼 폐쇄적인 황성(皇城) 구조를 따르지 않고 종묘와 사직단, 육조를 일반 주거지와 분리하지 않은 사실도 주목된다. 중국은 종묘와 사직단을 황성 안에 설치해 황제가 제의를 지내러 이동하는 모습이 백성들에게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또 최고 관부도 서민들과 분리돼 황성 안에 따로 뒀다.
그러나 조선은 종묘와 사직단이 민간 주거지 안에 있어 국왕의 행차를 누구나 지켜볼 수 있었다. 육조도 저잣거리와 연결돼 고관대작의 움직임이 모두 드러났다. 최고 지배자의 동선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역사의 부침에 따라 광화문과 육조대로에 영광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이 일어나 위기에 봉착한 1894년 육조 명칭이 바뀐 데 이어 일제강점기 들어 육조 대신 식민 통치기관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현재는 ‘세종대로’로 불리는 광화문 앞 큰길의 운명은 한반도의 그것과 함께했던 셈이다.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3
“어깨 아프면 약-주사 찾기보다 스트레칭부터”[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
4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5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6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7
주식 혐오했던 김은유 변호사, 53세에미국 주식에서 2100% 수익률 달성한 사연
-
8
‘나홀로집에 케빈 엄마’ 캐서린 오하라 별세…향년 71세
-
9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10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3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4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5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6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7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8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9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10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3
“어깨 아프면 약-주사 찾기보다 스트레칭부터”[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
4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5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6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7
주식 혐오했던 김은유 변호사, 53세에미국 주식에서 2100% 수익률 달성한 사연
-
8
‘나홀로집에 케빈 엄마’ 캐서린 오하라 별세…향년 71세
-
9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10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3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4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5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6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7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8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9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10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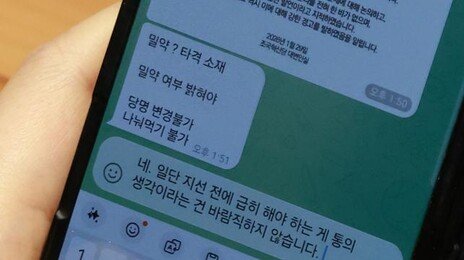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