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조경란의 사물 이야기]탁상시계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사발시계라고 아시는지. 둥근 사발 모양의 탁상시계. 새해 첫날을 작업실 청소를 하면서 보냈다. 책장 먼지를 털고 마른 걸레로 책등도 문지르고, 그러다가 눈에 띄는 책들을 꺼내 몇 장씩 읽느라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말았지만. ‘방망이 깎던 노인’으로 잘 알려진 윤오영 선생 수필 ‘사발시계’도 오랜만에 읽었다. ‘철화로, 사발시계, 이것이 내가 갓 세간 나서 내 손으로 처음 장만한 세간이었다. 장롱 위의 똑딱똑딱 시계 소리를 들어가며 우리 젊은 내외는 철화로 가에서 밥을 먹었다. 새벽녘이면 따르릉 시계 소리에 아내는 부엌으로 나갔고 나는 비를 들고 마당으로 내려갔다’라고 시작하는.
나는 아직 세간을 나 본 적은 없지만 이 작은 작업실을 얻게 되었을 때 꼭 그런 기분이 들었다. 처음 장만한 세간들은 책상과 의자. 그러곤 벽에 못을 치고 가느다란 괘종이 달린 시계 하나를 걸었다. 그래도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아 테이블 위에 장만해 놓은 게 알람 기능이 있는 은색 탁상시계.
깨끗해진 책상 앞에 앉았다. 새 탁상달력을 놓고 나니 비로소 2017년이라는 게 실감 났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일까 하는 진부한 말은 하지 않고 싶은데 그러기가 참 어렵다. 그 대신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과학자이자 작가인 앨런 라이트맨이 과학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시간의 유형에 관해 쓴 짧은 소설들 중 한 편이다. 그 책 ‘아인슈타인의 꿈’은 독자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다. 시간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시계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 이야기로 새버렸다. 가차 없이 또 한 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인가 보다. 그동안 어떤 시간을 살았나. 게으른 천성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매우 느리게라도 ‘오늘’에 성실하고 싶다. 작업실을 얻고 알맞은 자리에 시계들을 가져다 놓을 때의 첫 마음으로. 지금도 똑딱똑딱, 저 시간의 둥근 본질은 내일로 흐르는 데 있을 것이다. 아무려나 내가 알기로 분과 초가 생긴 것은 시계가 발명되고 난 후라고 한다.
조경란 소설가
트렌드뉴스
-
1
[단독]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 서울 아파트로 제한 검토
-
2
“스페이스X 기대감에 200% 급등”…블룸버그, 한국 증권주 ‘우회 투자’ 부각
-
3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4
김길리 金-최민정 銀…쇼트트랙 여자 1500m 동반 메달 쾌거
-
5
분노한 트럼프, 전세계에 10% 관세 카드 꺼냈다…“즉시 발효”
-
6
길에서 주운 남의 카드로 65만원 결제한 60대 벌금 500만원
-
7
스벅 통입점 건물도 내놨다…하정우, 종로-송파 2채 265억에 판다
-
8
“호랑이 뼈로 사골 끓여 팔려했다”…베트남서 사체 2구 1억에 사들여
-
9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
10
美대법 “의회 넘어선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통상전략 뿌리째 흔들려
-
1
“尹 무죄추정 해야”…장동혁, ‘절윤’ 대신 ‘비호’ 나섰다
-
2
한동훈 “장동혁은 ‘尹 숙주’…못 끊어내면 보수 죽는다”
-
3
尹 “계엄은 구국 결단…국민에 좌절·고난 겪게해 깊이 사과”
-
4
유시민 “李공소취소 모임, 미친 짓”에 친명계 “선 넘지마라”
-
5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6
尹 ‘입틀막’ 카이스트서…李, 졸업생과 하이파이브-셀카
-
7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8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9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10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트렌드뉴스
-
1
[단독]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 서울 아파트로 제한 검토
-
2
“스페이스X 기대감에 200% 급등”…블룸버그, 한국 증권주 ‘우회 투자’ 부각
-
3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4
김길리 金-최민정 銀…쇼트트랙 여자 1500m 동반 메달 쾌거
-
5
분노한 트럼프, 전세계에 10% 관세 카드 꺼냈다…“즉시 발효”
-
6
길에서 주운 남의 카드로 65만원 결제한 60대 벌금 500만원
-
7
스벅 통입점 건물도 내놨다…하정우, 종로-송파 2채 265억에 판다
-
8
“호랑이 뼈로 사골 끓여 팔려했다”…베트남서 사체 2구 1억에 사들여
-
9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
10
美대법 “의회 넘어선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통상전략 뿌리째 흔들려
-
1
“尹 무죄추정 해야”…장동혁, ‘절윤’ 대신 ‘비호’ 나섰다
-
2
한동훈 “장동혁은 ‘尹 숙주’…못 끊어내면 보수 죽는다”
-
3
尹 “계엄은 구국 결단…국민에 좌절·고난 겪게해 깊이 사과”
-
4
유시민 “李공소취소 모임, 미친 짓”에 친명계 “선 넘지마라”
-
5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6
尹 ‘입틀막’ 카이스트서…李, 졸업생과 하이파이브-셀카
-
7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8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9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10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조경란의 사물 이야기]에어캡](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7/01/11/8231439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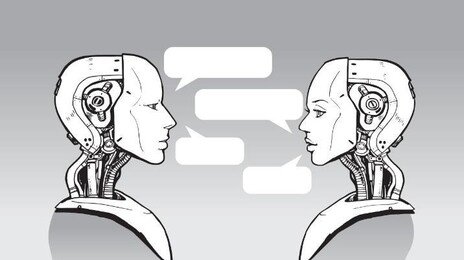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