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주요 유적 모두 내손으로…” 최반장의 생애 마지막 발굴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7일 15시 3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수 백, 아니 천년 이상의 신비를 간직한 유물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하다. 학자가
아닌 현장 발굴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들의 땀이 없다면 발굴 자체가 불가능하다. 고분과 수중에서 발굴 현장을 지켜온 이들의
얘기를 담았다.
○육상 발굴 현역 최고참 ‘최 반장’
12일 경북 경주시 월성 발굴현장. 칠순을 넘긴 백발의 노인이 꽃삽으로 조심스레 땅을 팠다. 불과 5분 정도 지났을까. 돌 사이에서 잿빛 덩어리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 노인은 한번 스윽 훑어보고는 한 마디를 툭 던졌다. “삼국시대 것은 아니고 통일신라 기와구먼.”
작업반장은 현장 인부들을 통솔해 유구(遺構·옛 건축의 구조를 알 수 있는 흔적)가 묻힌 흙을 걷어내고 유물을 출토하는 임무를 맡는다. 유구와 유물을 훼손하지 않고 발굴하는 작업은 아무나 할 수 없다.
그의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은 건 경부고속도로를 내면서 정부가 실시한 1967년 경주 방내리 고분군 발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50년 발굴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경험으로 그는 주저 없이 1975년 안압지 발굴을 꼽았다. 당시 연못 밑 진흙층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통나무배를 그가 직접 파냈다. 그의 역할은 유물 출토에서 그치지 않고 통나무배의 보존처리 작업까지 이어졌다. “그때만 해도 보존과학을 전공한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서울에서 경주까지 출장을 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 내가 약품처리 방법을 전문가한테 직접 배웠습니다. 한 5년 동안 경주박물관 지하창고에 수시로 들어가서 통나무배가 잠긴 수조에 페놀 같은 화학약품을 섞어주고 그랬어요.”
ekdt 안압지에서는 통나무배를 비롯해 목간(木簡), 14면체 주사위 주령구(酒令具), 목제 남근(木製 男根) 등 신라 유물들이 쏟아졌다. 그는 “다양한 유물이 많이 나와서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다”며 “10년을 해도 될 발굴인데 당시 여건상 1년 반 만에 끝내서 지금도 아쉽다”고 했다.
○수중 발굴 산 역사 ‘박 팀장’
지난달 29일 충남 태안군 마도(馬島) 앞 바다. 보트를 타고 10분쯤 이동하자 노란색 부표가 파도에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다. ‘마도 5호선’으로 추정되는 고선박 발굴현장이다. 마도 5호선은 올 3월 3차원(3D) 지층탐사 때 우연히 발견됐는데, 선체를 뒤덮고 있는 진흙을 잠수부들이 삽으로 파내고 있었다. 이들은 산소를 공급해주는 노란색 케이블을 연결한 채 약 50분 동안 작업을 이어갔다. 수중 발굴은 수압과 조류 때문에 체력 소모가 엄청나다. 이곳은 수심이 얕지만 지층이 워낙 단단해 잠수부들이 작업에 애를 먹고 있었다.
잠수부들 사이로 일일이 작업지시를 하고 있는 박용기 잠수팀장(55)을 배 위에서 만났다. 해병대 출신으로 32년의 잠수경력을 갖고 있는 박 팀장은 본격적인 첫 수중 발굴인 2002년 군산 비안도 발굴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수중 발굴의 ‘산 역사’인 셈이다.
비안도 발굴 당시만 해도 수중 발굴 전용선박이 없어 어선(통통배)을 타고 현장에 접근했다.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면 조그마한 배가 크게 흔들려 위험했다. 박 팀장은 “납으로 된 12㎏짜리 벨트를 허리에 매다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다”며 “지금은 발굴여건이 좋아져 과거보다 안전해졌다”고 했다.
경주·태안=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트렌드뉴스
-
1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2
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 51곳에 6만채 공급
-
3
“담배 끊으면 60만 원”… 보건소 맞춤형 금연 코칭
-
4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5
배우 얼굴 가린다고…아기 폭우 맞히며 촬영, ‘학대’ 논란
-
6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는 ‘이 방향’이 맞는 이유
-
7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8
연봉 100배 스카우트 거절…EBS 1타 강사, 교실에 남은 이유
-
9
“中여성 2명 머문뒤 객실 쑥대밭”…日호텔 ‘쓰레기 테러’ [e글e글]
-
10
[단독]“구글스토어에 버젓이 ‘피싱 앱’, 2억 날려”… 신종 앱사기 기승
-
1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2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3
[속보]장동혁 국힘 지도부, 한동훈 제명 확정
-
4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5
법원 “김건희, 청탁성 사치품으로 치장 급급” 징역 1년8개월
-
6
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
7
“中여성 2명 머문뒤 객실 쑥대밭”…日호텔 ‘쓰레기 테러’ [e글e글]
-
8
장동혁 “한동훈에 충분한 시간 주어져…징계 절차 따라 진행”
-
9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
10
李 “담배처럼 ‘설탕세’ 거둬 공공의료 투자…어떤가요”
트렌드뉴스
-
1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2
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 51곳에 6만채 공급
-
3
“담배 끊으면 60만 원”… 보건소 맞춤형 금연 코칭
-
4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5
배우 얼굴 가린다고…아기 폭우 맞히며 촬영, ‘학대’ 논란
-
6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는 ‘이 방향’이 맞는 이유
-
7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8
연봉 100배 스카우트 거절…EBS 1타 강사, 교실에 남은 이유
-
9
“中여성 2명 머문뒤 객실 쑥대밭”…日호텔 ‘쓰레기 테러’ [e글e글]
-
10
[단독]“구글스토어에 버젓이 ‘피싱 앱’, 2억 날려”… 신종 앱사기 기승
-
1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2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3
[속보]장동혁 국힘 지도부, 한동훈 제명 확정
-
4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5
법원 “김건희, 청탁성 사치품으로 치장 급급” 징역 1년8개월
-
6
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
7
“中여성 2명 머문뒤 객실 쑥대밭”…日호텔 ‘쓰레기 테러’ [e글e글]
-
8
장동혁 “한동훈에 충분한 시간 주어져…징계 절차 따라 진행”
-
9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
10
李 “담배처럼 ‘설탕세’ 거둬 공공의료 투자…어떤가요”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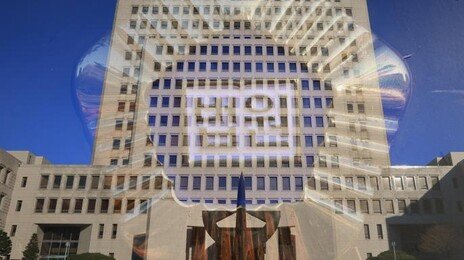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