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책의 향기]죽은 엄마와 화해하려… 부엌으로 간 종군기자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엄마 레시피 따라하며 상실감 회복
◇내가 엄마의 부엌에서 배운 것들/맷 매컬레스터 지음·이수정 옮김/312쪽·1만3500원·문학동네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린다. 단지 삶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울음도 나오질 않는다. 좀 더 찾아뵐 것을, 좀 더 잘 모실 것을. 하물며 속 썩인 일이 잦았다면 죄책감은 몇 곱절로 커진다. 하물며 저자는, 어머니가 죽기를 바란 적도 있었다. 어머니는 정신질환자에 알코올중독자였다.
미국 일간지 뉴스데이에서 종군기자로 활약하며 1997년 퓰리처상도 받았던 저자는 문득 자신이 치러야 할 ‘전쟁’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목숨을 걸고 분쟁지역을 뛰었지만 어쩌면 그건 타인의 싸움이었다. 한때 누구보다 사랑했으나, 또 한때 누구보다 미워했던 엄마.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응어리는 목 끝까지 차 있었다. 그 씻김굿을 위해 저자는 엄마의 요리책을 꺼내 들었다.
“나는 엄마를 되찾아올 한 가지 방도를 찾았다. 당장 내 집 부엌으로 달려가서 엄마의 요리들을 직접 만들어보는 것. 엄마의 돼지갈비, 초콜릿 크리스피, 딸기 아이스크림…. 어쩌면 그 음식들이 내 기억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내가 잊고만 싶어 했던 과거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줄지 모른다.”
물론 쉽지 않았다. 처음엔 엄마의 방식을 무조건 지키려는 강박관념에 요리 자체를 즐기지 못했다. 당시 저자는 아내와 아기를 가지려 간절히 노력 중이었다. 그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음식을 만들며 그는 천천히 변화한다. 사랑하는 이 앞에 식탁을 차려 내는 게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그 옛날, 엄마가 자신에게 그랬듯이.
참 애잔한 책이다. 글 전체를 관통하는 회한이 읽는 내내 가슴을 저민다. 어머니의 정신병은 저자의 인생과 가족 모두를 엉망으로 휘저어 놓았다. 그 감당할 수 없던 현실은 감수성 예민한 10대의 분노를 엄마에게 쏟아 붓게 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안다. 그게 왜 엄마 탓인가. 따지고 보면 가장 힘든 건 엄마였을 텐데. 그런 과거와 화해하는 일은 어떤 전투보다 치열하고 애달팠다.
어느 순간 저자는 깨닫는다. 엄마의 방식을 더이상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요리법은 재료 몇 g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시켜 먹거나 외식도 괜찮다. 진짜 핵심은 우리 앞에 마주 앉은 그들, 그리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다. 저자는 엄마로부터 그 마지막 선물을 건네받았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트렌드뉴스
-
1
“재명이네 마을은 TK에 있나”…정청래 강퇴에 與지지층 분열
-
2
전현무 “고인에 예 다하지 못했다”…칼빵 발언 사과
-
3
美, 이란 정밀 타격후 대규모 공격 검토… 韓대사관 ‘교민 철수령’
-
4
“잠만 자면 입이 바싹바싹”…잠들기 전에 이것 체크해야 [알쓸톡]
-
5
與 “국힘 반대로 충남-대전 통합 무산 위기”… 지방선거 변수 떠올라
-
6
남창희 9세 연하 신부, 무한도전 ‘한강 아이유’였다
-
7
서로 껴안은 두 소년공, 대통령 되어 만났다
-
8
‘1000억대 자산’ 손흥민이 타는 車 뭐길래…조회수 폭발
-
9
“열차 변기에 1200만원 금팔찌 빠트려” 오물통 다 뒤진 中철도
-
10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1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
-
2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3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
4
장동혁 “내 이름 파는 사람, 공천 탈락시켜달라”
-
5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6
與의원 105명 참여 ‘공취모’ 출범…친명 결집 지적에 김병주 이탈도
-
7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8
李 “한국과 브라질, 룰라와 나, 닮은게 참으로 많다”
-
9
조희대 “與,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꿔…국민에 직접 피해”
-
10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트렌드뉴스
-
1
“재명이네 마을은 TK에 있나”…정청래 강퇴에 與지지층 분열
-
2
전현무 “고인에 예 다하지 못했다”…칼빵 발언 사과
-
3
美, 이란 정밀 타격후 대규모 공격 검토… 韓대사관 ‘교민 철수령’
-
4
“잠만 자면 입이 바싹바싹”…잠들기 전에 이것 체크해야 [알쓸톡]
-
5
與 “국힘 반대로 충남-대전 통합 무산 위기”… 지방선거 변수 떠올라
-
6
남창희 9세 연하 신부, 무한도전 ‘한강 아이유’였다
-
7
서로 껴안은 두 소년공, 대통령 되어 만났다
-
8
‘1000억대 자산’ 손흥민이 타는 車 뭐길래…조회수 폭발
-
9
“열차 변기에 1200만원 금팔찌 빠트려” 오물통 다 뒤진 中철도
-
10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1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
-
2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3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
4
장동혁 “내 이름 파는 사람, 공천 탈락시켜달라”
-
5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6
與의원 105명 참여 ‘공취모’ 출범…친명 결집 지적에 김병주 이탈도
-
7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8
李 “한국과 브라질, 룰라와 나, 닮은게 참으로 많다”
-
9
조희대 “與,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꿔…국민에 직접 피해”
-
10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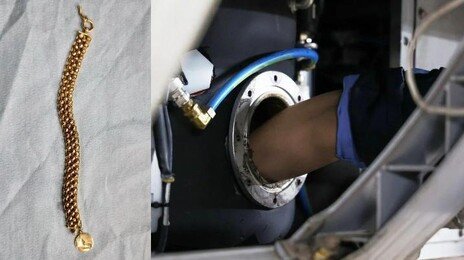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