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되찾은 우리 쪽빛, 내 삶의 꽃망울 보듬었죠” 전통염색 전문가 이병찬 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6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4월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쪽빛은 푸르다.
그래서 이중적이다. 푸르기에 상큼하고, 푸르기에 아련하다. 옛 시절, 새색시는 첫날밤 쪽빛 이불을 다리며 볼을 붉혔다. 구중궁궐 대왕대비는 홀로 된 한숨을 씹으며 쪽빛 치마를 지었다. 남색(藍色)이란 말론 차마 형언할 길 없는 우리네 마음. 쪽빛은 삶의 꽃망울과 뒤안길을 보듬어 아우른다.
이병찬 선생(81)이 쪽빛에 사로잡혔던 세월도 그 탓이리라. 염색연구 30여 년. 그 첫 연정은 지금도 시리도록 은은하게 맴돈다. 쉰이 가깝던 1978년, 일본인 친구가 자랑스레 꺼내든 기모노의 색감은 영 잊혀지질 않는다.
허나 굳센 다짐을 현실은 받쳐주지 않았다. 배우려 해도 가르치는 데가 없었다. 결국 일본으로 건너가 6개월 염색 기초를 익혔다. 귀국 후 곧장 문헌을 밤낮으로 훑고 전문가들을 구슬렸다. 그렇게 찾아낸 게 청대(靑黛), 마디풀과 쪽이었다.

“주위 분들이 도와준 덕이죠. 여인네가 홀로 버텨내니 장해보였나 봐요. 아직도 그 첫 쪽빛이 어른거립니다. 만족스러워서?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구나. 우리 것을 복원할 수 있겠다. 쪽빛도 더 개선하고, 감물 진달래 가래나무 연지꽃…. 산천에 흐드러진 색깔을 되찾자. 가슴 저 편에 새싹이 돋았어요.”
“상 받아 안 관뒀다 그러면 너무 애기 같지요? 근데 고마웠어요. 알아주는 날이 오는구나. 덜컥 맘이 다잡아졌어요. 상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염색한테 괜스레 미안했어요. 니들 덕에 칭찬받았는데. 어찌 그리 매정하려 했을까. 다독이며 결심했어요. 내 인생은 염색이구나. 삶을 매조지할 터는 여기구나.”
선생은 요즘 몸이 편치 않다. “이런 얘긴 남우세스럽다”고 당부했지만, 맹장에 문제가 생겨 복막염으로 번졌다. 여든 하나. 거동도 조심스러운데 곧 수술까지 앞뒀다. 괜히 인터뷰를 요청했나 죄송스러워하자 “응대가 수월찮아 오히려 미안하다”며 다독였다. 짓궂게 평생 독신으로 지낸 연유를 물어도 “친구도 많고 주위에 좋은 분이 넘쳐 낙낙하게 보냈다”며 걸걸하게 웃어넘겼다. 염색에 묻혀 강산 바뀌는 걸 세 차례나 품은 공력. 그래도 혹 아쉬움이 남진 않았을까.
“없어요. 정말 없어요. 한때 마음을 콕콕 찔렀던 가시들도 시간 가니 무뎌졌어요. 다만 지치 색을 좀더 대량 공급할 방도를 구하지 못한 건 영 가슴을 맴도네요. 보라색과는 또 다른, 그 짙은 푸른빛은 지치 뿌리에서만 얻을 수 있거든요. 너무 희귀하고 비싸요. 후학들을 위해서라도 꼭 찾아야 하는데…. 퇴원하면 또 연구해야죠.”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트렌드뉴스
-
1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2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3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4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5
폐암 말기 환자가 40년 더 살았다…‘기적의 섬’ 어디?
-
6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쳤다…韓 1041조원 vs 日 1021조원
-
7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
8
수명 연장에 가장 중요한 운동법 찾았다…핵심은 ‘이것’ [바디플랜]
-
9
[단독]“5000만원씩 두 상자…윤영호 ‘王자 노리개 상자’ 권성동에 건네”
-
10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3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4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5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6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7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8
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쾌유 기원”
-
9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10
[사설]한덕수 구형보다 크게 무거운 23년형… 준엄한 ‘12·3’ 첫 단죄
트렌드뉴스
-
1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2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3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4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5
폐암 말기 환자가 40년 더 살았다…‘기적의 섬’ 어디?
-
6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쳤다…韓 1041조원 vs 日 1021조원
-
7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
8
수명 연장에 가장 중요한 운동법 찾았다…핵심은 ‘이것’ [바디플랜]
-
9
[단독]“5000만원씩 두 상자…윤영호 ‘王자 노리개 상자’ 권성동에 건네”
-
10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3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4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5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6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7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8
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쾌유 기원”
-
9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10
[사설]한덕수 구형보다 크게 무거운 23년형… 준엄한 ‘12·3’ 첫 단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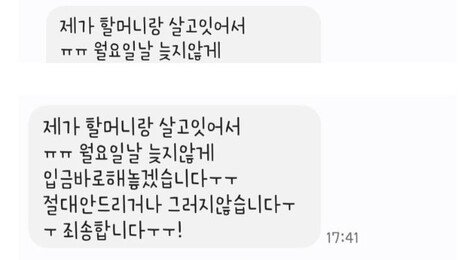
![‘자율주행 실증도시’ 광주 [횡설수설/박중현]](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214231.2.thumb.jpg)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210626.3.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