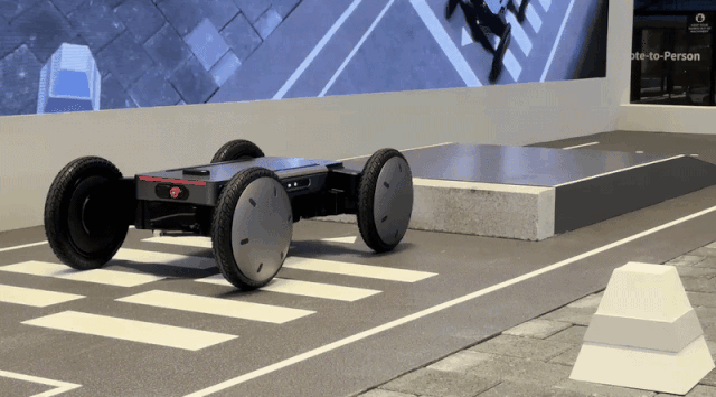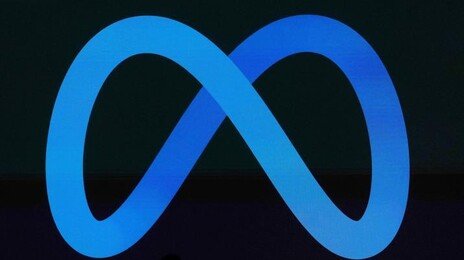공유하기
[문학예술]그 많던 뜸부기는 다 어디로 간 걸까
-
입력 2009년 5월 23일 02시 59분
글자크기 설정

은퇴 후 고향에 돌아와 뜸부기를 찾아 헤매는 ‘나’. 어릴 적에는 흔하디흔했지만 더는 그 새의 울음소리를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게 됐다. 뜸부기에 이토록 연연하는 까닭을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때문도, 시골에 머물기 위한 명목상의 이유도 딱히 아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시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까.(‘생오지 뜸부기’)
소설가 문순태 씨(사진)의 열 번째 소설집 ‘생오지 뜸부기’는 생오지란 골짜기 마을을 배경으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잊혀져 버린 농촌 공동체와 자연의 생명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로 분단 문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던 그는 실제로 2006년 광주대를 정년퇴임한 뒤 고향인 전남 담양군 남면의 ‘생오지’ 마을에 지내면서 작품을 집필했다.
작품집 중 ‘생오지 가는 길’ ‘황금 소나무’ 등은 모두 이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곳에는 아흔을 바라보는 고령에도 고향에 혼자 남아 농사를 짓고 사는 할머니, 농업후계자로 빚만 지고 결국 도시로 떠나는 오영기, 몇백 년 동안 이 마을을 지켜온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마을을 떠나지 않는 오만석, 고엽제 후유증으로 죽어가는 베트남 참전 용사 조 씨, 전국을 떠돌다 고향으로 돌아와 별장지기로 살아가는 늙은 무명 화가 등이 이곳에 머물고 있다. 쓸쓸하고 황량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 베트남 여인 쿠엔, 몽골에서 온 멍질라 등 한국의 농촌에 자리 잡게 된 인물들을 통해 공동체 회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도 한다.
‘탄피와 호미’는 아내와 사별한 주인공, 탈북하며 아이를 잃어버린 점순, 아홉 살 때 성폭행 당한 영미 세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가면서 시골에서 가족처럼 지내는 이야기. 혈연이 아닌,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보여준다. ‘그 여자의 방’은 어릴 적 소꿉동무였던 여자 친구 앵두의 죽음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남자를 다뤘다. 여러 나라를 오가면서도 늘 불안과 허무에 시달렸던 주인공은 자신의 삶이 평생 한곳에 머물며 평범하게 살았던 앵두의 삶보다 행복했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스타일 >
-

전문의 칼럼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인터뷰
구독
트렌드뉴스
-
1
李 “주유소 휘발유 값 폭등…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해”
-
2
“대기업 줄섰다”…충주맨 김선태, 유튜브 구독자 93만 돌파
-
3
아침 공복 따뜻한 물 한 잔, 정말 살 빠지고 해독될까?[건강팩트체크]
-
4
李 “‘다음은 北’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 있어…무슨 득 있나”
-
5
현직 교사, 학교 방송장비 중고사이트에 내다팔다 덜미
-
6
이란에 세운 자치공화국 1년 안돼 멸망당해…쿠르드, 반정부 핵심세력으로
-
7
트럼프, 결국 ‘대리 지상전’…쿠르드 반군 “美요청에 이란 공격”
-
8
“트럼프 막내 배런-김주애 결혼시키자”…세계평화 ‘풍자 밈’ 확산
-
9
[속보]與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단수 공천
-
10
[단독]한미, 주한미군 무기 중동으로 차출 협의
-
1
[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
2
‘증시 패닉’ 어제보다 더했다…코스피 12%, 코스닥 14% 폭락
-
3
李 “주유소 휘발유 값 폭등…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해”
-
4
[단독]한미, 주한미군 무기 중동으로 차출 협의
-
5
트럼프, 결국 ‘대리 지상전’…쿠르드 반군 “美요청에 이란 공격”
-
6
李 “‘다음은 北’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 있어…무슨 득 있나”
-
7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8
與 “조희대 탄핵안 마련”… 정청래는 “사법 저항 우두머리냐”
-
9
李 “필리핀 대통령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인도 요청”
-
10
국힘 또 ‘징계 정치’… 한동훈과 대구行 8명 윤리위 제소
트렌드뉴스
-
1
李 “주유소 휘발유 값 폭등…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해”
-
2
“대기업 줄섰다”…충주맨 김선태, 유튜브 구독자 93만 돌파
-
3
아침 공복 따뜻한 물 한 잔, 정말 살 빠지고 해독될까?[건강팩트체크]
-
4
李 “‘다음은 北’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 있어…무슨 득 있나”
-
5
현직 교사, 학교 방송장비 중고사이트에 내다팔다 덜미
-
6
이란에 세운 자치공화국 1년 안돼 멸망당해…쿠르드, 반정부 핵심세력으로
-
7
트럼프, 결국 ‘대리 지상전’…쿠르드 반군 “美요청에 이란 공격”
-
8
“트럼프 막내 배런-김주애 결혼시키자”…세계평화 ‘풍자 밈’ 확산
-
9
[속보]與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단수 공천
-
10
[단독]한미, 주한미군 무기 중동으로 차출 협의
-
1
[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
2
‘증시 패닉’ 어제보다 더했다…코스피 12%, 코스닥 14% 폭락
-
3
李 “주유소 휘발유 값 폭등…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해”
-
4
[단독]한미, 주한미군 무기 중동으로 차출 협의
-
5
트럼프, 결국 ‘대리 지상전’…쿠르드 반군 “美요청에 이란 공격”
-
6
李 “‘다음은 北’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 있어…무슨 득 있나”
-
7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8
與 “조희대 탄핵안 마련”… 정청래는 “사법 저항 우두머리냐”
-
9
李 “필리핀 대통령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인도 요청”
-
10
국힘 또 ‘징계 정치’… 한동훈과 대구行 8명 윤리위 제소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스타일]'비대칭형' 헤어컷…중성미가 찰랑 찰랑](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2/01/17/684566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