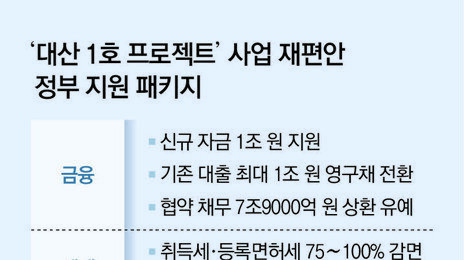공유하기
[문학예술]씹는다… 욕망이 꿈틀댄다… 난 살아있다
-
입력 2009년 2월 14일 02시 58분
글자크기 설정


《아무리 짓이기고 짓이겨도
다 짓이겨지지 않고
조금도 찢어지거나 부서지지도
않는 껌.
살처럼 부드러운 촉감으로
고기처럼 쫄깃한 질감으로…
이빨들이 잊고 있던 먼 살육의
기억을 깨워
그 피와 살과 비린내와 함께
놀던 껌.
-‘껌’》
‘조심조심 노인이 걷고 있다…걸음에 연결된 모든 관절을 조금씩 마비시키는 죽음/동작 속에 스며들어 보이지 않게 자라온 죽음이/있는 힘을 다해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사뿐사뿐 걷고 있다.’ (‘한가한 숨막힘’)
모든 삶은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 노인의 병들고 노쇠한 몸과 위태위태한 걸음마다 숨 막히는 시간의 층이 엿보인다. 올해로 등단 20년을 맞은 김기택 시인(52)에게 노인과 장애는 시작(詩作)의 오랜 관심사이기도 했다. 등단 작 ‘곱추’도 지하도에서 돈을 구걸하는 장애노인을 그려낸 작품이었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만난 그는 “늙음이란 일종의 장애처럼 우리 몸이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며 “사회적으로는 약자, 육체적으론 정상적인 몸의 균형이 깨진 이들에게 유독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나이 듦이란 결국엔 죽음의 정서와 연결된다. 이번 시집에서 그는 몸에 깃들어 존재하는 죽음뿐 아니라 살기 위해 이뤄지는 죽음의 행위들까지 냉철하고 집요한 시선으로 파헤친다. 그 가운데 우리가 씹고, 잡아먹는, 일상적인 음식들이 있다.
시인은 격렬하게 꿈틀거리는 산낙지를 이빨로 짓이기며 물어뜯는 게걸스러운 식욕(‘산낙지 먹기’)과 목, 다리가 잘린 채 좌판에 진열된 통닭(‘절하다’)을 보면서 생명 유지를 위해 태연작약하게 이뤄지는 죽음의 행위들을 본다. 인간의 몸속에 잠재된 동물적인 공격성, 살육에 대한 원초적인 쾌감은 표제작에서 잘 드러난다.
이런 원초적인 죽음의 행위, 현대인들이 잊고 있던 그 원시성은 ‘속도감’과 연결된다. 어딘가에 허겁지겁 쫓기면서도 맹목적인 돌진을 멈출 수 없는 현대인들의 불안과 강박은, 살기 위해 아귀같이 뭔가를 먹어치우는 본능적인 욕망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운전을 아무래도 멈출 수 없을 것 같다,/교통사고로 죽거나/불행하게도 죽지는 않아서 엉덩이에 휠체어 바퀴가 달리거나/아니면 더욱 불행하게도/사람을 바퀴로 으깨 죽이기 전까지는…이 불편한 속도를 포기할 수 없을 것 같다’(‘죽거나 죽이거나 엉덩이에 뿔나거나’)
이번 시집은 4년 만에 펴낸 김 시인의 다섯 번째 시집이자 오랜 직장생활을 접고 전업시인이 된 후 펴낸 첫 시집이기도 하다. 김 시인은 “시는 내게 상상력으로 된 ‘제2의 삶’과 같다. 현실은 늘 불만족스럽고 권태롭지만 상상력 있는 다른 시공간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회사생활을 하는 동안 시간이 없어 주로 길 위에서 시를 썼는데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서 책상머리에 앉아 시 쓰는 게 어색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때로는 골목길, 때로는 시장 좌판, 때로는 도로를 돌며 그의 시선도 여전히 길 위에 있는 듯하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스타일 >
-

알쓸톡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사설
구독
트렌드뉴스
-
1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 당해
-
2
가짜 돈 내민 할머니에게 7년째 음식 내준 노점상
-
3
“2살때 농지 취득 정원오 조사하라” vs “자경의무 없던 시절”
-
4
김정은 “한국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동족서 영원히 배제”
-
5
“잠만 자면 입이 바싹바싹”…잠들기 전에 이것 체크해야 [알쓸톡]
-
6
李 “저도 꽤 큰 개미였다…정치 그만두면 주식시장 복귀”
-
7
국힘 간판으론 어렵다?… 서울 구청장 예비후보 민주 35명 국힘 13명
-
8
李 “인천공항서 지방공항 가려면 ‘김포’ 거쳐야…시간 너무 걸려”
-
9
美국무부 인사들, 수사 논란 손현보-김장환 목사 만났다
-
10
‘짠순이 전원주’ 며느리도 폭로…“카페서 셋이 한잔만 시켜”
-
1
김정은 “한국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동족서 영원히 배제”
-
2
李 “인천공항서 지방공항 가려면 ‘김포’ 거쳐야…시간 너무 걸려”
-
3
“2살때 농지 취득 정원오 조사하라” vs “자경의무 없던 시절”
-
4
‘짠순이 전원주’ 며느리도 폭로…“카페서 셋이 한잔만 시켜”
-
5
한미동맹 잇단 엇박자… 야외 기동훈련도 공개 이견
-
6
李 “묵히는 농지 매각 명령이 공산당?…이승만이 헌법에 명시”
-
7
與, 위헌논란 법왜곡죄 막판 부랴부랴 수정…본회의 상정
-
8
추미애 “법왜곡죄 위헌이라 왜곡말라…엿장수 판결 두고 못봐”
-
9
‘李 공소취소’ 당 공식기구 만든 정청래…공취모 “우리와 별개”
-
10
[송평인 칼럼]‘빙그레 엄벌’ 판사와 ‘울먹이는 앵그리버드’ 판사
트렌드뉴스
-
1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 당해
-
2
가짜 돈 내민 할머니에게 7년째 음식 내준 노점상
-
3
“2살때 농지 취득 정원오 조사하라” vs “자경의무 없던 시절”
-
4
김정은 “한국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동족서 영원히 배제”
-
5
“잠만 자면 입이 바싹바싹”…잠들기 전에 이것 체크해야 [알쓸톡]
-
6
李 “저도 꽤 큰 개미였다…정치 그만두면 주식시장 복귀”
-
7
국힘 간판으론 어렵다?… 서울 구청장 예비후보 민주 35명 국힘 13명
-
8
李 “인천공항서 지방공항 가려면 ‘김포’ 거쳐야…시간 너무 걸려”
-
9
美국무부 인사들, 수사 논란 손현보-김장환 목사 만났다
-
10
‘짠순이 전원주’ 며느리도 폭로…“카페서 셋이 한잔만 시켜”
-
1
김정은 “한국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동족서 영원히 배제”
-
2
李 “인천공항서 지방공항 가려면 ‘김포’ 거쳐야…시간 너무 걸려”
-
3
“2살때 농지 취득 정원오 조사하라” vs “자경의무 없던 시절”
-
4
‘짠순이 전원주’ 며느리도 폭로…“카페서 셋이 한잔만 시켜”
-
5
한미동맹 잇단 엇박자… 야외 기동훈련도 공개 이견
-
6
李 “묵히는 농지 매각 명령이 공산당?…이승만이 헌법에 명시”
-
7
與, 위헌논란 법왜곡죄 막판 부랴부랴 수정…본회의 상정
-
8
추미애 “법왜곡죄 위헌이라 왜곡말라…엿장수 판결 두고 못봐”
-
9
‘李 공소취소’ 당 공식기구 만든 정청래…공취모 “우리와 별개”
-
10
[송평인 칼럼]‘빙그레 엄벌’ 판사와 ‘울먹이는 앵그리버드’ 판사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스타일]'비대칭형' 헤어컷…중성미가 찰랑 찰랑](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2/01/17/684566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