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논쟁! 이 책]정순우 ‘공부의 발견’
-
입력 2007년 3월 31일 03시 19분
글자크기 설정

근년 미국 하버드대에서는 교육과정 개혁에 관해 조용하지만 긴 논의가 있었다. 이 논의에서 회자되었던 것이 “교육이란 빈 통에 물 채우기가 아니라, 불을 밝혀 주는 것”이라는 예이츠의 시구라 한다. 유교 고전인 ‘대학(大學)’의 목표인 “명명덕(明明德)”, 즉 “명덕을 밝혀 주는 것”이라는 말과 딱 맞아 떨어진다. 교육은 그리고 공부란 배우는 사람의 내부에 있는 심지에 불을 붙여 스스로 환히 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공부를 그칠 수 없게 된다. 제대로 된 나라는 이런 문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조선 시대 문명(文名)을 날렸던 쟁쟁한 유학자들의 공부론을 차분하게 정리한 이 책이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생각하게 해 주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막상 이 책의 지은이는 서구 근대의 공부관과 유교의 공부론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물리(物理)와 도리(道理), 자연에 관한 지식과 인성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분리한 것이 서구 근대의 철학이라면, 이 둘을 일체로 보았던 것이 유교 사유의 핵심이라고 지은이는 말한다.
흔히 데카르트 이래 서양 철학은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을 분리해 철저히 이원화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한때를 풍미했던 포스트모던 근대비판 논리의 단골 메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진단이 과연 정확한 것인가.
칸트에게 물리에 관한 사변이성과 도리에 관한 실천이성은 결국 하나다. 물자체는 인식 너머에 있지만 또한 인식 너머에 물자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칸트의 인식론, 존재론, 도덕론이 회통한다. 흥미롭게도 서구 근대성을 회복 불가능해 보이리만큼 철저히 공격했던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이 칸트로 되돌아오고 있다. 칸트만 특별한 것인가. 반대로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등 서구 근대철학의 대표자들이 모두 그렇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근대와 근대 이전의 사유체계에는 차이가 없다는 말인가. 우리의 근대 이전의 유교 사회와 오늘이 결국은 다를 게 없다는 말인가.
다름이 있다. 그 다름은 하나였던 물리와 도리를 둘로 나눈 것이 아니었다. 그 둘 간의 (분리가 아닌) 구분은 원래 있었다. 괴력난신(怪力亂神)은 언급할 바 아니라 했던 공자의 언명에도 그런 생각의 단초는 있다. 서양 고대에서도 그런 발상은 있었다. 결정적 다름은 물리와 도리를 이성의 한계 내에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에 있다. 근대적 사고의 특징이란 이성의 한계 내에서 물리와 도리를 생각한다는 것을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행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성은 영원히 엄정한 자기물음 아래 있다.
지은이가 굳이 서구 근대와 우리 전통을 강하게 구분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실천적 동기에는 깊이 공감한다. 현실의 오염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어떤 이상적 상태를 과거 안에 깊이 감추어 두었다가 때 묻지 않은 그것을 현재 속에 추출하여 미래의 대안으로 내놓고 싶어 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미래의 대안이란 그 시대 나름의 미덕을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어떤 것을 흠집 없이 오롯이 떠옴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반대로 오늘날 칸트를 비판적으로 다시 읽어 칸트 속에 숨겨 있던 의미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 것처럼, 퇴계와 다산 역시 치열하게 비판적으로 읽어 줘야 그 속에서 미래의 싹이 제대로 찾아지지 않을까.
이 책을 찬찬히 뜯어보면 지은이가 독자에게 그것을 은근히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김 상 준 경희대 NGO대학원 교수
트렌드뉴스
-
1
배우 얼굴 가린다고…아기 폭우 맞히며 촬영, ‘학대’ 논란
-
2
‘린과 이혼’ 이수, 강남 빌딩 대박…70억 시세 차익·159억 평가
-
3
“李는 2인자 안둬…조국 러브콜은 정청래 견제용” [정치를 부탁해]
-
4
“차 대지마” 주차장 바닥에 본드로 돌 붙인 황당 주민 [e글e글]
-
5
李 “아이 참, 말을 무슨”…국무회의서 국세청장 질책 왜?
-
6
이해찬 前총리 시신 서울대병원 빈소로…31일까지 기관·사회장
-
7
中외교부 “서해 구조물 일부 이동작업…기업 자체 판단”
-
8
부상 선수 휠체어 밀어준 김상식, 베트남 사로잡았다
-
9
“전격 숙청된 중국군 2인자 장유샤, 핵무기 정보 美 유출 혐의”
-
10
이재용 차에서 포착된 음료수…전해질 많다는 ‘이것’이었다
-
1
이해찬 前총리 시신 서울대병원 빈소로…31일까지 기관·사회장
-
2
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25%로 원복…韓국회 입법 안해”
-
3
한동훈 “김종혁 탈당권유, 北수령론 같아…정상 아냐”
-
4
협상끝난 국가 관세복원 처음…조급한 트럼프, 韓 대미투자 못박기
-
5
국힘 윤리위, 김종혁에 ‘탈당권유’ 중징계…친한계와 전면전?
-
6
李 “아이 참, 말을 무슨”…국무회의서 국세청장 질책 왜?
-
7
조정식·윤호중·김태년·강기정…‘이해찬의 사람들’ 곳곳에 포진
-
8
與 “통과시점 합의 없었다” vs 국힘 “與, 대미투자특별법 미적”
-
9
李 “힘 세면 바꿔준다? 부동산 비정상 버티기 안돼”
-
10
국힘 윤리위 “김종혁, 탈당 권유” 중징계… 張-韓 갈등 심화
트렌드뉴스
-
1
배우 얼굴 가린다고…아기 폭우 맞히며 촬영, ‘학대’ 논란
-
2
‘린과 이혼’ 이수, 강남 빌딩 대박…70억 시세 차익·159억 평가
-
3
“李는 2인자 안둬…조국 러브콜은 정청래 견제용” [정치를 부탁해]
-
4
“차 대지마” 주차장 바닥에 본드로 돌 붙인 황당 주민 [e글e글]
-
5
李 “아이 참, 말을 무슨”…국무회의서 국세청장 질책 왜?
-
6
이해찬 前총리 시신 서울대병원 빈소로…31일까지 기관·사회장
-
7
中외교부 “서해 구조물 일부 이동작업…기업 자체 판단”
-
8
부상 선수 휠체어 밀어준 김상식, 베트남 사로잡았다
-
9
“전격 숙청된 중국군 2인자 장유샤, 핵무기 정보 美 유출 혐의”
-
10
이재용 차에서 포착된 음료수…전해질 많다는 ‘이것’이었다
-
1
이해찬 前총리 시신 서울대병원 빈소로…31일까지 기관·사회장
-
2
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25%로 원복…韓국회 입법 안해”
-
3
한동훈 “김종혁 탈당권유, 北수령론 같아…정상 아냐”
-
4
협상끝난 국가 관세복원 처음…조급한 트럼프, 韓 대미투자 못박기
-
5
국힘 윤리위, 김종혁에 ‘탈당권유’ 중징계…친한계와 전면전?
-
6
李 “아이 참, 말을 무슨”…국무회의서 국세청장 질책 왜?
-
7
조정식·윤호중·김태년·강기정…‘이해찬의 사람들’ 곳곳에 포진
-
8
與 “통과시점 합의 없었다” vs 국힘 “與, 대미투자특별법 미적”
-
9
李 “힘 세면 바꿔준다? 부동산 비정상 버티기 안돼”
-
10
국힘 윤리위 “김종혁, 탈당 권유” 중징계… 張-韓 갈등 심화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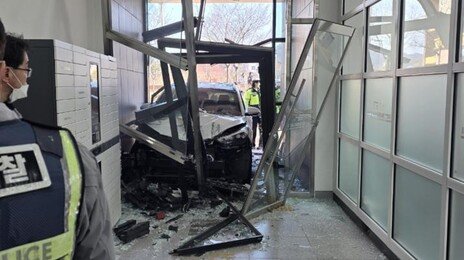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