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인문사회]영국적인, 너무나 영국적인
-
입력 2006년 7월 15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이 책은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영국적인 것(Britainess) 또는 잉글랜드적인 것(Englishness)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유럽 섬나라의 특징이 한국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이 질문은 바로 한국적인 것(Koreaness)에 대한 질문과 연결된다.
영국은 오늘날 보수주의라고 불리는 조류의 원형을 이루는 나라다. 보수주의 하면 떠오르는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가 영국인인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미 1500년 런던주재 베네치아 대사가 “잉글랜드인들은 자기 애착이 너무 강하고, 자기들 것은 무엇이나 좋아한다”고 갈파했듯이 영국인의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은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영국인은 세계의 4분의 1을 지배하던 대영제국 시절에도 식민지는 물론 유럽대륙과도 차별성을 강조하는 일국주의를 고수했다. 즉 자유를 사랑하면서도 질서와 전통을 존중하고, 추상적 원칙보다는 경험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중시하고, 과묵하면서도 근면 자조의 정신이 뛰어난 영국적 특징은 독특한 역사와 경험을 지닌 영국인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술을 찾으러 이탈리아를 가듯 이상적 정부를 발견하려면 잉글랜드로 가라”는 말을 낳을 만큼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졌다. 입헌군주제, 불문헌법, 독특한 양원제, 국교회(성공회)는 영국적 풍토에서만 가능하다는 자부심이다. 이런 영국적 예외성에 대한 자부심은 미국으로 이식돼 ‘미국예외주의’의 원형이 된다.
이 책은 바로 이런 보수주의의 뿌리로서 영국적인 것이 어떻게 구성돼 왔는지를 흥미롭게 추적했다. 영국을 상징하는 캐릭터로서 브리타니아와 존 불의 역사에서부터, 영국적인 특징으로서 전원주의의 재발견, 축구 럭비 크리켓 테니스 골프 등 근대 스포츠 종가의 전통과 영국적 국민성의 함수관계, 로빈 후드와 엘리자베스여왕에 대한 국민영웅화 담론의 이면, 보편주의를 추구한 유럽 지식인들과 달리 애국주의적 성향이 뚜렷했던 영국 지식인들의 풍모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저자(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가 번역한 에릭 홉스봄의 ‘만들어진 전통’이 그런 영국성의 허구를 폭로하는 데 충실했다면, 이 책은 ‘영국성’이 정치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역동성에 주목한다. 이는 결국 오늘날 한국 보수주의에서 진정으로 결여된 부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기도 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세계 보편의 가치 말고 한국 보수주의가 지켜야 할 ‘한국적인 것’은 과연 무엇인가.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인문사회 >
-

광화문에서
구독
-

샌디에이고 특별전 맛보기
구독
-

횡설수설
구독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5
앤드루 前왕자, 누운 여성 신체에 손댄 사진… 英사회 발칵
-
6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7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8
이광재 돌연 지선 불출마… 明心 실린 우상호 향해 “돕겠다”
-
9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10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3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4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7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10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5
앤드루 前왕자, 누운 여성 신체에 손댄 사진… 英사회 발칵
-
6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7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8
이광재 돌연 지선 불출마… 明心 실린 우상호 향해 “돕겠다”
-
9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10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3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4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7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10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콩나물 팍팍 무쳤냐”… 국민 울고 웃긴 예능史](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2/10/8860349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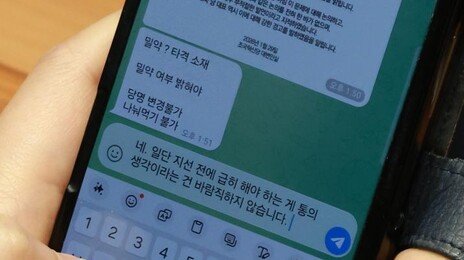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