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인문사회]‘소로우와 에머슨의 대화’
-
입력 2006년 1월 14일 03시 02분
글자크기 설정

1848년 9월 17일, 서른한 살의 생일을 맞은 소로는 우울했다. 로웰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시인에게서 지독한 선물을 받았던 것이다.
로웰은 소로를 빗대 ‘에머슨의 발자국을 고통스럽게 짧은 다리로 따라가는, 희한한 친구’라고 풍자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형제 시인이여/좋은 과실을 직접 기르고/이웃 에머슨의 과수원은 그대로 둘 순 없는가?”
그것은 소로에게 지극히 부당한 평가였다. 그는 에머슨과 함께 행진했으나 결코 발을 맞춘 적은 없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고수(鼓手)의 북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소로)
19세기 미국 정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콩코드의 현인(賢人)’, 헨리 데이비드 소로와 랠프 월도 에머슨. 이 책은 25년을 헤아리는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사상과 작품의 배경을 한올 한올 풀어 나간다. 제자와 스승의 관계로 시작해 오랜 세월 불신과 오해가 쌓여 가면서도 마지막까지 벗으로 남고자 했던 그들의 발자취를 더듬는다.
에머슨은 소로를 ‘나의 선한 헨리’라고 불렀다. 젊은 소로에게서 새로운 세계를 비추는 내면의 빛을 보았던 에머슨은 그를 시인의 길로 인도하고자 애썼다.
 |
자신의 서재를 소로에게 개방했고, 1841년 소로는 아예 에머슨의 집에 들어와 3년을 살았다. ‘이리저리 달랑달랑 흔들리는/수고로운 빈 상자’라고 자조하던 소로의 내면을 채워 준 것은 ‘제우스의 자궁’, 바로 에머슨의 집이었다.
에머슨은 끊임없이 소로에게 “생각이 붓끝에서 흘러나오게 노력하라”고 독려했다. 그러나 그는 소로의 날카로운 지성의 창끝이 자신을 겨누게 되리라고는 미처 알지 못하였다.
소로는 1849년 출간된 ‘콩코드 강과 메리맥 강에서의 일주일’에서 에머슨의 글을 이렇게 꼬집었다. “오, 고귀한 동무여/만약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 내용이 교활함보다/계시가 많으면 좋을 것을!”
에머슨은 불쾌했다. 그는 이 책이 “큰 구슬들을 엮어 내기엔 실이 너무 가느다랗다”고 내쳤다.
1850년대에 이르러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소로는 여전히 에머슨의 집을 들락거렸으나 이태 뒤 펴낸 ‘월든’은 에머슨의 심기를 거슬렀다. 소로는 에머슨이 빌려 준 땅에 통나무집을 짓고 살았음에도 자신은 단지 ‘법적인 근거 없이 사는 무단 거주자’라고 썼다.
에머슨이 출세가도를 달리며 성공의 열매를 맛보고 있을 즈음, 소로는 내면의 세계로 침잠해 들어갔고 둘 사이는 점점 틈이 벌어졌다.
월든 호숫가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소로는 이렇게 불쑥 내질렀다. “만약 당신이 딛고 선 흙이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소!”
에머슨은 쓰게 내뱉을 뿐이었다. “나의 헨리여, 개구리는 애당초 늪지에서 살게 되어 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네….”
두 사람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해야 했다. 에머슨이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을 때, 소로는 비로소 그걸 깨달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에머슨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사슬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다….”
그들은 우연히 만났으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이가 됐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던 것일까. 아니면 진정 고독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았기에 강한 결속을 느꼈던 것일까.
마흔다섯의 나이에 소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에머슨은 그가 없는 세상에 위협을 느꼈다. 에머슨에게 소로의 때 이른 죽음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그토록 숭고한 영혼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다 보여 주기 전에 이승을 떠났다는 것은 모욕이다!”
그것은 소로의 문학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오랜 우정에 대한 뼈아픈 회한이었다.
소로 또한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약초를 가꾸듯 가난을 가꾸어라. 헌 옷을 뒤집어서 다시 짓고 옛 친구에게 돌아가라. 사물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우리들이다….”
(책에는 ‘소로우’로 돼 있으나 외래어표기법에 따르면 ‘소로’임)
이기우 문화전문기자 keywoo@donga.com
인문사회 >
-

사설
구독
-

기고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트렌드뉴스
-
1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폭탄…월요일 출근길 비상
-
2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3
인간은 구경만…AI끼리 주인 뒷담화 내뱉는 SNS ‘몰트북’ 등장
-
4
美 군사작전 임박?…감시 항공기 ‘포세이돈’ 이란 인근서 관측
-
5
60조 캐나다 잠수함 입찰 앞둔 한화, 현지에 대대적 거리 광고
-
6
한국인의 빵 사랑, 100년 전 광장시장에서 시작됐다
-
7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8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9
0.24초의 기적…올림픽 직전 월드컵 우승 따낸 ‘배추 보이’ 이상호
-
10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7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8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9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10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트렌드뉴스
-
1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폭탄…월요일 출근길 비상
-
2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3
인간은 구경만…AI끼리 주인 뒷담화 내뱉는 SNS ‘몰트북’ 등장
-
4
美 군사작전 임박?…감시 항공기 ‘포세이돈’ 이란 인근서 관측
-
5
60조 캐나다 잠수함 입찰 앞둔 한화, 현지에 대대적 거리 광고
-
6
한국인의 빵 사랑, 100년 전 광장시장에서 시작됐다
-
7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8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9
0.24초의 기적…올림픽 직전 월드컵 우승 따낸 ‘배추 보이’ 이상호
-
10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7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8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9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10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콩나물 팍팍 무쳤냐”… 국민 울고 웃긴 예능史](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2/10/8860349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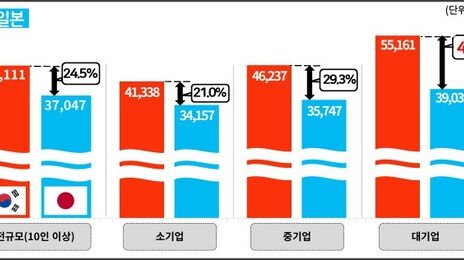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