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책갈피 속의 오늘]'자유를 꿈꾸며'1996년 서태지 은퇴 발표
-
입력 2004년 1월 30일 18시 52분
글자크기 설정

서태지. 이제 서른을 훌쩍 넘긴 ‘10대.’ 1990년대 한국 대중문화의 ‘보통명사’가 되었던 뮤지션.
그 느낌의 핵(核)은 자유다. 일탈(逸脫)에의 욕구다.
그는 지하시장에 잠복해 있던 TV세대의 반란을 브라운관으로 끄집어 올렸다. 그리고 그는 내내 이 전지전능한 매체를 저울질했다.
그는 지상(地上)으로 솟구쳐 오른 ‘언더’다. 그는 “내 음악의 고향은 언더”라고 말하지만 서태지는 ‘세상 밖’에서 대중을 만났다. 그는 제도권에 안착한 전위(前衛)였다. 그 양면성은 두고두고 그에게 멍에가 된다.
1992년 데뷔한 ‘서태지와 아이들.’ 3년10개월 뒤 은퇴를 선언하기까지 음반은 600만장 이상이 팔렸다. 문화적 사건이었다.
어른들은 서태지의 노래에 당황했다. 이런저런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훈시에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그러나 어른들은 서태지의 음악에 열광할 순 없어도, 그들이 만들어 내는 열광엔 열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드롬이었다. 그즈음 삼성경제연구소는 광복 이후 최대의 히트상품으로 ‘서태지와 아이들’을 꼽았다. ‘서태지 담론’이 무성했다.
고교를 자퇴했던 서태지. 그의 음악에는 마이너리티 정신이랄까, 반골기질이 농후하다.
그의 매니지먼트 감각은 천부적이었다. 서태지의 상술(商術)은 그의 ‘천재성과 혁명성’의 본질이기도 하다. 대중성과 상업성이 있었기에 그는 혁명적이었던 것이다.
은퇴 발표와 복귀. 그리고 되풀이되는 잠적과 활동 재개…. 모든 문화와 사람에게는 ‘황홀한 시대’가 있다고 했던가. 어느덧 ‘서태지 신화’는 덧칠되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그에게는 항상 고뇌가 느껴진다. “나는 무엇을 위해 노래하는가. 나 자신을 위해? 팬들을 위해? 아니면 사회를 위해?”
결코 쉽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 속의 나를 들여다보고, 그를 따라갈 뿐이지요….”
이기우기자 keywoo@donga.com
책갈피속의 오늘 >
-

오늘의 운세
구독
-

사설
구독
-

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구독
트렌드뉴스
-
1
[단독]폴란드, 韓 해군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 무상 양도 안받기로
-
2
“하메네이 사망” 트럼프 공식 발표…“일주일간 폭격할 것”
-
3
트럼프, 이란 공습 전 ‘8인방’에 긴급통보…베네수엘라 위법 논란 털어내
-
4
“‘표심’ 따라 이란 친 트럼프…지독하게 변덕스럽지만 치밀해” [트럼피디아] 〈60〉
-
5
하메네이 딸-사위도 사망…美 ‘단 하루’ 공습에 36년 독재 끝났다
-
6
집무실 ‘가루’ 된 하메네이…권력 계승자 4명 정해놔
-
7
공습 시작에 테헤란 직장인들, 울며 자녀 학교로 뛰어가…검은 토요일
-
8
이란혁명수비대 “호르무즈 해협 봉쇄”…유가 배럴당 100달러 가나
-
9
中 “美의 이란 공습 즉각 중단해야…이란 주권과 영토 보전 존중”
-
10
‘부화방탕 대명사’ 북한 2인자 최룡해의 퇴장 [주성하의 ‘北토크’]
-
1
전한길 토론 보더니… 장동혁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재설계 필요”
-
2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3
“하메네이 사망” 트럼프 공식 발표…“일주일간 폭격할 것”
-
4
하메네이 딸-사위도 사망…美 ‘단 하루’ 공습에 36년 독재 끝났다
-
5
송광사 찾은 李대통령 내외…“고요함 속 다시 힘 얻어”
-
6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7
‘총 쏘는 13세 김주애’ 단독샷 이례적 공개…또 가죽점퍼
-
8
대구 간 한동훈 “죽이되든 밥이되든 나설것”
-
9
이란, 중동 美기지 4곳 ‘조준 공격’…“미군 4만명 이란 사정권”
-
10
집무실 ‘가루’ 된 하메네이…권력 계승자 4명 정해놔
트렌드뉴스
-
1
[단독]폴란드, 韓 해군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 무상 양도 안받기로
-
2
“하메네이 사망” 트럼프 공식 발표…“일주일간 폭격할 것”
-
3
트럼프, 이란 공습 전 ‘8인방’에 긴급통보…베네수엘라 위법 논란 털어내
-
4
“‘표심’ 따라 이란 친 트럼프…지독하게 변덕스럽지만 치밀해” [트럼피디아] 〈60〉
-
5
하메네이 딸-사위도 사망…美 ‘단 하루’ 공습에 36년 독재 끝났다
-
6
집무실 ‘가루’ 된 하메네이…권력 계승자 4명 정해놔
-
7
공습 시작에 테헤란 직장인들, 울며 자녀 학교로 뛰어가…검은 토요일
-
8
이란혁명수비대 “호르무즈 해협 봉쇄”…유가 배럴당 100달러 가나
-
9
中 “美의 이란 공습 즉각 중단해야…이란 주권과 영토 보전 존중”
-
10
‘부화방탕 대명사’ 북한 2인자 최룡해의 퇴장 [주성하의 ‘北토크’]
-
1
전한길 토론 보더니… 장동혁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재설계 필요”
-
2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3
“하메네이 사망” 트럼프 공식 발표…“일주일간 폭격할 것”
-
4
하메네이 딸-사위도 사망…美 ‘단 하루’ 공습에 36년 독재 끝났다
-
5
송광사 찾은 李대통령 내외…“고요함 속 다시 힘 얻어”
-
6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7
‘총 쏘는 13세 김주애’ 단독샷 이례적 공개…또 가죽점퍼
-
8
대구 간 한동훈 “죽이되든 밥이되든 나설것”
-
9
이란, 중동 美기지 4곳 ‘조준 공격’…“미군 4만명 이란 사정권”
-
10
집무실 ‘가루’ 된 하메네이…권력 계승자 4명 정해놔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창간특집]책갈피 속의 4월 1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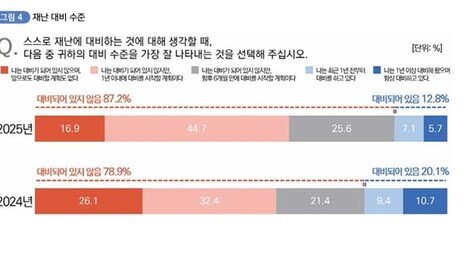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