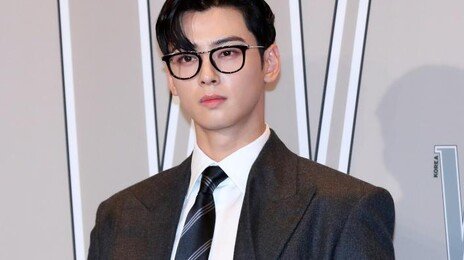공유하기
[한국인의 魂 한국의 힘]김열규/전통서 새 패러다임찾자
-
입력 1999년 12월 31일 21시 19분
글자크기 설정
인류의 신화는 창세기편과 짝지어서 필연적으로 종말론을 예언했거니와 이 두 가지 위기신호는 인류와 온 생명체, 그리고 지구의 묵시록의 묵시록이고 최후의 종말론이다.
그것은 ‘남과 여, 백인종과 유색인종, 권력자와 서민’ 사이에서 활개친 주종(主從)이며 지배와 복속의 관계가 ‘인간과 자연, 문화와 자연’ 사이에서도 난장판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 관계에서는 억압, 착취, 파괴가 자행되었다.
르네상스 이후 서구 휴머니즘이 이룩한 문호의 발달이 ‘멀디벨로프먼트(maldevelopment)’, 곧 ‘오류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 때문이다.
그리하여 서구의 오류의 발달을 뒤밟은 우리로서는 우리 자신의 문화 전통에서 무엇인가 회생을 위한 단서를 잡아야 할 계제에 다다라 있다. 그리고 그 단서가 새 천년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싶다.
나지막하게 서로 들여다보이게 울(울타리)을 친 우리의 옛길들이 옹기종기 모인 마을은 산을 등지고 개울과 들을 내다보는 우묵한 터전이다. 그 앞을 ‘우실’의 숲이 가리고 서면 자연지형은 마을을 위한 큰 울, 아니면 커다란 둥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은 ‘연접된 개방 공간’으로 폐쇄와 단절의 사슬로 묶인 도시 공간과는 달랐다. 그 마을 안에는 또한 하늘과 땅과 사람을 두루 한줄기로 통하게 한 ‘우주나무’, 곧 서낭나무가 솟아서 온 마을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
자연환경의 지형과 우주 구조에서 유추된 주거공간, 그것이 우리의 마을이었다. 자연의 모상(模像)으로 지형의 품 속에 이룩된 마을이다.
지형과 우주를 따라 구조화된 바로 그 마을 안에 자리한 우리의 집은 자연을 향해 열려 있었다. 한 일(一)자의 세칸 집이라면 사방이 활짝 트인 마루방을 가운데로 해서 양쪽에 안방 건넌방이 자리한다. 바람과 해와 달빛 그리고 안개가 드나든 것은 마루방만이 아니다. 양 옆의 방도 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해와 달빛 그리고 바람을 방 안에서 무시로 쐬고 있는 목숨이면 푸나무도 들짐승도 같이 그 존재성을 누렸을 것이다. 거기‘유기적 개방공간’ 속에서 인간은 그 초록빛 생명을 가꾸었을 것이다.
내친 김에 옛 한국인들은 산기슭이나 물가에 나가서 정자를 지었다. 네 기둥 이외엔 어떤 칸막이도 없는 ‘개방가옥’의 이상형이다. 그리하여 옛시조는 ‘달과 해와 안개와는 달리, 산과 강은 들일 데가 없으니 멀리 두고 보리라’고 정자를 노래한 것이다.
우리의 집은 ‘받아들임’을 이상화했다. 이같은 마을, 이같은 집, 이같은 정자에서 옛 한국인은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를 삶의 지표로 삼았다.
‘산수간의 인간’은 주체가 아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에 주객이며 주종의 사슬은 없다. 산수가 울이고 보호 그 자체다. 우리의 산수화에서 산수가 너무나 당당한데 비해 인간이 차라리 초라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산수가 되레 주체다. 자연이 거의 곁다리의 배경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 대세인 서구의 풍경화나 전원화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2000년은 바야흐로 환경시대. 우리 전통에서 종말론을 이길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을 수 있는 작은 단서가 이에서 마련되기 바란다.
김열규<인제대교수·국문학>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3
“어깨 아프면 약-주사 찾기보다 스트레칭부터”[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
4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5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6
주식 혐오했던 김은유 변호사, 53세에미국 주식에서 2100% 수익률 달성한 사연
-
7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8
‘나홀로집에 케빈 엄마’ 캐서린 오하라 별세…향년 71세
-
9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10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3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4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5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6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7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8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9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10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3
“어깨 아프면 약-주사 찾기보다 스트레칭부터”[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
4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5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6
주식 혐오했던 김은유 변호사, 53세에미국 주식에서 2100% 수익률 달성한 사연
-
7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8
‘나홀로집에 케빈 엄마’ 캐서린 오하라 별세…향년 71세
-
9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10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3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4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5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6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7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8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9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10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