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원(1957∼ )
죽집에 간다
홀로, 혹 둘이라도 소곤소곤
죽처럼 조용한 사람들 사이에서
죽을 기다린다
죽은 오래 걸린다 그러나
채근하는 사람은 없다
초본식물처럼 그저 나붓이 앉아
누구나 말없이 죽을 기다린다
조금은 병약한 듯
조금은 체념한 듯
조금은 모자란 듯
조그만 종지에 담겨 나오는 밑반찬처럼
소박한 어깨들
죽 앞의 과시는 없다
죽 뒤의 배신도 없을 거라 믿는다
고성이 없고
연기가 없고
원조가 없고
다툼이 없는 죽집
감칠맛도 자극도 중독도 없는
백자 같은, 백치 같은 죽
무엇이든 잘게 썰어져야
형체가 뭉개져야
반죽 같은 죽이 된다
나는 점점 죽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요지를 이빨 사이에 낀 채 긴 트림을 하는
생고깃집과 제주흑돼지 오겹살집 사이에서
죽은 듯 죽집은 끼어 있다
죽은 후에도 죽은 먹을 수 있을 것만 같다

황인숙 시인
황인숙의 행복한 시 읽기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데스크가 만난 사람
구독
-

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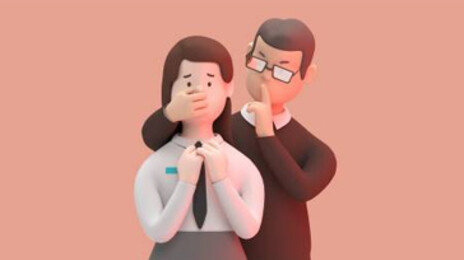
자기 반 여중생 간음·추행…30대 선생, 징역 6년 확정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사고관련 이범석 청주시장 소환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홍준표, 한국축구 올림픽 진출 실패에 또 쓴소리 “겸임시키더니 이 꼴”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황인숙의 행복한 시 읽기]맨발](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5/01/07/68947635.1.jpg)
![[황인숙의 행복한 시 읽기] 죽](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5/01/05/68906752.1.jpg)
![[황인숙의 행복한 시 읽기] 해를 보는 기쁨](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5/01/02/68878326.2.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