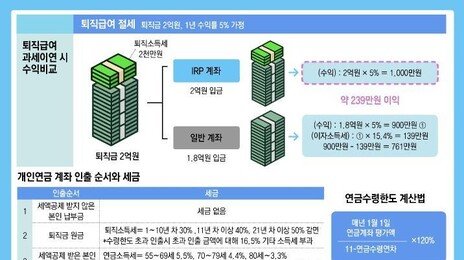공유하기
[오늘과 내일/허승호]한 터키 친구의 축원
-
입력 2009년 6월 15일 02시 59분
글자크기 설정

비즈니스의 규칙, 국가 간의 규칙
그곳에 온 외국인들은 생각보다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신문기자는 마구 질문을 쏟아냈다. “김정일은 미친 것 아닌가? 한국인들은 북한을 두려워하는가? 북한은 체제 유지가 가능할까?”
가봉의 수출업자는 ‘KORE’라는 필자의 터키어 국적 표식에 “남한이겠구나?” 하고 물었다. ‘어떻게 아는가?’ 손숙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난 적이 있다는 그는 “교역 증진을 위한 이 같은 행사에 북한이 참석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나미비아의 기자는 얼마 전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북한은 정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미국의 일간지 ‘글로벌애틀랜타’의 기자는 셔틀버스 옆자리에 앉은 영국 기자에게 현대자동차 몽고메리 공장에 다녀온 느낌을 열을 올려 전달하고 있었다. “정말 대단했다. 그 공장으로 도시 분위기가 바뀌었다. 불황에도 해고하지 않는 정책도 주민들을 감동시켰다.” 터키인들의 친근감 표시는 유별났다. 재래시장 과일가게 상인은 한국인이라니까 2002월드컵 응원구호 ‘대∼한민국’을 외쳤다. 그의 동료는 “박수가 틀렸다”며 짝짝짝∼짝짝 박자를 교정해 보여줬다.
낯선 환경, 새로운 정보에 노출될 때 ‘마음이 열린 사람’은 모르던 것을 본다. 배우고 변화하며 성장한다. 하지만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에게는 기존 관념을 강화하는 것들만 보인다. 아아, 필자 또한 터키까지 와서 새로운 것을 보고 듣기보다는 이미 알던 것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완고’라는 말이 떠올라 가슴 한쪽이 허전했다. 하지만 어쩌랴, ‘한국이 더는 미지의 나라가 아니어서 생기는 일’이라고 애써 자위하고 말았다. 사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과 교역규모에서 세계 10위권의 만만치 않은 대국이다. 북한은 또 다른 의미의 뉴스메이커다.
그런데 ‘아는 것만 보고 가는구나’ 하는 필자 생각을 뒤집는 일이 일어났다. 한 터키 공무원의 얘기를 듣고서였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사업가들이 모였다. 나는 사업에 대해 잘 모르지만 사업엔 나름의 규칙이 있다고 알고 있다. 상대에게 이익이 되도록 제안하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다. 거래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돈 벌고 성공한다. 국가 간에도 이 규칙이 적용된다면 전쟁은 없을 것이다. 나는 비즈니스의 규칙에 대해 ‘예스’라고 말한다. 무슨 이유에서건 전쟁에는 ‘노’다. 세상을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의 규칙을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다.”(이스탄불 시 바이람파샤 구의 무하렘 카부르카즈 부구청장)
고아가 슬피 우는 일 다시 없기를
세상에, 시장의 원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하다니. ‘우리가 매일 빵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빵 가게와 푸줏간 주인의 이기심 덕분’이라는 애덤 스미스의 잠언(국부론)이 퍼뜩 떠올랐다. 하지만 그보다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 흠씬 밴 인식이었다.
그에게 “당신 말을 인용해도 좋냐”고 물었다. “물론이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의) 핵문제가 시끄럽던데 어떤가? 한때 우리가 (6·25전쟁에) 참전하기도 했는데….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고아들이 슬피 우는 일이 다시금 없기를 빈다.”
고마웠다. 평화를 소망하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굳어버린 내 가슴에도 그의 우정어린 우려와 축복이 내내 남는다. 그러고 보니 다시 6월이다. ― 이스탄불에서
허승호 편집국 부국장 tigera@donga.com
씨네@메일 >
-

어린이 책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트렌드뉴스
-
1
“스페이스X 기대감에 200% 급등”…블룸버그, 한국 증권주 ‘우회 투자’ 부각
-
2
[단독]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 서울 아파트로 제한 검토
-
3
김길리 金-최민정 銀…쇼트트랙 여자 1500m 동반 메달 쾌거
-
4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5
분노한 트럼프, 전세계에 10% 관세 카드 꺼냈다…“즉시 발효”
-
6
길에서 주운 남의 카드로 65만원 결제한 60대 벌금 500만원
-
7
스벅 통입점 건물도 내놨다…하정우, 종로-송파 2채 265억에 판다
-
8
“호랑이 뼈로 사골 끓여 팔려했다”…베트남서 사체 2구 1억에 사들여
-
9
美대법 “의회 넘어선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통상전략 뿌리째 흔들려
-
10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
1
“尹 무죄추정 해야”…장동혁, ‘절윤’ 대신 ‘비호’ 나섰다
-
2
한동훈 “장동혁은 ‘尹 숙주’…못 끊어내면 보수 죽는다”
-
3
尹 “계엄은 구국 결단…국민에 좌절·고난 겪게해 깊이 사과”
-
4
유시민 “李공소취소 모임, 미친 짓”에 친명계 “선 넘지마라”
-
5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6
尹 ‘입틀막’ 카이스트서…李, 졸업생과 하이파이브-셀카
-
7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8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9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10
“윗집 베란다에 생선 주렁주렁”…악취 항의했더니 욕설
트렌드뉴스
-
1
“스페이스X 기대감에 200% 급등”…블룸버그, 한국 증권주 ‘우회 투자’ 부각
-
2
[단독]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 서울 아파트로 제한 검토
-
3
김길리 金-최민정 銀…쇼트트랙 여자 1500m 동반 메달 쾌거
-
4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5
분노한 트럼프, 전세계에 10% 관세 카드 꺼냈다…“즉시 발효”
-
6
길에서 주운 남의 카드로 65만원 결제한 60대 벌금 500만원
-
7
스벅 통입점 건물도 내놨다…하정우, 종로-송파 2채 265억에 판다
-
8
“호랑이 뼈로 사골 끓여 팔려했다”…베트남서 사체 2구 1억에 사들여
-
9
美대법 “의회 넘어선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통상전략 뿌리째 흔들려
-
10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
1
“尹 무죄추정 해야”…장동혁, ‘절윤’ 대신 ‘비호’ 나섰다
-
2
한동훈 “장동혁은 ‘尹 숙주’…못 끊어내면 보수 죽는다”
-
3
尹 “계엄은 구국 결단…국민에 좌절·고난 겪게해 깊이 사과”
-
4
유시민 “李공소취소 모임, 미친 짓”에 친명계 “선 넘지마라”
-
5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6
尹 ‘입틀막’ 카이스트서…李, 졸업생과 하이파이브-셀카
-
7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8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9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10
“윗집 베란다에 생선 주렁주렁”…악취 항의했더니 욕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씨네@메일]'인터뷰'에 대한 찬사와 저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