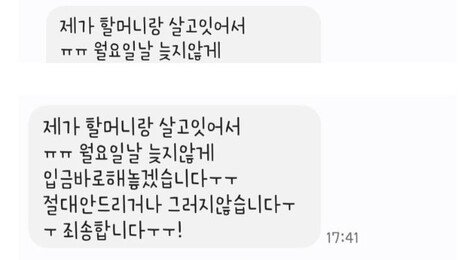공유하기
[시론/류정아]지역축제, 문화 브랜드로 키우자
-
입력 2009년 4월 27일 02시 58분
글자크기 설정

지역만의 소중한 문화인프라
축제 수가 아무리 많아도 자발적 의지에 의한 행사라면 누가 무슨 권리로 줄이고 말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자발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이고, 거기에는 우리의 조급성이 뿌리 깊게 숨어 있다. 축제란 본질적으로 무용한 것이 갖는 역설적 가치로부터 문화적 공감대를 도출해내는 의사소통의 기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유용성과 효율성이라는 계산적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축제는 사라져 버린다.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지낸 축제의 유희성에 대한 갈증을 한꺼번에 풀어내려 했기 때문이리라. 바늘구멍 찾는 수고를 들이기에도 마음이 급해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 바느질하겠다고 서두르다가는 단 한 땀도 뜨지 못하게 될뿐더러 오히려 옷의 솔기를 망가뜨려 최악의 경우 옷을 버려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인력은 물론이고 문화시설 등 문화활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유일하게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은 문화 인프라가 지역축제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50% 정도가 수도권에 살지만 축제의 70%가량이 비수도권에서 개최된다. 축제 소재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아서가 아니라 지방 또는 개별 지역에서 축제로 생기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실감하고 이를 구현하는 일이 장기적 차원의 지역 활성화에 대단히 효율적인 방법임을 절실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축제는 목적과 소재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되고 때로는 복합적인 형태를 띠지만 다음과 같은 효과를 지니므로 지역에 희망의 불씨를 피울 수 있다.
사라져가던 지역 민속과 전통을 복원해 지역민의 자긍심을 회복하고(정선이나 밀양의 아리랑축제, 강릉 단오제, 안동 탈춤페스티벌) 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경제가치는 물론이고 대외이미지를 개선하고(금산 인삼축제, 김제 지평선축제, 제주 마축제, 하동 야생차축제, 울산 옹기축제) 보편적인 소재를 축제로 특화함으로써 지역의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무주 반딧불축제, 함평 나비축제).
단순 여흥 아닌 소통의 장으로
또 예술과 축제를 결합해 고급예술의 대중접근성을 강화하고(과천 한마당축제, 안산 거리극축제, 춘천 마임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 역사적 기원과 사건을 부각시켜 지역민의 뿌리를 재확인함은 물론 문화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며(김해 가야문화축제, 진주 남강유등축제, 송파 한성백제문화제) 도시적 삶에서 젊은 계층의 문화적 욕구를 분출할 기회를 제공해 이들을 사회 속에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다(인천 록페스티벌, 부천 만화축제).
축제는 단순한 일회성 여흥거리가 아니라 무한하게 열린 공감과 이해, 그리고 소통의 공간이자 시간이다. 그 속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의미를 찾고자 할 때 나에게 가치 있는 일로 다가온다. 이것이 모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의 문화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새로운 인식과 관심이 중요하다.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황희연의 스타이야기 >
-

사설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관계의 재발견
구독
트렌드뉴스
-
1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2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3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4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5
폐암 말기 환자가 40년 더 살았다…‘기적의 섬’ 어디?
-
6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쳤다…韓 1041조원 vs 日 1021조원
-
7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
8
수명 연장에 가장 중요한 운동법 찾았다…핵심은 ‘이것’ [바디플랜]
-
9
[단독]“5000만원씩 두 상자…윤영호 ‘王자 노리개 상자’ 권성동에 건네”
-
10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3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4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5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6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7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
8
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쾌유 기원”
-
9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10
[사설]한덕수 구형보다 크게 무거운 23년형… 준엄한 ‘12·3’ 첫 단죄
트렌드뉴스
-
1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2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3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4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5
폐암 말기 환자가 40년 더 살았다…‘기적의 섬’ 어디?
-
6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쳤다…韓 1041조원 vs 日 1021조원
-
7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
8
수명 연장에 가장 중요한 운동법 찾았다…핵심은 ‘이것’ [바디플랜]
-
9
[단독]“5000만원씩 두 상자…윤영호 ‘王자 노리개 상자’ 권성동에 건네”
-
10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3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4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5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6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7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
8
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쾌유 기원”
-
9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10
[사설]한덕수 구형보다 크게 무거운 23년형… 준엄한 ‘12·3’ 첫 단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황희연의 스타이야기]기린을 닮은 여자, 장만옥](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