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횡설수설/홍찬식]KBS 스타일
-
입력 2005년 6월 3일 03시 17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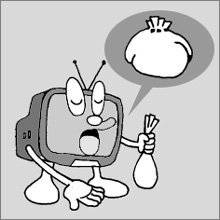
▷BBC와 함께 공영방송의 대명사로 불리는 일본의 NHK는 직원들의 제작비 착복 비리가 터지면서 위상이 흔들렸다. 에비사와 가쓰지 NHK 당시 회장이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NHK에 있어선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사죄했으나 시청자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에비사와 회장이 퇴진하고 올해 처음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했으나 일본인의 수신료 거부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 또한 공교롭게도 두 방송과 같은 시기에 위기를 맞았다. KBS는 지난해 638억 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800억 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된다. 그러나 KBS가 내놓은 경영혁신대책은 BBC와 NHK와는 사뭇 다른 해결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BBC는 방만 경영을 혁신하는 데, NHK는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췄으나 KBS는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했다. 방만 경영에 따른 적자를 국민에게 부담 지우겠다는 무례함만 엿보일 뿐, 경영진의 책임의식이나 시청자에 대한 송구스러움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KBS 스타일’인가.
▷임금 삭감과 인원 감축 등을 같이 내세웠다지만 수신료 인상을 위한 구색 갖추기의 측면이 강하다. 사실 오랜 세월 국민의 신뢰를 구축했던 BBC와 NHK는 끊임없이 공정성 시비를 불러 온 KBS의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KBS가 ‘몸집 줄이기’보다 수신료 인상에 매달리는 것은 아직도 시청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
횡설수설 >
-

현장속으로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정치를 부탁해
구독
트렌드뉴스
-
1
“핵폭탄 11개분 우라늄 제거” 美항공기 100대-2400명 투입하나
-
2
성토 쏟아져도 침묵한 장동혁, 절윤 결의문엔 대변인 짧은 입장만
-
3
‘도쿄의 기적’ 韓, 경우의 수 뚫고 17년만에 WBC 8강
-
4
쇼핑몰 3층서 화분 투척 아찔…웃으며 달아난 범인 정체는?
-
5
‘음주운전’ 배성우, 영화 7년만의 개봉에 고개 숙였다…“다시한번 사과”
-
6
주변 ‘이런 사람’ 있으면 빨리 늙는다…부모·자식이 골칫거리? [노화설계]
-
7
“175명 폭사 이란 초교 인근, 美토마호크 추정 미사일 떨어져”
-
8
한동훈 자객이 장예찬? 부산 북구갑 4자 대결 구도 펼쳐지나[정치를 부탁해]
-
9
미군 유해 송환식서 흰색 야구모자 쓴 트럼프, 부적절 논란
-
10
G마켓, ‘스타배송’ 경쟁력 키운다… 풀필먼트 협력사에 ‘위킵’ 신규 선정
-
1
국힘 공관위, 오세훈 겨냥 “후보 없더라도 공천 기강 세울 것”
-
2
의총서 침묵한 장동혁…‘절윤 결의문’엔 “총의 존중”
-
3
[천광암 칼럼]“尹이 계속했어도 주가 6,000”… 정말 가능했을까
-
4
李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개혁은 안돼”…추미애 법사위 겨냥?
-
5
李 “정유사·주유소 담합과 매점매석, 이익의 몇배로 엄정 제재”
-
6
빗장풀린 주한미군 무기 차출… “통보-협의 절차도 축소할듯”
-
7
성토 쏟아져도 침묵한 장동혁, 절윤 결의문엔 대변인 짧은 입장만
-
8
이란 “최고지도자로 모즈타바 선출”…美와 화해 멀어졌다
-
9
“자식이 부모 모실 필요 없다” 48%…18년만에 두 배로
-
10
마감까지 공천신청 안한 오세훈… 吳측 “중대결단 배제 안해”
트렌드뉴스
-
1
“핵폭탄 11개분 우라늄 제거” 美항공기 100대-2400명 투입하나
-
2
성토 쏟아져도 침묵한 장동혁, 절윤 결의문엔 대변인 짧은 입장만
-
3
‘도쿄의 기적’ 韓, 경우의 수 뚫고 17년만에 WBC 8강
-
4
쇼핑몰 3층서 화분 투척 아찔…웃으며 달아난 범인 정체는?
-
5
‘음주운전’ 배성우, 영화 7년만의 개봉에 고개 숙였다…“다시한번 사과”
-
6
주변 ‘이런 사람’ 있으면 빨리 늙는다…부모·자식이 골칫거리? [노화설계]
-
7
“175명 폭사 이란 초교 인근, 美토마호크 추정 미사일 떨어져”
-
8
한동훈 자객이 장예찬? 부산 북구갑 4자 대결 구도 펼쳐지나[정치를 부탁해]
-
9
미군 유해 송환식서 흰색 야구모자 쓴 트럼프, 부적절 논란
-
10
G마켓, ‘스타배송’ 경쟁력 키운다… 풀필먼트 협력사에 ‘위킵’ 신규 선정
-
1
국힘 공관위, 오세훈 겨냥 “후보 없더라도 공천 기강 세울 것”
-
2
의총서 침묵한 장동혁…‘절윤 결의문’엔 “총의 존중”
-
3
[천광암 칼럼]“尹이 계속했어도 주가 6,000”… 정말 가능했을까
-
4
李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개혁은 안돼”…추미애 법사위 겨냥?
-
5
李 “정유사·주유소 담합과 매점매석, 이익의 몇배로 엄정 제재”
-
6
빗장풀린 주한미군 무기 차출… “통보-협의 절차도 축소할듯”
-
7
성토 쏟아져도 침묵한 장동혁, 절윤 결의문엔 대변인 짧은 입장만
-
8
이란 “최고지도자로 모즈타바 선출”…美와 화해 멀어졌다
-
9
“자식이 부모 모실 필요 없다” 48%…18년만에 두 배로
-
10
마감까지 공천신청 안한 오세훈… 吳측 “중대결단 배제 안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횡설수설/장원재]반도체발 훈풍… 대규모 채용 나선 삼성, SK](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3/09/133495938.2.jpg)
![[머니 컨설팅]다주택자, 집 파는 순서 잘 정해야 세금 아껴](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496018.3.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