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인문사회]보보스
-
입력 2001년 1월 5일 18시 56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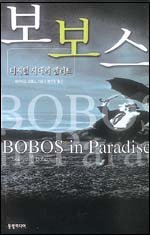
미국 엘리트를 표방하는 워스프(WASP, White Anglo―Saxson Protestant)식의 전통을 박살내고 떠나 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삶아야할 지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때문이다.
그들은 버스에서 내려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벤과 엘레인은 ‘보보’(Bobo)가 되었다. 부르주아와 보헤미안 (Bourgeois & Bohemians)을 합성하여 만들어 낸‘보보’라는 신조어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엘리트를 지칭한다.
이들은 과거의 엘리트에 저항하며 자란 사람들이다. 풍요롭지만 물질주의는 반대한다. 무언가를 팔면서 삶을 영위하지만 자신이 팔리는 것은 거부한다. 본능적으로 반기득권적이지만 자신들이 이미 기득권층이 되었음을 알고 있다. 청바지를 입고 주주총회에 나타나는 빌 게이츠처럼 그들은 대학생 패션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혼합한다.
부르주아의 야망과 합리성, 그리고 보헤미안적 자유와 상상력을 조화시킴으로써 보보들은 정치보다는 문화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사회를 혁신시킨다.
보보들에게 비즈니스는 자신이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삶은 확장된 취미이며 자기 계발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들은 영혼을 부정하고 세태에 순응하는 인간을 경멸하며, 출세와 돈을 위해 고상함과 창의성을 스스로 죽여버린 인간을 답답해 한다.
‘특별나게 모나지도 않지만 지나치게 열정적이지도 않은’ 평균적 조직인간을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조직 인간의 덕목인 효율성보다는 창의성이 생산성의 새로운 열쇠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의 목적은 자기 자신 속에서 최고의 세계를 발견해 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은 평생 직업이 되고 천직이 된다.
그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예술가처럼 일한다.그들에게 일은 영적인 자아와 지적 계발을 이룰 수 있는 일종의 자기 표현방법인 것이다.
그들은 시장과 조직을 하나의 기계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것들을 피이드백 메카니즘과 상호작용, 그리고 변화로 가득 찬 유기체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계의 나사나 톱니바퀴가 아니다. 조직 속에서 일을 하지만 조직의 가치 못지 않게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신감과 적극성으로 무장되어 있다.
그들은 고상한 자기 중심자들이다. 보보들에게 일터란 자극을 받는 곳, 재미있는 곳, 서로를 발견하는 사회적 장소이다. 그 곳에서 그들이 하는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그들은 그 곳에서 논다. 일터는 바로 놀이터인 것이다.
이 책은 여러 면에서 매력적이다. 우선 재치있고 재미있다. 그리고 우리에겐 예언적이다. 설득력도 있지만 또 느끼게도 해준다. 이 책을 보보처럼 보는 방법 한 가지 ― 머리말 앞에 있는 이 책에 대한 칭찬들 몇 개를 대충 본 후 목차로 갈 것,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장 하나를 찍어 읽기 시작할 것, 1장은 제일 나중에 보거나 보지 말 것, 그러나 3장은 꼭 볼 것.
트렌드뉴스
-
1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는 ‘이 방향’이 맞는 이유
-
2
배우 얼굴 가린다고…아기 폭우 맞히며 촬영, ‘학대’ 논란
-
3
“담배 끊으면 60만 원”… 보건소 맞춤형 금연 코칭
-
4
[단독]“구글스토어에 버젓이 ‘피싱 앱’, 2억 날려”… 신종 앱사기 기승
-
5
“中여성 2명 머문뒤 객실 쑥대밭”…日호텔 ‘쓰레기 테러’ [e글e글]
-
6
오천피 시대 승자는 70대 이상 투자자…2030 수익률의 2배
-
7
양주서 60대 흉기 찔려 숨진채 발견…30대 아들 피의자 체포
-
8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9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10
“펄펄 끓는 물을 왜 빙판길에?”…최악의 제설법 [알쓸톡]
-
1
李 “담배처럼 ‘설탕세’ 거둬 공공의료 투자…어떤가요”
-
2
법원 “김건희, 청탁성 사치품으로 치장 급급” 징역 1년8개월
-
3
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
4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5
“中여성 2명 머문뒤 객실 쑥대밭”…日호텔 ‘쓰레기 테러’ [e글e글]
-
6
장동혁 “한동훈에 충분한 시간 주어져…징계 절차 따라 진행”
-
7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
8
‘김어준 처남’ 인태연, 소진공 신임 이사장 선임…5조 예산 집행
-
9
“불법주차 스티커 떼라며 고래고래”…외제차 차주 ‘경비원 갑질’
-
10
국힘, 내일 한동훈 제명 속전속결 태세… 韓 “사이비 민주주의”
트렌드뉴스
-
1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는 ‘이 방향’이 맞는 이유
-
2
배우 얼굴 가린다고…아기 폭우 맞히며 촬영, ‘학대’ 논란
-
3
“담배 끊으면 60만 원”… 보건소 맞춤형 금연 코칭
-
4
[단독]“구글스토어에 버젓이 ‘피싱 앱’, 2억 날려”… 신종 앱사기 기승
-
5
“中여성 2명 머문뒤 객실 쑥대밭”…日호텔 ‘쓰레기 테러’ [e글e글]
-
6
오천피 시대 승자는 70대 이상 투자자…2030 수익률의 2배
-
7
양주서 60대 흉기 찔려 숨진채 발견…30대 아들 피의자 체포
-
8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9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10
“펄펄 끓는 물을 왜 빙판길에?”…최악의 제설법 [알쓸톡]
-
1
李 “담배처럼 ‘설탕세’ 거둬 공공의료 투자…어떤가요”
-
2
법원 “김건희, 청탁성 사치품으로 치장 급급” 징역 1년8개월
-
3
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
4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5
“中여성 2명 머문뒤 객실 쑥대밭”…日호텔 ‘쓰레기 테러’ [e글e글]
-
6
장동혁 “한동훈에 충분한 시간 주어져…징계 절차 따라 진행”
-
7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
8
‘김어준 처남’ 인태연, 소진공 신임 이사장 선임…5조 예산 집행
-
9
“불법주차 스티커 떼라며 고래고래”…외제차 차주 ‘경비원 갑질’
-
10
국힘, 내일 한동훈 제명 속전속결 태세… 韓 “사이비 민주주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레포츠]낚시](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