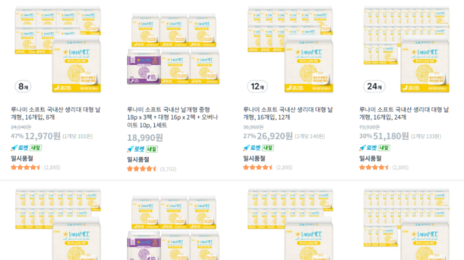공유하기
[교통캠페인/대형차량]과적-난폭운전 『마주치면 겁나』
-
입력 1997년 2월 24일 20시 22분
글자크기 설정
트렌드뉴스
-
1
“얘기 하자하니 ‘감히 의원에게’ 반말” vs “먼저 ‘야 인마’ 도발”
-
2
담배 피우며 배추 절이다 침까지….분노 부른 中공장 결국
-
3
“돈 좀 썼어” 성과급 1억 SK하이닉스 직원 ‘반전 자랑 글’
-
4
“유심칩 녹여 금 191g 얻었다”…온라인 달군 ‘현대판 연금술’
-
5
李 “다주택자 눈물? 마귀에 양심 뺏겼나…청년은 피눈물”
-
6
10㎏ 뺀 빠니보틀 “위고비 끊자 다시 살찌는 중”…과학적 근거는? [건강팩트체크]
-
7
[단독]차 범퍼에 낀 강아지, 학대? 사고?…사건의 진실은
-
8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9
“중국 귀화해 메달 39개 바칠때 ‘먹튀’ 비난한 당신들은 뭘 했나”
-
10
양수 터진 임신부 병원 7곳서 거부…구급차서 출산
-
1
李 “다주택자 눈물? 마귀에 양심 뺏겼나…청년은 피눈물”
-
2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5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李대통령 SNS 글 삭제
-
6
장동혁, 친한계 반발에 “수사결과 韓징계 잘못땐 책임지겠다”
-
7
“얘기 하자하니 ‘감히 의원에게’ 반말” vs “먼저 ‘야 인마’ 도발”
-
8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9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
10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트렌드뉴스
-
1
“얘기 하자하니 ‘감히 의원에게’ 반말” vs “먼저 ‘야 인마’ 도발”
-
2
담배 피우며 배추 절이다 침까지….분노 부른 中공장 결국
-
3
“돈 좀 썼어” 성과급 1억 SK하이닉스 직원 ‘반전 자랑 글’
-
4
“유심칩 녹여 금 191g 얻었다”…온라인 달군 ‘현대판 연금술’
-
5
李 “다주택자 눈물? 마귀에 양심 뺏겼나…청년은 피눈물”
-
6
10㎏ 뺀 빠니보틀 “위고비 끊자 다시 살찌는 중”…과학적 근거는? [건강팩트체크]
-
7
[단독]차 범퍼에 낀 강아지, 학대? 사고?…사건의 진실은
-
8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9
“중국 귀화해 메달 39개 바칠때 ‘먹튀’ 비난한 당신들은 뭘 했나”
-
10
양수 터진 임신부 병원 7곳서 거부…구급차서 출산
-
1
李 “다주택자 눈물? 마귀에 양심 뺏겼나…청년은 피눈물”
-
2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5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李대통령 SNS 글 삭제
-
6
장동혁, 친한계 반발에 “수사결과 韓징계 잘못땐 책임지겠다”
-
7
“얘기 하자하니 ‘감히 의원에게’ 반말” vs “먼저 ‘야 인마’ 도발”
-
8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9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
10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알짜정보]과학](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