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기침이나 재채기 많은 환자 위험… 응급실 환경-병문안 문화도 한몫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메르스 2차 확산/어디까지 번지나]
‘슈퍼 전파자’ 어떻게 생기나
슈퍼 스프레더(spreader·전파자)는 의학계에서 8명 이상을 감염시킨 환자를 부르는 용어다. 평택성모병원에서 38명에게 메르스를 감염시킨 1번 환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에서 34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14번 환자가 슈퍼 전파자로 지목되자 또 다른 슈퍼 전파자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슈퍼 전파자가 아닌 일반 메르스 감염환자는 1명당 평균 0.6∼0.8명을 전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다량의 감염환자를 만드는 슈퍼 전파자의 발생을 막아야만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성백린 연세대 생명과학대 교수는 “면역력이 약한 환자, 특히 천식이 있어 기침이 잦은 환자가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다른 환자에 비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나타나는 증상의 정도는 환자의 평소 건강 상태가 좌우한다는 것.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다른 환자들보다 더 많은 기침과 재채기를 해 바이러스를 잘 퍼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천식이 있을 경우 더욱 위험하다.
슈퍼 전파자가 될 만한 환자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슈퍼 전파자를 만든 의료 환경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슈퍼 전파자가 된 환자들에게서 유별난 특이점을 찾기는 어렵다”며 “전염을 부추긴 국내 응급실 환경이나 병문안 문화가 슈퍼 전파자의 탄생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슈퍼 전파자의 등장을 막고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감염 증상의 시작이 곧 전염의 시작”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보건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시간이지만 감염 뒤 24시간이 지나면 체내 바이러스의 양이 처음 흡입한 바이러스 양의 1000∼1만 배로 늘어난다. 국내 평균 잠복기인 6.5일 동안 체내 바이러스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잠복기가 끝나기 무섭게 다른 감염환자를 만들 준비를 끝마친다는 뜻이다. 정 교수는 “잠복기가 지난 후 감염환자가 기침과 재채기를 하게 되는 것은 메르스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다른 감염환자를 만들기 위해 진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교수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환자와 의심환자를 추적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국내의 열악한 응급실 환경과 과도한 병문안 문화가 개선돼야 바이러스 확산은 물론이고 슈퍼 전파자의 등장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우상 동아사이언스 기자 idol@donga.com
트렌드뉴스
-
1
몸에 좋다던데…부자들이 피하는 ‘건강식’ 5가지
-
2
이동국 세 딸 일본 미녀 변신…“행복했던 삿포로 여행”
-
3
임성근, 폭행 등 전과 6회…“방송 출연 중단하겠다”
-
4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의지, ‘이 사람’이 불씨 지폈다[지금, 이 사람]
-
5
러시아 폭설의 위력…아파트 10층 높이 쌓여 도시 마비
-
6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7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8
롤스로이스 끌고다니던 아파트 주민… 알고보니 ‘1.5조 돈세탁’ 총책이었다
-
9
트럼프 “그린란드 협상 틀 마련”…유럽 8개국에 보복관세 철회
-
10
“정교 유착은 나라 망하는 길… 일부 개신교 ‘이재명 죽여라’ 설교”
-
1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2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3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4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5
[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
6
李 “일부 교회, 설교때 이재명 죽여야 나라 산다고 해”
-
7
李 “정교유착, 나라 망하는길…‘이재명 죽여라’ 설교하는 교회도”
-
8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
9
韓은 참여 선그었는데…트럼프 “알래스카 LNG, 韓日서 자금 확보”
-
10
덴마크 언론 “폭력배 트럼프”… 英국민 67% “美에 보복관세 찬성”
트렌드뉴스
-
1
몸에 좋다던데…부자들이 피하는 ‘건강식’ 5가지
-
2
이동국 세 딸 일본 미녀 변신…“행복했던 삿포로 여행”
-
3
임성근, 폭행 등 전과 6회…“방송 출연 중단하겠다”
-
4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의지, ‘이 사람’이 불씨 지폈다[지금, 이 사람]
-
5
러시아 폭설의 위력…아파트 10층 높이 쌓여 도시 마비
-
6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7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8
롤스로이스 끌고다니던 아파트 주민… 알고보니 ‘1.5조 돈세탁’ 총책이었다
-
9
트럼프 “그린란드 협상 틀 마련”…유럽 8개국에 보복관세 철회
-
10
“정교 유착은 나라 망하는 길… 일부 개신교 ‘이재명 죽여라’ 설교”
-
1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2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3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4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5
[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
6
李 “일부 교회, 설교때 이재명 죽여야 나라 산다고 해”
-
7
李 “정교유착, 나라 망하는길…‘이재명 죽여라’ 설교하는 교회도”
-
8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
9
韓은 참여 선그었는데…트럼프 “알래스카 LNG, 韓日서 자금 확보”
-
10
덴마크 언론 “폭력배 트럼프”… 英국민 67% “美에 보복관세 찬성”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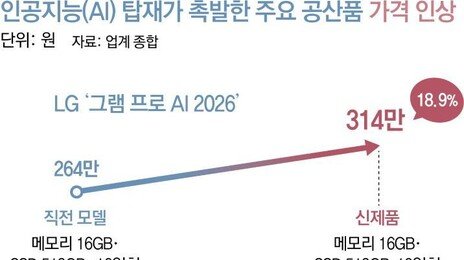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