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문화칼럼]미야지마 히로시/주자학을 다시 생각한다
-
입력 2004년 2월 27일 19시 05분
글자크기 설정

필자는 일본의 대표적인 명청사(明淸史) 연구자인 기시모토 미오(岸本美緖) 도쿄대 교수와 함께 쓴 ‘명청과 이조(李朝)의 시대’에서 중국이나 한국에서 지금도 의미 있는 전통이 형성된 시기가 명청과 조선시대라고 설정하고 두 나라의 전통 형성 과정에서 동아시아적인 연관성을 밝히려 했다.
요즘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나 맹렬한 수험경쟁 등은 모두 조선시대에 형성된 전통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 같은 전통들은 근대에 들어 점차 소멸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층 강하고 깊숙이 한국사회에 침투해 들어왔다.
호주제가 그 전형적인 예다. 오늘날의 호주제는 16세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부계혈연 관념의 강화를 전제로 일제강점기에 확립된 제도다. 부계혈연 집단의 기록인 족보도 많은 한국인이 19세기 이후에야 비로소 갖게 됐다. 따라서 근대는 전통이 해소돼 가는 시대가 아니라 전통이 강화되고 변용되는 시대였다고 하는 게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
이 같은 관점에서 필자는 오늘날 한국이나 동아시아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전통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교, 특히 주자학이 아닐까 생각한다. 인간의 본래적인 평등성을 전제로 하면서 학습의 차이에 의해 인간을 차별화하고 사회질서를 잡으려는 주자학은 적어도 18세기 말까지는 가장 개명되고 합리적인 사상이었고, 그에 입각한 국가 사회체제도 무척 선진적인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 조선시대의 주자학 수용 노력은 당시로서는 세계화였고 가장 진전된 중국 모델의 수용 과정이었다.
그런데 19세기 들어 주자학은 ‘봉건적’인 것,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으로 여겨지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그런 움직임은 미약했다. 오히려 주자학은 내재적으로 극복된 것이 아니라 버려졌다. 그러나 내재적인 극복이 아니었기에, 나의 관점에서는 실제 근대 이후의 동아시아에서 주자학은 뿌리 깊게 살아남았다.
무엇보다 유럽적인 근대국민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 자체가 이상적인 국가체제를 실현하려는 주자학적 사명감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닐까. 다만 목표가 유교의 이상국가인 하, 은, 주의 중국 3대에서 근대 유럽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동아시아에서 보였던 마르크스주의의 성행 역시 주자학적 전통, 주자학적 사고방식과 결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진지하게 수용했던 것이 지식인 그룹이었다는 점이 그러하다.
따라서 주자학의 진짜 극복은 아직 미완의 과제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조선시대에 주자학적 국가체제를 확립해간 과정을, 그것을 주도한 양반들에게 초점을 맞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자학의 극복을 위해서도 주자학적 전통의 형성과정에까지 소급해 그 과정에서 선인들이 치른 노력을 배우면서 선인들이 이루지 못한 과제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21세기 동아시아의 공통된 과제이기 때문이다.
미야지마 히로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한국근세사
문화 칼럼 >
-

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횡설수설
구독
트렌드뉴스
-
1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폭탄…월요일 출근길 비상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5
비트코인, 9개월만에 7만 달러대로…연준 의장 워시 지명 영향
-
6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7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
8
“평생 취미 등산 덕분에 88세 성균관장 도전”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장[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
9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10
“놓지마!” 애원에도…술 취해 어린아들 7층 창문에 매단 아버지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4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5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6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7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8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9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10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트렌드뉴스
-
1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폭탄…월요일 출근길 비상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5
비트코인, 9개월만에 7만 달러대로…연준 의장 워시 지명 영향
-
6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7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
8
“평생 취미 등산 덕분에 88세 성균관장 도전”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장[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
9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10
“놓지마!” 애원에도…술 취해 어린아들 7층 창문에 매단 아버지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4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5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6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7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8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9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10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문화칼럼]신대철/흥행 신화만 남은 ‘실미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4/03/12/691548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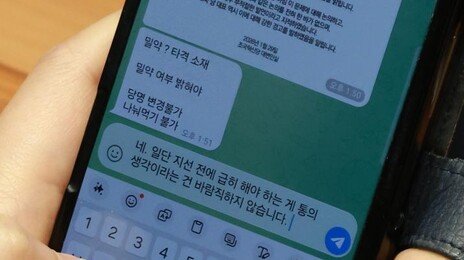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