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액 23년째 5000만 원 [횡설수설/김재영]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6일 21시 3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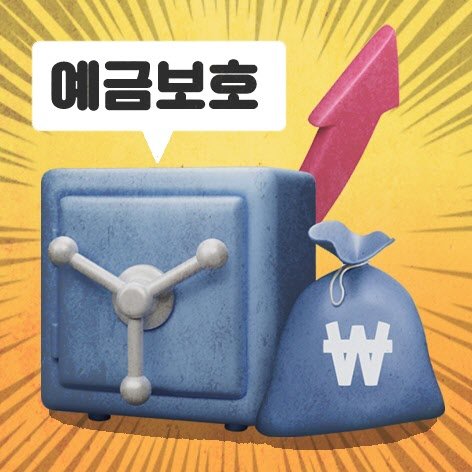
“미국인과 미국 기업은 필요할 때 예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다.”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의 불길이 은행 줄파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데는 이틀 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성명이 큰 역할을 했다. 미국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예금 전액 보증 카드까지 꺼냈다. 유럽까지 불똥이 튄 SVB 파산 쇼크는 여전하지만 초고속 ‘디지털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만큼이나 전격적인 미국의 조치는 인상적이었다.
▷한국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두텁지 않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예·적금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2001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오른 이후 23년째 그대로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001년 대비 2.9배로 커졌으니 말이 동결이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미국은 25만 달러(약 3억3000만 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3000만 원), 일본은 1000만 엔(약 9700만 원)인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낮다.
▷일각에선 한도를 올리면 금융회사가 내는 예금보험료가 올라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도를 높여봐야 소수의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소득·자산과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20년 넘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건 지나치다. 한도는 그대론데 예금만 늘다 보니 유사시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 규모가 1152조7000억 원에 이른다.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으려고 예금을 5000만 원 미만으로 쪼개 여러 은행으로 분산해야 하는 고객들의 불편도 무시할 수 없다.
▷평소 같으면 쉽게 넘어갈 악재도 공포로 번질 수 있는 위기의 시대다. 금융 소비자들이 소문에 동요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은 내 예금은 안전하다는 신뢰다. 국회에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다수 발의돼 있다. 금융당국도 비상사태 발생 시 예금을 전액 보증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경제 규모에 걸맞게 금융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가 된 것 아닌가.
횡설수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광화문에서
구독
-

골든타임의 약탈자들
구독
-

비즈워치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김태희 한남더힐 7년만에 시세차익 85억…127억 매수자는 ‘이사람’
-
2
“대구에 이렇게 눈이 온다고?” 시민들도 놀란 ‘2월 폭설’
-
3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 당해
-
4
[단독]“학업 위해 닷새전 이사왔는데”…‘은마’ 화재에 10대 딸 참변
-
5
주호영 “TK통합 반대 누구냐” vs 송언석 “그만두겠다” 충돌
-
6
주한美사령관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불쾌감
-
7
“다림질 태운 셔츠가 150만원”…하이패션 또 도마
-
8
박신양 “10년간 몸 못 가눠”…허리 수술·갑상선 투병 고백
-
9
대낮 서울 거리서 낫 들고 행인 위협…70대 남성 체포
-
10
“지선앞 징계가 웬말이냐”에…당권파, ‘장동혁 사퇴요구’ 친한계 윤리위 제소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4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5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6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7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8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9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
10
서로 껴안은 두 소년공, 대통령 되어 만났다
트렌드뉴스
-
1
김태희 한남더힐 7년만에 시세차익 85억…127억 매수자는 ‘이사람’
-
2
“대구에 이렇게 눈이 온다고?” 시민들도 놀란 ‘2월 폭설’
-
3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 당해
-
4
[단독]“학업 위해 닷새전 이사왔는데”…‘은마’ 화재에 10대 딸 참변
-
5
주호영 “TK통합 반대 누구냐” vs 송언석 “그만두겠다” 충돌
-
6
주한美사령관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불쾌감
-
7
“다림질 태운 셔츠가 150만원”…하이패션 또 도마
-
8
박신양 “10년간 몸 못 가눠”…허리 수술·갑상선 투병 고백
-
9
대낮 서울 거리서 낫 들고 행인 위협…70대 남성 체포
-
10
“지선앞 징계가 웬말이냐”에…당권파, ‘장동혁 사퇴요구’ 친한계 윤리위 제소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4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5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6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7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8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9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
10
서로 껴안은 두 소년공, 대통령 되어 만났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횡설수설/우경임]“훈식 형 현지 누나” 돌아온 김남국](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2/24/133416421.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