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030 세상/정성은]시를 잊은 그대에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6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독립을 하고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나는 외로움이 뭔지 알게 되었다. 그건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공간에 오래 있다 보면 생기는 것이었다. 가족이 만드는 소리가 그리울 때도 있었다. “그럴 땐 팟캐스트지” 하고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의 권유로 신형철 평론가편을 들어 보기로 했다. 그때 흘러나온 게 김소연 시인의 시였다.
‘잘 지내요. 그래서 슬픔이 말라가요.’ 빨래를 널다 자세를 고쳐 앉아 가만히 듣는다. 슬픔이 말라간다는 건, 슬픔이 옅어진다는 걸까, 더 슬퍼진다는 걸까. ‘내가 하는 말을 나 혼자 듣고 지냅니다. 아 좋다, 같은 말을 내가 하고 나 혼자 듣습니다.’ 상대를 향해 뻗어나가지 못한 말들이 입가에 맴돌던 날들이었다. ‘잘 지내는 걸까 궁금한 사람 하나 없이.’ 혼자인 시절이었다. 시는 불친절한 것인 줄 알았는데, 성긴 틈 사이로 곁을 내주는 장르였다. 시는, 나를 궁금히 여겨 주었다.
그는 사랑하기 쉽지 않은 상대였다. 의중을 알 수 없었고, 숨기는 것에 능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유독 친밀해지는 순간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소리 내 불러줄 때’였다.
아, 이 낯설고 간지러운 느낌이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했다. 쑥스러워서 그런가. 그런데 그 기분이 나쁘지 않다. 시끄러운 북카페였다. 하지만 조용히 혼자서 시를 낭독하는 순간, 주변의 공기는 달라졌다. “거칠게 말하면 연기? 내 안에 숨어 있던 연기 본능을 깨울 수 있어요. 또 다른 자아가 되는 기분이랄까.” 최근 낭독의 즐거움에 빠져 밤마다 심보선의 시를 읽는다는 친구는 말했다. “아직 남 앞에서는 못 하겠는데, 혼자 있을 때 눈치 안 보고 막 하니까 재미도 있고, 연기하듯 상황에 심취해 읽으니 시가 더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시가 어렵다면 낭독을 권한다.
가을엔 시를 읽자. 당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를 한번 골라 보자.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도시를 사랑하게 된 날이 있었다’(서효인, ‘여수’). 눈 딱 감고 전하자, 남편들아. ‘나는 아이가 없다. 아이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심보선, ‘축복은 무엇일까’). 아이 사진 그만 올리라고 화내지 말고 오늘은 이 시를 보내자, 미혼의 친구들아. ‘어때요 당신이 나의 남자인 것처럼 어제는’(유진목, ‘어제’). 내가 이런 시 가르쳐 줬다고 밤에 자꾸 연락하지 말고. ‘미련이 많은 사람은 어떤 계절을 남보다 조금 더 오래 산다’(오은, ‘계절감’). 우리 이 짧은 가을, 오래 누리자.
정성은 프리랜서 VJ
2030세상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글로벌 포커스
구독
-

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구독
트렌드뉴스
-
1
[단독]폴란드, 韓 해군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 무상 양도 안받기로
-
2
‘노인 냄새’ 씻으면 없어질까?…“목욕보다 식단이 더 중요”[노화설계]
-
3
李 “나와 애들 추억묻은 애착인형 같은 집…돈 때문에 판 것 아냐”
-
4
李대통령 “큰 거 온다…2월 28일 커밍순”, 뭐길래?
-
5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6
4급 ‘마스가 과장’, 단숨에 2급 국장 파격 직행…“李대통령 OK”
-
7
최현석 레스토랑 “노출 의상 자제해달라”…얼마나 심했길래
-
8
신동 “부모와 연락 끊어…항상 큰돈 원하고 투자 실패”
-
9
[사설]2년 만에 꺾인 강남·용산 집값… 아직 갈 길 멀다
-
10
국힘서 멀어진 PK…민주 42% 국힘 25%, 지지율 격차 6년만에 최대
-
1
李 “나와 애들 추억묻은 애착인형 같은 집…돈 때문에 판 것 아냐”
-
2
국힘서 멀어진 PK…민주 42% 국힘 25%, 지지율 격차 6년만에 최대
-
3
‘똘똘한 한채’ 겨냥한 李…“투기용 1주택자, 매각이 낫게 만들것”
-
4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5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개혁 반발 고조
-
6
“정원오, 쓰레기 처리업체 후원 받고 357억 수의계약”
-
7
대구 찾은 한동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설것” 재보선 출마 시사
-
8
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 중도층서 9%로 역대 최저
-
9
오늘 6시 이준석·전한길 토론…全측 “5시간 전에 경찰 출석해야”
-
10
‘4심제’ 재판소원법 與주도 국회 통과…헌재가 대법판결 번복 가능
트렌드뉴스
-
1
[단독]폴란드, 韓 해군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 무상 양도 안받기로
-
2
‘노인 냄새’ 씻으면 없어질까?…“목욕보다 식단이 더 중요”[노화설계]
-
3
李 “나와 애들 추억묻은 애착인형 같은 집…돈 때문에 판 것 아냐”
-
4
李대통령 “큰 거 온다…2월 28일 커밍순”, 뭐길래?
-
5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6
4급 ‘마스가 과장’, 단숨에 2급 국장 파격 직행…“李대통령 OK”
-
7
최현석 레스토랑 “노출 의상 자제해달라”…얼마나 심했길래
-
8
신동 “부모와 연락 끊어…항상 큰돈 원하고 투자 실패”
-
9
[사설]2년 만에 꺾인 강남·용산 집값… 아직 갈 길 멀다
-
10
국힘서 멀어진 PK…민주 42% 국힘 25%, 지지율 격차 6년만에 최대
-
1
李 “나와 애들 추억묻은 애착인형 같은 집…돈 때문에 판 것 아냐”
-
2
국힘서 멀어진 PK…민주 42% 국힘 25%, 지지율 격차 6년만에 최대
-
3
‘똘똘한 한채’ 겨냥한 李…“투기용 1주택자, 매각이 낫게 만들것”
-
4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5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개혁 반발 고조
-
6
“정원오, 쓰레기 처리업체 후원 받고 357억 수의계약”
-
7
대구 찾은 한동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설것” 재보선 출마 시사
-
8
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 중도층서 9%로 역대 최저
-
9
오늘 6시 이준석·전한길 토론…全측 “5시간 전에 경찰 출석해야”
-
10
‘4심제’ 재판소원법 與주도 국회 통과…헌재가 대법판결 번복 가능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2030 세상/원지수]대한민국 블로거 만세](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7/09/13/8629819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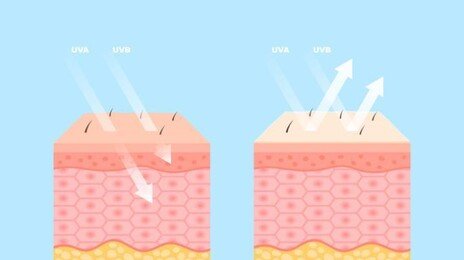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