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동아광장/박경미]통일세보다 중요한 ‘탈북자에게 열린사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5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금옥 금철 철진 철성 광혁 금혁…. 탈북자에게 흔한 이름이다. 북한 이름에서는 광물인 ‘철’ ‘광’ ‘금’ ‘옥’과 혁명적인 분위기를 내기 위한 ‘혁’이 자주 사용된다. 탈북자 중에는 이런 북한식 이름 때문에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한국에 도착하면 개명(改名)부터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들은 북한 출신이라는 주홍글씨를 숨기려 한다. 하지만 예전에는 미그기를 몰고 넘어온 귀순용사가 국가적인 영웅 대접을 받기도 했다. 1980년대까지의 귀순용사와 1990년대 이후의 탈북자, ‘귀순’과 ‘탈북’이라는 단어의 어감 차이만큼이나 그들은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탈북자에 대한 공식 용어는 ‘북한이탈 주민’이다. ‘탈북자’와 ‘북한이탈 주민’이라는 용어에 들어 있는 ‘탈’은 정상궤도에서 벗어나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이방인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준다. 한때는 ‘새터민’이 사용되기도 했다. ‘탈북자’를 대체하기 위한 공모에 당선된 말이다. 새터민은 탈북자보다 어감이 좋다고 느껴지지만 탈북자 내부의 강한 반발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그 대상에 대한 관념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탈북자에 대한 순화된 호칭을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탈’이라는 음절을 지워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학생들 중도탈락 비율 높아
1990년대 식량 난민에서 시작된 탈북자는 2000년대 들면서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6세에서 20세 사이의 탈북 청소년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0년 4월 기준으로 탈북 청소년은 1711명이다. 이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탈북자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의 하나둘학교를 거쳐 탈북 학생 특성화학교나 일반학교에 다닌다. 적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안학교를 선택하기도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통일세를 부과해 통일에 필요한 비용을 점진적으로 마련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북자를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사실 탈북자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정착금과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원받아 경제적으로 후한 처우를 받고,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도 비교적 수월하게 진학한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보다 그들에게 더 절실한 것은 탈북자를 우리 사회의 생산적 기여자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다. 얼마 전 교육과학기술부는 독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 교육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정규수업이나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 ‘독도 계기수업’을 활성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탈북자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탈북자에 대한 내용을 더 강조하고 계기수업을 통해 명시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나눔과 배려로 응어리 풀어줘야
탈북 학생과 관련된 정부 부처는 통일부, 교과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이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탈북자 정착 지원을 총괄하고 교과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탈북 학생 적응지원 활동에 중점을 두는 식으로 업무를 차별화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부처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원활히 공유되지 못함으로써 사업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이 부서들을 총괄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탈북자는 결핍 상태에 있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남한이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려는 ‘새터민’이고, 남북한 통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통일 일꾼’이기도 하다. 탈북자들은 이질적인 배경 속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우리와 비교해 다소간의 ‘다름’이 있을 뿐, 함께 나아가야 할 소중한 파트너인 것이다. 요즘의 화두인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싶다면 탈북 학생에게 손을 뻗어 멘터-멘티 관계를 맺고, 탈북 과정에서 겪었을 온갖 고난과 악몽의 응어리를 녹여줄 따뜻한 마음을 보내봄이 어떨까. 통일세가 통일에 대한 재정적 대비라면 탈북자를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통일에 대한 심리적 대비라고 할 수 있다.
박경미 객원논설위원·홍익대교수·수학교육 kpark@hongik.ac.kr
동아광장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의 운세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알쓸톡
구독
트렌드뉴스
-
1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
-
2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3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4
폐암 말기 환자가 40년 더 살았다…‘기적의 섬’ 어디?
-
5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6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쳤다…韓 1041조원 vs 日 1021조원
-
7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8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9
‘할머니 김장 조끼’에 꽂힌 발렌티노…630만원 명품 출시 [트렌디깅]
-
10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3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4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5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6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7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8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9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10
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쾌유 기원”
트렌드뉴스
-
1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
-
2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3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4
폐암 말기 환자가 40년 더 살았다…‘기적의 섬’ 어디?
-
5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6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쳤다…韓 1041조원 vs 日 1021조원
-
7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8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9
‘할머니 김장 조끼’에 꽂힌 발렌티노…630만원 명품 출시 [트렌디깅]
-
10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3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4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5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6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7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8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9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10
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쾌유 기원”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동아광장/정원수]‘9.99 대통령’과 너무 다른 ‘與 검찰개혁 조급증’](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22/133214587.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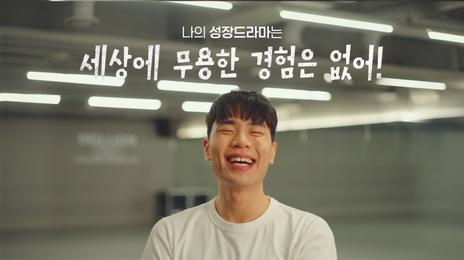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