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사회/수전 프라인켈 지음·김승진 옮김/440쪽·1만5000원·을유문화사


이 책은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덟 가지 물건들을 통해 플라스틱의 역사와 문화, 경제, 과학, 정치를 살펴본다. 머리빗으로 플라스틱이 가져온 소비의 대중화를 분석하고, 라이터로 플라스틱이 낳은 ‘버리는 문화’를 고찰하며 비닐봉지를 통해 플라스틱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들여다본다.
가볍고 튼튼한 플라스틱은 신속히 현대인들의 삶을 파고들었다. 플라스틱에서 파생된 문제들도 시나브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옥죄어 들어왔다. 한 세기 전 미국 하와이 섬의 라이산 앨버트로스에게 가장 큰 위협은 깃털을 노린 사냥꾼이었지만 지금의 최대 위협은 플라스틱이다. 어미가 바다에서 삼킨 오징어와 날치알을 토해 새끼에게 먹이는 이 새는 매년 태어나는 50만 마리 중 20만 마리가 플라스틱 조각으로 위장이 꽉 차서 죽는다. 새의 배를 가르면 병뚜껑, 펜 뚜껑, 라이터는 예사이고 심지어 60여 년 전 9600km 떨어진 곳에서 격추된 해군 폭격기의 부산물도 발견된다.
여러 장에 걸쳐 지적하는, 플라스틱이 야기하는 문제들은 이미 새롭지 않다. 플라스틱 장난감의 유해물질 검출, 플라스틱제 병원 장비들의 호르몬 교란 등은 이미 숱하게 다뤄져온 주제들이다. 전 세계 장난감의 80%가 제조된다는 중국의 주강 삼각주와 광둥 성 공장 노동자들의 작업 여건, 비닐봉지를 대체한 종이봉지도 실상 쓰레기나 다름없어 환경 보호에 무익하다는 내용도 놀랍지 않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쓰자는 것인가, 말자는 것인가’라며 책장을 넘긴 독자라면 실망할 수도 있다. 결론을 요약하자면 ‘불멸의 플라스틱, 제대로 알고 써서 줄이자’ 정도가 될 것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인문사회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과 내일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인터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강북 84㎡ 아파트 전세 3억→4.5억… 서울 고점의 76%까지 뛰어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외모 신경 쓰다가 망했다”…中육상스타 10등에 팬들 실망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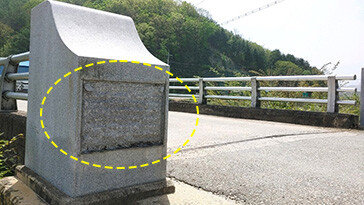
“다리 이름 어디갔지?”…구릿값 치솟자 ‘교명판’ 절도 기승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책의 향기]“콩나물 팍팍 무쳤냐”… 국민 울고 웃긴 예능史](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8/02/10/88603498.1.jpg)
![[책의 향기]오랜 헌신이 고통으로… 가족 간병 사회의 비극](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8/02/10/88603452.1.jpg)
![[책의 향기]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결심했다, 용서하기로](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8/02/10/88603427.2.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