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인문사회]향신료가 정력제? 욕망 덩어리의 역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4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스파이스-향신료에 매혹된 사람들이 만든 욕망의 역사/잭 터너 지음·정서진 옮김
592쪽·2만5000원·따비

“그곳은 기쁨으로 가득한 과수원이다. 스파이스의 온갖 달콤한 향이 그득한.”
1325년경 노섬브리아에서 쓰인 시 ‘세상의 운행’에 묘사된 파라다이스(낙원)의 모습이다. 스파이스(spice)는 향신료(독특한 향과 매운맛을 내는 식재료)나 향료(향수나 종교의식에 사용하는 향의 원료)로 번역된다. 그런데 인간이 꿈꾸는 파라다이스에 가득한 게 고작 후추, 클로브(정향), 시나몬 따위였다고?
지금이야 스파이스가 널리고 널렸지만 고대부터 18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스파이스는 희귀하고 값비싼, 인간의 욕망덩어리였다. 신대륙 발견의 촉매제이자 세계 재편의 계기가 된 것도 스파이스였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바스쿠 다 가마,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거친 바다를 무릅쓰고 탐험에 나섰던 큰 이유도 향신료 산지를 찾기 위해서였다. 16, 17세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영국과 네덜란드가 아시아를 놓고 다툰 전쟁은 ‘향신료 전쟁’으로 불린다. 이들은 향신료를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로 향했던 것이다.
스파이스의 원산지는 주로 아시아이며, 향신료 무역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유럽인에게 스파이스는 희귀한, 즉 가치 있고 비싼 것이었고 머나먼 이국에의 열망까지 불러일으켰다. 음식을 먹는 목적이 주로 영양공급에만 있던 시절 향신료는 허영을 나타내는 사치품으로 취급됐다. 고대 로마의 키케로는 “최고의 향신료는 허기”라며 향신료로 입맛을 돋우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향신료의 짜릿한 자극은 사람들의 입맛과 과시욕을 사로잡았다.
향신료는 치료제와 최음제로도 인기였다. 11세기 아프리카 북부 카르타고 출신인 콘스탄티누스의 치료법에는 늘 향신료가 등장했다. 그는 발기부전에는 생강, 후추, 갈랑갈, 시나몬과 여러 허브로 만든 미약을 점심과 저녁 식사 이후 조금씩 복용하라고 권장했다. 아침 발기에는 우유에 담근 클로브를 추천했다. 그러나 저자는 향신료에 생리학적으로 정력 증진 효과가 있다기보다 인간의 믿음에 따른 일종의 위약효과를 낸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인문사회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한규섭 칼럼
구독
-

이헌재의 인생홈런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트렌드뉴스
-
1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
2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3
의사 면허 취소된 50대, 분식집 운영하다 극단적 선택
-
4
[한규섭 칼럼]왜 여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가
-
5
부부 합쳐 6차례 암 극복…“내 몸의 작은 신호 잘 살피세요”
-
6
[단독]“尹 은혜 갚으라며 국힘 입당 지시” 신천지 前간부 진술
-
7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8
단순 잇몸 염증인 줄 알았는데…8주 지나도 안 낫는다면
-
9
李 “그걸 혼자 꿀꺽 삼키면 어떡합니까”…조현 외교장관 질책 왜?
-
10
마크롱이 거슬리는 트럼프 “佛 와인에 200% 관세 부과할 것”
-
1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2
李대통령 “생리대 고급화하며 바가지…기본 제품 무상공급 검토”
-
3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4
강선우, 의혹 22일만에 경찰 출석…“원칙 지키는 삶 살았다”
-
5
송언석 “장동혁 단식 중단해야”…정청래 “단식 말고 석고대죄를”
-
6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
7
[속보]李대통령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8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
9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10
천하람 “이혜훈 비망록에 ‘주님, 제 히스테리 고쳐주세요’ 적혀있어”
트렌드뉴스
-
1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
2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3
의사 면허 취소된 50대, 분식집 운영하다 극단적 선택
-
4
[한규섭 칼럼]왜 여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가
-
5
부부 합쳐 6차례 암 극복…“내 몸의 작은 신호 잘 살피세요”
-
6
[단독]“尹 은혜 갚으라며 국힘 입당 지시” 신천지 前간부 진술
-
7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8
단순 잇몸 염증인 줄 알았는데…8주 지나도 안 낫는다면
-
9
李 “그걸 혼자 꿀꺽 삼키면 어떡합니까”…조현 외교장관 질책 왜?
-
10
마크롱이 거슬리는 트럼프 “佛 와인에 200% 관세 부과할 것”
-
1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2
李대통령 “생리대 고급화하며 바가지…기본 제품 무상공급 검토”
-
3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4
강선우, 의혹 22일만에 경찰 출석…“원칙 지키는 삶 살았다”
-
5
송언석 “장동혁 단식 중단해야”…정청래 “단식 말고 석고대죄를”
-
6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
7
[속보]李대통령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8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
9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10
천하람 “이혜훈 비망록에 ‘주님, 제 히스테리 고쳐주세요’ 적혀있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콩나물 팍팍 무쳤냐”… 국민 울고 웃긴 예능史](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2/10/8860349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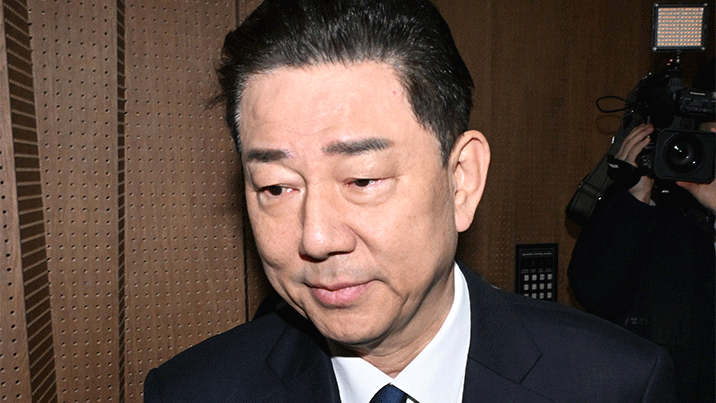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