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퍼포먼스 ‘모두를 위한 피자’연출★★★★ 연기★★★☆ 무대★★★☆

미지의 대상은 엄격히 통제되는 사회 체제 때문에 옆집 사는 이웃에게도 베일에 싸여 있는, 북한 주민의 사적인 일상이다. 컴컴한 무대에 대형 스크린, 그 앞에 의자 다섯 개가 놓여 있다. 자못 분위기가 엄숙하다. 하지만 스크린에 영상 제목이 뜨는 순간 무거움은 휘발한다. 조악한 폰트의 제목은 ‘삐쟈 만들기’.
“평양에 드디어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곳에서 피자를 먹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 봅시다.” 평양 말투의 젊은 남녀가 피자 조리법을 알려준다. ‘피망을 구하기 힘들면 고추로 대신 하라’ ‘치즈 대신 두부를 사용해도 된다’ 같은 팁도 곁들인다. 자신들이 만든 피자에 결국 고추장을 듬뿍 얹어 먹는 장면에선 관객의 폭소가 터졌다.
그 제작과정을 담은 2부의 다큐멘터리에서 공연의 전체 모습이 드러난다. 동영상은 영국 왕립예술학교에서 크리티컬 디자인(비평적 디자인)을 전공한 김황 씨(31)의 졸업 작품이다. 김정일의 지시로 2008년 12월 평양에 문을 연 첫 피자 레스토랑 소식에 영감을 얻어 일부러 아마추어 작품처럼 보이도록 제작했다. 오디션으로 뽑은 배우들로 한국에서 촬영했다. 평양 말투는 탈북 주민들이 전수했다.
김 씨는 이렇게 제작한 동영상을 비디오 CD 500개에 담아 북한과 중국의 밀수망을 통해 북한 암시장에 유통시켰다. 김 씨는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영상을 담은) 유튜브는 북한 주민들이 유일하게 접하지 못하는 영상이다. 이웃집 사람이 제작한 동영상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북한 주민들은 이 동영상을 보고 반응을 보내왔다. 3부에서 출연 배우 2명을 포함해 5명이 의자에 앉아 북한 주민의 ‘진짜’ 편지들을 읽어 내려간다. 자신을 22세 김일성대 재학생으로 소개하는 한 여성은 “(피자로 만든) 공화국 국기를 잘라 먹는 장면에선 속이 상했다. 인경 동무(여주인공)는 평양 말을 참 잘한다. 통일이 돼 김일성대를 다니고 싶으면 내가 뇌물이라도 써서 넣어주겠다” 등의 소감을 전한다.
공연이 끝나고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도 실은 소통을 확장해 가는 이 프로젝트의 일부다. 남한사회의 통념과 동떨어진 북한주민들의 반응은 남한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수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과정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오만과 편견’도 씻겨 나갔다.
김 씨는 공연 마지막에 “곧 2탄이 나온다”고 말했다. 2탄엔 분명 우리의 모습들이 담길 것이다. 북한사회의 개개인에 대해 무관심했지만 이날 공연을 통해 비로소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한 관객의 모습 말이다. 이렇게 단절됐던 지점에서 소통은 다시 시작됐다.
김성규 기자 kimsk@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김하성, 4경기 만에 안타…샌디에이고 3연패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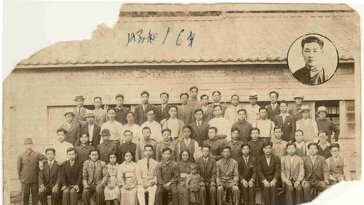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징용, 日지자체도 인정”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호중, ‘음주 뺑소니’ 35일만에 피해자와 합의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