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땅이 바로 한계농지다. 한계농지는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농작물 재배가 더 이상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최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 어젠다(DDA) 농업협상 등을 통해 시장개방은 더욱 가속화될 조짐이다. 현재 한계농지는 전국적으로 20여만㏊에 이르며,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약 50만㏊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계농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농사직불제, 전작보상제, 비교우위를 지닌 다양한 작목 개발 등 다각도의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최근에는 골프장, 전원주택 등 타용도 전용을 허락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경우 자연 훼손이나 난개발 등 사회문제가 대두될 뿐 아니라 대도시에 인접한 극히 제한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별 실효성이 없기도 하다.
필자는 또 다른 대안으로 영국 등 선진 산업국에서 적극 추진 중인 ‘농지 조림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상 지역은 농작물 재배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사가 급한 지역이다. 이러한 곳은 나무가 자라기에는 매우 좋은 조건으로 산에 심는 것에 비해 훨씬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대상지로는 예상 농지 50만㏊ 중 대체작물 재배가 가능하거나 타용도 전용이 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도 어림잡아 절반은 될 것이다.
농지에 조림을 하면 우선 목재류 수입으로 나가는 막대한 외화를 절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16억달러를 들여 2740만㎥ 내외의 목재류를 수입하고 있는데 25만㏊의 한계농지에 수익성이 큰 나무를 심을 경우 연간 약 400만㎥(총 목재 수입량의 15%)의 목재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탄소배출권 확보로 장차 국가가 부담해야 할 환경부담금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탄소배출권이란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교토의정서’가 정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이산화탄소를 초과 배출하려면 남의 배출권을 사든지 산소를 배출하는 조림지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쾌적한 환경조성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농지조림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지 이용과 관련된 법령 정비, 제도 개선과 함께 어떤 나무를 어디에 어떻게 심을 것인가와 같은 기술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소재 지주 중 직접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밤나무와 같은 유실수나 근래 시장 규모가 급신장하고 있는 헛개나무, 복분자딸기와 같은 기능성 생산 수종이 적합할 것이다. 반면 부재 지주나 경영 능력이 부족한 지주는 비교적 손이 덜 가고 대리경영이 가능한 백합나무 등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수종이 적합하다.
인류는 문명 발달 과정에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숲을 개간해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는 퇴경환림(退耕還林), 즉 방치되고 있는 농지에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드는 일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임무가 아닐까.
최완용 산림청 임업연구원 산림유전자원부장
여론마당
구독-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밑줄 긋기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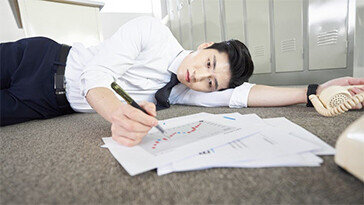
-

현대전의 창과 방패 ‘전파 공격’…드론·항공기 납치도 가능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출산율 꼴찌 한국이 외롭지 않은 이유(feat.피크아웃)[딥다이브]](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25225389.1.thumb.jpg)
출산율 꼴찌 한국이 외롭지 않은 이유(feat.피크아웃)[딥다이브]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론마당]황상익/사회 외면하는 과학은 안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