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擇可勞는 백성들이 스스로의 건전한 욕구와 관련이 있어서 수고와 노동을 감내하겠다고 나서는 일을 선택한다는 뜻이다. 정약용은 흥리어환(興利禦患·이익을 일으키고 환란을 막음)의 일을 말한다고 풀이하였다. 농경에 필요한 보와 저수지 수축, 도로와 교량의 건설이나 하천의 준설, 공동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산림 개발과 어장의 확보, 외침에 대비한 군사훈련과 방어진지 구축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誰怨은 ‘누가 원망하겠는가’로도, ‘누구를 원망하겠는가’로도 풀이할 수 있다. 誰를 주어로 볼 수도 있고, 의문문에서 목적어인 의문사가 앞으로 나왔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 전기의 金守溫은 文義縣(문의현) 民和樓(민화루)의 축성을 기념하는 글에서, ‘누정은 없어도 되지만 백성은 없어서는 안 되고, 누대는 낮아도 되지만 백성들은 수고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이 누대만은 安民(백성을 안정시킴)과 富民(백성들을 부유하게 함)을 이룬 뒤 백성의 뜻에 따라 지은 것이어서 民和(백성들과 화합함)의 상징이라고 칭송했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곧 결정…각종 명령 철회 검토 중”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법 “회원제서 대중제 전환 골프장, 할인약정 승계 안돼”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동현 “코인 투자로 한남더힐 날렸다…이제야 본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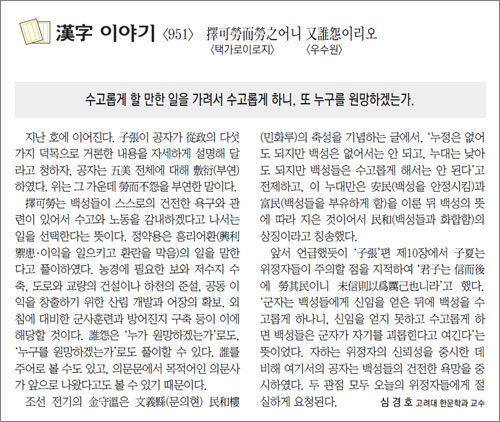
![[한자 이야기]蓋歸하여 反류而掩之하니 掩之가 誠是也면…](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