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는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어서 위가 4개다. 첫 번째 위는 ‘혹위’ ‘반추위’, 두 번째는 ‘벌집위’, 세 번째는 ‘천엽(千葉)’ ‘처녑’ ‘겹주름위’ ‘중판위’, 네 번째 위는 ‘추위’ ‘주름위’라고 한다. 보통 익히지 않고 날로 기름장에 찍어 먹는 처녑, 천엽 등 익숙한 낱말도 있지만 대부분 생소하다. 그런데 가만, 정작 입길에 자주 오르는 ‘막창’은 보이지 않는다.
많은 이가 막창을 ‘마지막 창자’라고 생각해 ‘소의 대장’으로 알지만 막창은 ‘소의 네 번째 위’다. ‘홍창’이라고도 한다.
아 참, 대구 사람들이 즐겨 먹는 ‘돼지 막창’은 엄밀히 말하면 ‘돼지 밥통’으로 불러야 한다. 돼지는 위가 하나뿐이니.
곱창은 소의 작은창자(小腸)를 말한다. 북한에서는 ‘곱밸’ ‘곱창’ 둘 다 쓴다. 곱창의 ‘창’이 중국어 ‘장(腸)’에서 왔고 곱밸의 ‘밸’은 창자를 뜻하므로 둘의 의미는 같다. 비위에 거슬려 아니꼬울 때 흔히들 쓰는 ‘밸(배알)이 꼴리다’의 밸이 바로 그것. 밸은 속어로 남아 있는 고유어다.
소의 작은창자가 꼬불꼬불하다 보니 곱창을 ‘굽은 창자’ ‘곱은창자’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곱은창자가 줄어들어 곱창이 된 것으로 본 것. 과연 그럴까. 소의 큰창자(大腸) 역시 꼬불꼬불하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 사전은 ‘곱은창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양껏 드세요’ ‘양에 차다’라고 할 때의 양은 어떻게 표기할까. 위가 꽉 차도록 많이 먹으라는 뜻이므로 ‘위(胃)’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한자어 양(量)에 밀려났다. 사람의 배를 채우면서 소 위인 양을 쓴다는 게 마뜩잖아 그런 건 아닐까.
손진호 어문기자 songbak@donga.com
손진호 어문기자의 말글 나들이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밑줄 긋기
구독
-

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구독
-

글로벌 포커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셀프건강진단]얼마 전부터 구강 안쪽이나 목에 혹이 만져진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24673135.1.thumb.jp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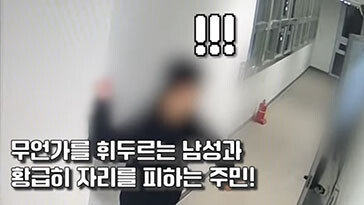
흉기로 이웃 위협한 男…‘나무젓가락’이라 발뺌하다 덜미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외식 겁나는 ‘가정의 달’… 피자-햄버거값도 줄인상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손진호 어문기자의 말글 나들이]식혜와 식해](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6/05/31/78407381.2.jpg)
![[손진호 어문기자의 말글 나들이]막창과 곱창](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6/05/24/78280691.1.jpg)
![[손진호 어문기자의 말글 나들이]염치 불고하고](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6/05/17/78131757.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