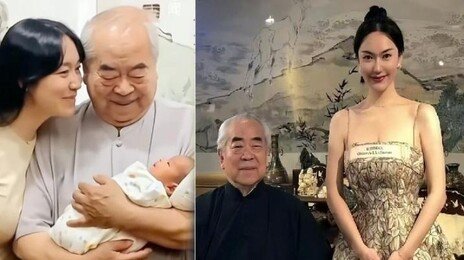공유하기
[안경환교수의 법과 영화사이]리버티 발란스를 쏜 사나이
-
입력 2000년 7월 27일 21시 04분
글자크기 설정
감독: John Ford,
출연: John Wayne, James Stewart, Lee Marvin, Vera Miles▼
서부는 사나이의 영원한 고향이다. 광야, 총, 기병대, 인디언, 역마차, 지평선, 그리고 아쉬움 접어 뒤에 두고 떠나는 여인. 스크린으로 옮긴 서부는 전쟁을 숭배하던 시대, 세계의 사내들을 사로잡았던 환각제였다. 사나이도 광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밋밋한 시대에 서부영화는 흘러간 세월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 존 포드감독은 서부영화의 대부이다. 《역마차, Stagecoach, 1939), 《황야의 결투, My Darling Clementine (1946)》등 한 시대를 주름잡은 그의 서부극은 이 세상 모든 사내아이의 꿈을 사로잡는 건전한 환각제였다. 포드의 만년작《리버티 발란스를 쏜 사나이》(1962)는 서부의 영웅에 대한 아쉬운 고별장이다. 앞선 서부 명화들이 문명화되지 않는 사회에서 영웅적인 무법자들의 미덕과 이상을 부각시켰다면 이 작품은 무법자 영웅에 대한 장엄한 사망선고이다.
스토리는 싱거울 정도로 단순하다. 은발의 상원의원 랜섬 스토다드는 아내를 대동하고 신본(Shin Bone)이라는 기이한 이름의 작은 기차역에 내린다. 자신이 법률가로서 첫 번째 ‘정강이뼈’를 내딛었던 마을이다. 놀란 지방신문이 연유를 캐묻는다. “순수한 사적 용무”이기 때문에 취재를 거부하는 그에게 “언론은 공인의 행적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I have a right to story)"라고 주장한다. 이 말에 동의하여 상원의원은 인터뷰에 응하여 카우보이 톰 포니온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말문을 연다. 톰은 가족도, 돈도, 심지어는 총 한 자루도 남기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정부 돈으로 약식 장례를 치를 판이다. 영화의 대부분은 그의 플래시백을 통해 이 마을의 초기 역사와 전설이 전해진다. 동부에서 법대를 졸업한 청년 스토다드가 미개척의 땅에서 법률가로서의 이상을 펴기 위해 역마차를 타고 신본마을로 오는 노상에서 무법자 리버티 발란스 일행에게 무자비하게 유린당한다. 법과 질서를 주장하는 백면서생에게 발란스는 “서부의 법”을 가르쳐 준다. 스토다드는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애지중지하는 법서(法書)마저 찢기는 수모를 당한 후 내동댕이쳐진다.
“젊은이여 서부로 가라!” (Go West, Young Man!) 무법과 미개의 땅에 문명과 질서, 법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 그것은 한 때 많은 미국의 젊은 이상주의자들이 꾸던 꿈이자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에 가로놓인 거대한 대륙에 걸쳐 문명사회를 건설한다는 젊은 나라 미합중국의 공식적인 슬로건이기도 했다. 스토다드가 겪는 수모는 마크 트웨인의 만년 수작 《바보 윌슨씨의 비극》(The Tragedy of Pudd'nhead Wilson, 1894)의 주인공의 경험을 연상시킨다. 동부의 명문법대 졸업생 윌슨이 미주리의 작은 마을에 도착하는 바로 그 날, 낯선 사람을 보고 짖어대는 개를 두고 던진 수준 높은 농담을 이해하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공론 끝에 바보로 낙인찍어 버렸기에 윌슨이 법률가로서의 이상을 펼 기회는 봉쇄되었다. 그러나 묵묵히 연마한 지문 분석능력이 후일 살인범을 찾아내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 빛을 발하듯이 스토다드가 법률가의 능력을 펴기 위해서는 장구한 굴종과 인고의 세월이 필요한 것이다.
‘변경’(Frontier)이 사라지고, 문명과 교육이 황무지를 평정했음이 공식으로 선언된 후로는 법을 통해 세상에 기여할 꿈을 가진 서부의 소년에게 주는 격문(檄文)은 “젊은이여 동부로 가라!” (Go East, Young Man)가 되었다. 미국연방대법원 역사상 가장 빛나는 약자의 대변인이었던 윌리엄 더글라스 (William Douglas, 1898-1980)판사는 약한 자의 한숨과 눈물을 담아내지 못하는 법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니라고 믿었다. 자수성가,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인물 더글라스가 자신의 생애를 회고한 기록의 제목(1974)으로 택한 이 구호는 이제 미국 전체의 중심이 워싱턴에 있음을 알려주는 안내문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은 거친 시대, 무법자 영웅시대에 대한 장엄한 사망선고일 것이다. 그러나 수도 워싱턴에서 법과 정치에 부대끼면서 몸 속에 침전되는 문명의 노폐물을 세척해내기 위해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연안으로 날아 자신의 산장, 구스 프레리(Goose Prarie)에서 대자연의 기를 충전하곤 했던 더글라스의 믿음처럼 절차와 세칙으로 첩첩이 쌓인 법과 문명의 정의는 때대로 장엄한 원시 의 정의 앞에 경의를 표해야만 한다. 그 야만의 원시 속에 인간의 본질이 살아 있는 것은 아닐까? 판결문에 인디언의 시구를 인용하던 더글라스처럼 원시의 자연에서 세속법의 본질적인 뿌리가 되는 자연법이 배태되는 것이 아닐까?
상처입고 쓰러져 있는 스토다드를 톰 포니온 (John Wayne 扮)이 구출하여 자신의 애인 핼리에게 간호를 맡긴다. 포니온은 발란스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건맨이다. 그는 스토다드를 “순례자”(pilgrim)로 부르며 순진무구한 이상주의자를 동정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본다. 이 말은 물론 새로운 성지를 찾아 뉴잉글랜드에 이주해온 순진한 이상주의자를 지칭한다. 톰은 순진한 스토다드에게 서부에 정착할 생각이면 책 대신 총을 배우라고 충고한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이 약자에게 보내는 연민의 눈물이라면 톰은 넓은 어깨와 함께 연민으로 충만한 가슴을 가진, 사나이 중의 사나이였다. 그러나 오로지 머리뿐인 스토다드에게는 톰도 발란스나 마찬가지로 폭력을 숭상하는 야만인에 불과하다. 결코 신본을 떠나지도 총도 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스토다드, 변호사명판을 조리실 선반에 얹어두고 조소와 동정을 감수하며 앞치마를 두르고 접시를 나르는 이상주의자는 사설학교를 열어 헌법과 선거제도를 가르친다. 독립선언문을 암송하며 법 앞에 평등을 강론한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자명한 진리로 믿고.. .” (we hold it self- evident truth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그의 꿈은 작게는 발란스를 법의 심판대에 보내는 것, 크게는 법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스토다드는 신본마을이 자리한 개척지 준주(準州, territory)를 연방의 정식 주로 편입시킬 것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미 무법의 기득권을 확보한 ‘피켓 와이어’ 카우보이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발란스를 고용한다.
스토다드와 발란스의 결투에서 뜻밖에도 발란스가 죽고 스토다드는 무뢰한을 응징한 정의의 사도라는 명성을 쌓아간다. 준주 대표 선출대회에 참가한 스토다드는 톰의 배려로 대표자로 선출된다. 사람을 죽인 피묻은 손으로 어찌 법과 질서를 집행하는 인민의 대표자가 되겠느냐고 주저하는 스토다드에게 톰은 발란스를 죽인 사람은 톰 자신이라고 고백한다. 자신의 애인이었던 핼리의 마음이 스토다드에게 기울여져 있음을 알고 핼리의 행복을 위해 스토다드의 생명을 구했노라고 고백한다.
영화평론가 토마스 샤츠( Thomas Schatz)의 말을 빌자면 이 영화는 사실과 전설, 역사와 신화의 두 대립적 요소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기록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한다. 과거의 이야기에서 끄집어 낸 미국의 비전에는 관심이 없었고, 대신 현재의 미국인들에게 유리한 시각을 가지기 위해 과거를 조작하는 그 과정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역마차》와 《황야의 결투》가 문화의 이상화된 이미지를 찬미하는 반면, 《리버티 발란스를 쏜 사나이》는 그 이미지를 해체하고 비판함과 동시에 역사와 문명의 발전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던 신화와 전설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세 사람의 중재자가 등장한다. 첫째, 새로운 신본 마을 신문의 편집장이다. 창립자 편집장이 알코홀 중독의 철학자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신화와 전설의 세계의 일부가 되었다. “리버티 발란스 패배” (“Liberty Valance Defeeted), 오자의 특호활자를 뽑으면서 위대한 법과 정의의 승리를 외친 그가 발란스의 폭력과 독재에 항거하여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모습은 장렬하기까지 하다.
이러한 신화적 전설을 이고 등장한 새 편집장은 전설과 사실, 신화와 역사, 현재와 과거를 중재하면서 스스로 선택을 내린다. 스토다드의 플래시백이 끝나자 그는 인터뷰한 내용을 찢어버린다. 그가 던진 명언은 언론과 서부의 법칙은 "전실이 사실로 굳어지면 전설을 택한다." (when legend becomes fact, print the legend)는 것이다.
둘째, 발란스의 원시적 야만성과 스토다드의 순박한 이상주의를 중재하는 톰 포니온이다. 그 또한 선택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자신이 속한 야만과 무법의 세계가 스토다드의 부상과 함께 이내 종언을 고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이미 여명이 비치고 있는 법치의 이상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자신의 애인을 맡긴 것이다. “투표는 총을 이기지 못한다” (votes won't stand up against gun)고 믿는 그는 “핼리의 행복을 위해” 무법자를 쏜다. 그러나 포이언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희생과 대가를 치른다. ‘냉혈의 살인자’ 발란스를 죽이고 스토다드를 구출함으로써 자신은 외롭고 더 이상 쓸모 없는 인간이 되어 여생을 식물처럼 보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핼리의 선택이다. 그녀 또한 스토다드와 포니온 사이에 선택을 하여야 한다. 포니언이 꺾어 만들어 주는 “사막의 장미”(선인장)정원과 스토다드가 약속하는 진짜 장미 정원, 즉 원시와 문명 사이의 선택을 해야만 한다. 스토다드의 플래시백이 시작되기 전에 핼리는 포니언의 옛 하인을 대동하고 사막 속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는 포니언의 집으로 말을 타고 달려간다. 포니언이 핼리를 위해 짓던 집, 발란스를 쏘고 핼리를 문명의 세계로 보내던 날, 만취상태에서 스스로 불질렀던 그 집이다. 핼리는 그곳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선인장 꽃 한송이를 꺾어와서 포니온의 관 위에 놓는다. 선인장 꽃은 정원과 사막, 자연과 문명 사이에 무너진 신의를 나타낸다. 문명과 야만이 불안하지만 타협가능한 선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던, 잃어버린 세대를 상징하기도 한다.
마지막 시
바다이야기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
-

만화 그리는 의사들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그 마을엔 청년이 산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