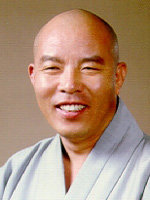
초심자에게는 고통스러운 기간이다. 오전 2시경에 일어나 준비를 해 3시부터 50분 동안 앉아서 참선(參禪)을 한 후 10분 동안 걸으면서 경행(經行)을 한다. 이렇게 하루 10시간을 참선에 몰두하고, 오후 9시에 잠자리에 든다. 짜인 일과에 적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고 오로지 앉아만 있다. 조금이라도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졸면 장군죽비가 날아와 어깨를 후려친다. 정적을 깨뜨리는 죽비 소리는 천둥과도 같으며 번개처럼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 처음에는 다리가 저리고, 졸음에 정신은 혼미해지고, 온몸이 뒤틀린다. 한 시간을 앉아 있기가 하루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 잊었던 옛 생각은 다시 새록새록 돋아나고, 온갖 번뇌 망상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이 되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 자신의 오롯한 경계에 들게 된다. 삼매경에 들면 법열을 느끼고, 마음이 환희로 가득해진다.
올여름에도 하안거를 시작했다. 조계종에서는 선원 100여 곳에서 스님 2200여 명이 안거에 들어갔다. 이러한 안거는 부처님 당시에 시작돼 2600여 년간 이어져 온 불교의 전통적 수행 방법이다. 본래는 인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우기(雨期)에 스님들이 외출을 삼가고 한곳에 머물며 수행에 전념한 것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북방 대승불교로 오면서 1년에 2차례 여름의 하안거와 겨울의 동안거로 나누어 행하고 있다. 선종(禪宗)에서는 대단히 중시해 왔다. 오늘날 대승불교권에서 안거에 철저한 나라는 한국이다. 중국 불교의 전통은 문화혁명으로 소멸됐고, 일본 불교는 재가(在家)의 생활불교로 변했다. 한국 불교는 전통적인 대승불교 교단을 그대로 계승해 오면서 안거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는 스님들만이 입방이 허용되는 안거를 해 왔지만, 최근에는 재가자들을 위한 선원이 개설돼 안거에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에는 불교 신자뿐 아니라 모든 종교를 초월해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다. 외국인을 위한 국제선원이 개설돼 세계 각국에서 한국 불교의 안거에 동참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도 점점 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말함으로써 자신은 돌이켜 보지 못하고 있다. 밀려오는 정보를 처리하지 못해 판단에 혼돈이 생기고, 많은 말을 하다 보니 실수가 잦다. 남에 대해서는 철저히 평가하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한번도 자신을 돌이켜 보지 않았으니 알 리가 만무하다. 단 몇 분간이라도 고요히 정좌해 본 적이 있는가? 하안거 철을 맞아 모든 것을 놓아 버리고 나는 누구인지 자신을 찾는 여유를 가져 보자.
보 광 동국대 교수 정토사 주지
김유준의 재팬무비
-

동아시론
구독
-

글로벌 포커스
구독
-

데이터 비키니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약국조차 없는 외딴섬엔… 바다 위 의료진이 수호천사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대병원 4곳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정부 ‘구상권 청구’ 거론 압박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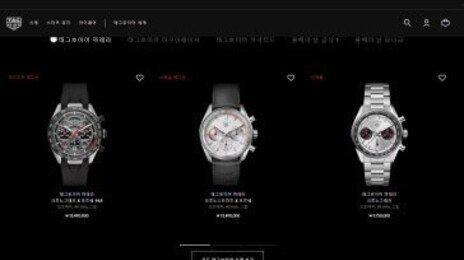
태그호이어 해킹에 한국인 2900명 개인정보 유출…억대 과징금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유준의 재팬무비]멋진 캐릭터만 만들면 만사형통](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