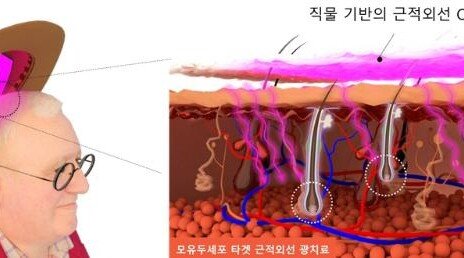공유하기
[교통캠페인]「어린이 보호」佛 교통문화
-
입력 1999년 3월 21일 18시 26분
글자크기 설정
오전 8시반 프랑스 파리시 남서부 블라헨느 지역에 위치한 파이앙스리 초등학교. 학교 앞 도로가 파리에서 오를레앙으로 이어지는 국도여서 러시아워에는 수많은 차량이 오가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지나 학교로 가려면 상당히 위험하다.
집에서 걸어 10분 걸리는 거리지만 그라 에브린(34·여)은 매일 아침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들(6)을 학교까지 바래다 준다.
횡단보도 한 복판에서 형광색 옷 차림에다 ‘STOP’ 표지판을 들고 서 있는 시청공무원 퓌쉬 에야닌(50·여)이 이들을 맞는다. 파란불이 켜지자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을 막아선 에야닌은 아이들에게 일일이 “비주”(프랑스어로 ‘뽀뽀’)하며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보행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프랑스. 특히 어린이 보호에 관한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열성적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14세 이하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5.3%(97년말 현재)로 우리나라의 7.4%보다 훨씬 낮다. 이는 어떤 시설이나 법적 규제보다 학부모 교사 경찰이 서로 연계된 ‘사람에 의한 보호체계’ 때문이다.
유치원생과 초등 3학년 이하의 저학년 학생은 등하교시 학부모가 꼭 데려다 줘야한다.
또 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교통경찰(또는 시청공무원)이 직접 나와 지켜본다. 보행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시청 교통과 푸쉬 에야닌은 “매일 8시반부터 4시20분까지 4차례 학교주변 횡단보도 3곳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보행교육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 동안 부모들과 등하교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부모의 등학교길 ‘동행의무’는 프랑스의 사회적인 합의사항.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사무국에 근무하는 한국인 김도훈씨(42)는 “아침에 초등 1,3학년 두 아들을 바래다 줘야하기 때문에 출근이 15분정도 늦을 수밖에 없다.근무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프랑스인들도 이것만큼은 눈감아 준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에서도 ‘시민도덕교육’시간에 실습을 통해 교통교육을 실시한다.
파리 연방경찰이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는 곳인 ‘교통공원’은 시내에 모두 20여곳. 지하철 고가도로 밑 등 남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어린이 교통교육 시설을 마련한 것이 인상적이다.
파리시내 샤펠역 고가도로 밑에 설치된 교통공원에도 인근의 초등학생들이 학급별로 방문해 매일 오전 오후 2차례씩 교육을 받는다. 교육내용은 20여분간의 이론교육과 30여분간의 자전거 실습.
어린이 교통교육을 담당하는 뒤퐁순경(45)은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판단력이 3배 정도 느리기 때문에 자동차의 위험성과 횡단보도 건너는 요령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리〓전승훈기자〉raphy@donga.com
트렌드뉴스
-
1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2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5
정해인, 서양 남성 사이에서 곤혹…인종차별 의혹도
-
6
홍석천 “부동산에 속아 2억에 넘긴 재개발 앞둔 집, 현재 30억”
-
7
인간은 구경만…AI끼리 주인 뒷담화 내뱉는 SNS ‘몰트북’ 등장
-
8
[횡설수설/김창덕]“그는 정치적 동물이야”
-
9
한국인의 빵 사랑, 100년 전 광장시장에서 시작됐다
-
10
[사설]‘무리해서 집 살 필요 없다’는 믿음 커져야 투기 잡힌다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5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6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7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10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트렌드뉴스
-
1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2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5
정해인, 서양 남성 사이에서 곤혹…인종차별 의혹도
-
6
홍석천 “부동산에 속아 2억에 넘긴 재개발 앞둔 집, 현재 30억”
-
7
인간은 구경만…AI끼리 주인 뒷담화 내뱉는 SNS ‘몰트북’ 등장
-
8
[횡설수설/김창덕]“그는 정치적 동물이야”
-
9
한국인의 빵 사랑, 100년 전 광장시장에서 시작됐다
-
10
[사설]‘무리해서 집 살 필요 없다’는 믿음 커져야 투기 잡힌다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5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6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7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10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알짜정보]과학](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