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소위 외환위기에 대해 부채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통쾌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게 될 것이다. 30년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대한민국 경제를 침몰 직전까지 몰아넣었다는 자책감에 떨었던 우리에게 이 책은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환란 이면에 별도의 논리가 존재했음을 알려준다.
저자는 세계화를 지지한다. 단순히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경제적 흐름이라고 주장한다. 더욱 많은 자본을 손쉽게 동원하고, 더욱 넓은 시장에 물건을 내다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와 경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따라서 좀 더 인간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세계화라고 주장한다.
저자가 세계화를 지지하는 이유는 시장에 대한 굳은 믿음 때문이다. 시장에 바탕을 둔 자본과 기업가 정신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시장이 세계적 규모로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한 세계화는 궁극적으로 세계 인류에게 부와 복지를 가져다 줄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저자는 끊임없이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미국처럼 자본주의가 왕성한 국가도 예외는 아니다. 또 한창 경제발전이 진행 중인 나라에서는 아예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개혁과 개방을 위해 정부는 ‘순서’와 ‘속도’라는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불완전한 시장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국제 공공기구에 위탁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기구가 ‘시장경제’라는 도그마에 사로잡혀 무조건 ‘민영화, 자유화, 개방화’를 밀어붙임으로써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발생했고,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상당 부분 실패했다. 더 나아가 이들 국제공공기구가 미국 등 선진국 재무부와 금융권의 논리를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함으로써 오히려 위기를 악화시키고 말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렇다면 어떤 세계화여야 할까. 저자의 답은 명확하다. 세계화를 당초 취지대로 작동하게끔 만드는 데 필요한 가장 구조적인 변화는 ‘국제기구 지배구조의 변화’다.
김태승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세계화 이해하기
구독-

고양이 눈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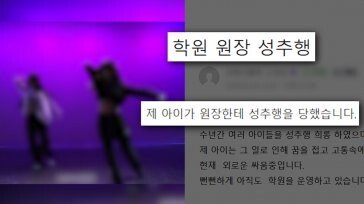
‘성추행 의혹’ 댄스학원 원장, 알고보니 아동 성범죄 전과자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집에서 아기 낳자마자…분리수거장에 버린 친모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 崔 “급여만 분할 대상” 주장에, 법원 “잡스는 연봉 1달러” 반박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세계화 이해하기 20선]렉서스와 올리브 나무](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